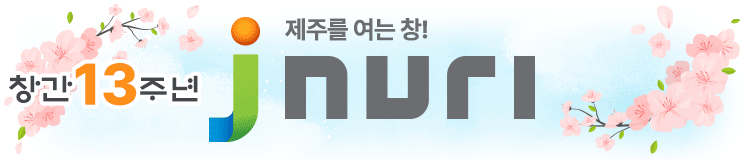당시 일간지 맨 뒷면의 전면 칼라 광고는 공식 광고단가로만 수천만이다. 그래서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 그룹사의 이미지 광고로만 활용됐다. 언감생심 잘 알지도 못하는 IT 신생기업이 전면광고를 낸다는 것은 상상이 어려운 시절이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비즈니스 시작 당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메일 계정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그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끌어 모았다.
그 시절 인터넷 관심층은 @hanmail.net으로 끝나는 무료이메일 계정 보유가 대세였다. 안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
그런 일이 카카오가 '카톡'이라는 무료 문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났다. 매체는 다르지만 소비자들이 절실히 원했던 서비스다. 그것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적인 기업으로 우뚝 선 같은 경험을 가지게 됐다.
현재까지 무료 이메일로 시작된 다음은 포털사이트의 선두 주자로 자리잡았고 수많은 유사업체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함께 포털시장을 양분해왔다.

그랬던 '다음'이 11개월 전 국민메신저로 대한민국을 휘저어 놓은 카카오톡과 몸을 섞었다. 합병이다.
동등한 수준의 합병이 아닌 최대 주주는 물론 경영권을 카카오측에 넘겨주는 파격적인 합병이었다. 이미 대세가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옮겨 간 현실을 반영한 듯 했다.
얼마 전 다음카카오가 비즈니스의 중심을 제주가 아닌 판교사옥으로 옮겨갔을 때도 모든 것은 예견됐었다. 이미 '다음'이라는 인터넷 중심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고 다만, IT기업으로서는 노쇠한 기업의 버티기 정도로만 느껴졌던 셈이다.
이제 '카카오'가 '다음'이라는 껍질을 벗어던지고 원래의 색깔을 드러내기로 했다. 회사명에서조차 '다음'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됐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의 사명에는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모호한 측면도 존재했다"면서 "이제 모바일 기업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명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비지니스를 전면에 내세워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했던가. 이런 경우는 늘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굴러온 돌의 성격이다.
다음카카오가 카카오로 다시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시대가 바뀌었음을 절감한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수단 면에서 이미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포털이나 인터넷사이트는 그 어떤 경우에도 모바일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다음이 컴퓨터를 통한 포털시대를 열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결국 그 다음에 돌아오는 모바일 시대를 여는 혁신에는 기존 기업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한 셈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시대의 흐름과 혁신에 실패하면서 과거의 기억으로 남는다. PC시대의 절대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 못해 지속적인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하물며 같은 모바일 시대를 풍미했던 모토로라와 노키아, 블랙베리 역시 스마트폰시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인을 옮겨다니며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다음이 모바일 시대를 등한시 했던 것은 아니다. 네이버에 비해 열세인 PC 포털의 점유율을 극복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모바일 중심 비즈니스를 준비해왔다.
네이버보다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때로는 무모하리만큼 약간은 의아한 앱을 출시하면서 모바일 시대에 네이버를 추월하기 위해 오랫동안 몸부림쳤다.
그럼에도 결국 자체적인 혁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카카오톡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주인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이 스스로 돌파구를 못 찾고 카카오에 의탁하면서 정체성마저 흡수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결과적으로 보면 혁신의 대상이었던 조직과 시스템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틀은 유지한 채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고자 했던 의도, 기존의 체제를 유지한 채 혁신을 추구한 결과인 셈이다.

그것은 스스로 기존의 틀을 깨고 올라섰던 신기술기업이나 조직이 혁신의 틀에서 벗어나 있게 되면 어느 순간 새로운 혁신의 대상이 되거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에 쌓아놓은 '다음'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역할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 보다는 다양한 혁신의 길을 택하고 있는 제주가 타산지석으로 여길 점을 찾았으면 한다.
새로운 혁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듯한 기존의 관행이나 습관이 결국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쥐고 있을수록 혁신의 길과는 멀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제주의 관행은 과연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가? [제이누리=이재근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