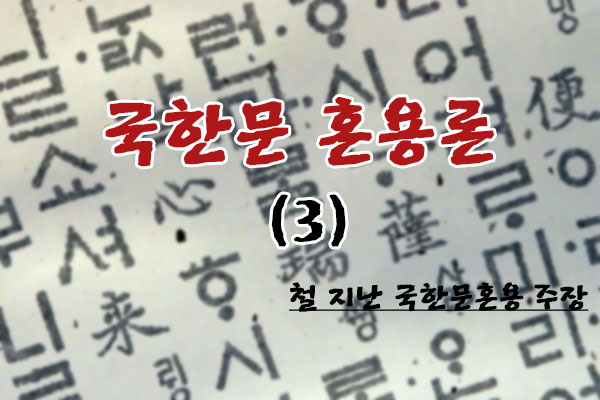
올해로 환갑인 저는 한글전용 세대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한자를 배운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딱 50년 전인 1966년,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에서 ‘국민(國民)’, ‘자유(自由)’ 식으로 표기된 한자 이삼백 자를 만났을 뿐입니다. 이후 한글전용정책이 시행되면서 한자는 교과서에서 사라져 버렸지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에 가니, 신문마다 대학생들의 무식함을 걱정하고 꾸짖는 칼럼과 사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조차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신문도 제대로 못 읽는다.”는 것이었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야 애매한 욕을 먹은 셈입니다. 제대로 가르쳐 준 적도 없으면서 책이고 신문이고 한자를 잔뜩 섞어 써서 도무지 읽을 수 없게 만든 기성세대들이야말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요?
그때만 해도 100만 명 가까운 동갑내기 가운데 겨우 6만 명 남짓만 대학 가던 시절이니, 대학생이라면 선택받은 계층이었는데도 그들조차 읽을 수 없는 신문이라면, 그 잘난 대학도 못 간 나머지 90% 이상에게 신문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대학 시절, 잠시 야학에서 국어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누님, 이모뻘 학생들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교과서 대신 '신문 읽기'를 감히(!!) 가르치느라고 교과서는 제대로 들춰볼 시간도 없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듯 극소수만 누리는 고급문화(?)였던 신문이, 80~90년대의 도도한 민주화 흐름과 맞물리면서 대중화를 꾀한 결과,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로 바뀌어 이제는 한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신문이 여러모로 저질스러워졌다는 비판은 있지만, 어쨌든 이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신문이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경험을 지닌 저로서는, 수십 년 세월을 건너뛰어 ‘좀비’처럼 튀어나온 국한문혼용 주장이 '다시 1%만을 위한 비뚤어진 언어생활로 돌아가자'는 철 지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김효곤/ 서울 둔촌고등학교 교사]

=연세대 국문과를 나와 35년여 고교 국어교사를 하고 있다. 청년기 교사시절엔 전교조신문(현 교육희망)의 기자생활도 했다. 월간 <우리교육> 기자와 출판부장, <교육희망> 교열부장도 맡았었다. 1989년 이후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주최하는 대학언론 강좌를 비롯해 전국 여러 대학 학보사와 교지 편집위원회, 한겨레문화센터, 여러 신문사 등에서 대학생·기자·일반인을 상대로 우리말과 글쓰기를 강의했다. <전교조신문>, <우리교육>, <독서평설>, <빨간펜> 등 정기간행물에 우리말 바로쓰기, 글쓰기, 논술 강좌 등을 연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