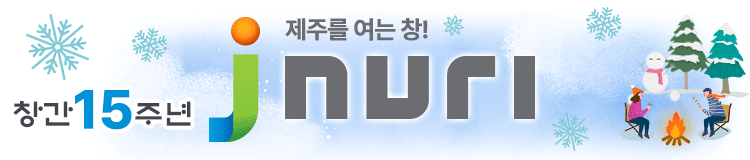아내의 뒷정리를 수발하려고 나훈아 히트곡 음반을 틀고 볼륨을 어지간하게 올렸다.
어느 신문에선가 우리나라의 중년 남성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물어봤더니 첫째가 어머니이고 그다음이 고향이라고 대답했다는 걸 읽은 적이 있다.
그 ‘어머니와 고향’이 하필 나훈아의 꺾고 넘는 노랫가락을 타기만 하면 구곡간장을 헤집어 놓고야 만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설날에 TV를 통해 보고 듣는 나훈아의 ‘애타도록 그리운 어머니와 꿈에도 못 잊을 고향’은 마치 민족의 명절 제례악 같은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백마의 갈기 같은 은발머리에 가슴을 풀어 헤친 와이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아리수’를 부르는 걸 본 이래 TV에서 나훈아를 본 적이 없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시골 어느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란다.
대한민국의 대표 수컷이 요양 중이라니... 쯧쯧 세월이 무상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성학자인 박혜란 여사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시나브로 늙어 간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우린 늙음이란 젊음이 끝난 어느 날 별개의 삶처럼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노전(老前)생활이란 말이 없는 것처럼 노후(老後)생활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며, 우리는 그저 계속 살아가는 것이란다.
그렇다면 나는 일련의 노정인 젊음을 얼마나 빠져나오고 있으며, 늙음으로 얼마나 들어서고 있는가.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끝에서 어느 만큼의 위치에 와 있는 것일까.
가족과 친구,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순결한 내 의식으로 작용해주며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귀납적 사색이 과연 공연하고 한갓지기만 한 것인가.
아니면 뒷날은 다음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남들과 같이 세속적 진보의 행렬에 맹렬하게 끼어들어야 하는 것인가.
나이 들수록 오히려 생각도 일관되지 않고 세상도 일목요연하게 보이질 않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이는 나의 관상에 남루한 흔적을 긴가민가하게 그려놓았을 것이다.
어쩌면 ‘생긴 대로 논다’라는 말은 틀린 말일지 모른다.
노는 대로 생겨 가는 게 맞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지 않는가.
머릿속의 생각과 가슴속의 마음이 얼굴에 자국으로 새겨져 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닐는지.
누군가는 얼굴은 얼의 꼴, 즉 정신의 모양이라는 뜻이란다.
고로 그동안 열정 같은 치기로 살아온 내 삶을 어서 단도리하며 늙어가야 할 텐데 초저녁에 벌린 노름판이 날 새는 줄 모른다.
지치고 졸린데 너무 많이 따버려서 처신이 곤란하다.
'풀어 헤칠까, 아니면 자본관리 들어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관상은 게임전용 포커페이스다. 풀어 헤칠 아량이 없다.
제기랄, 언제면 나잇값 할래?
나는 조실부모한 장남이라서 명절에 다섯 신위를 모신다.
아내가 닦아서 구분해 놓은 제기(祭器)를 궤짝에 차곡차곡 옮겨놓고, 열두어 명이 사나흘 덮고 잔 이불을 옥상 난간에 걸쳐 널고, 과일이며 제수 포장박스들을 클린하우스에 내다 버리고, 청소기 한번 쓱싹 돌리고 나서 아내와 찻상 앞에 앉았다.
몇 날 며칠을 고깃국에 적 나부랭이만 먹었더니 끅끅 내장 속 가스가 식도를 거슬러 올라온다. 맑은 작설차 한잔하고 싶다.
창문을 열어 이른 봄기운을 거실로 들여놓고, 나훈아를 파카잘스의 첼로로 갈아 끼우고, 전기주전자에 한라영산의 천연 화산암반수인 삼다수를 부어 전원을 꼽는다.
마당가 먼나무의 열매가 깊디깊은 겨울만큼 붉을 대로 붉다.
소설 ‘초의(草衣)’와 ‘다산(茶山)’을 쓴 한승원 선생은 차선(茶禪)의 현존 대가이시다.
선생의 차(茶) 명상 중에서 나이에 대한 풍자를 빌려오면
첫 번째 우린 차는 배릿한 향이 나는 십대의 맛이고
두 번째 우린 차는 혈기방장한 이십대의 맛이다.
세 번째 우린 차는 삶의 맛을 바야흐로 알기 시작하는 삼십대의 맛이며
네 번째 우린 차는 깨달음이 보일 둥 말 둥 하는 불혹의 사십대 맛이다.
다섯 번째 우린 차는 부처님이 눈을 반쯤 감은 뜻을 알기 시작하는 오십대의 맛이며
여섯 번째 우린 차는 연꽃잎을 스치는 부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육십대의 맛이다.
일곱 번째 우린 차는 연꽃들이 다 지고 없는 연못의 황달 든 연잎에 어린 하늘의 소리를 듣는 칠십대의 맛이며
여덟 번째 우린 차는 석가모니가 열반하면서 “나 아무 말도 하지 않 았느니라”하고 말씀하신 뜻을 알아 듣는 팔십대의 맛이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내 주제에는 너무 아득하여 읽고도 무슨 뜻인지 헤아릴 깜냥이 없다.
그나저나 이 풍자에 따르면 나는 나이를 한 스무 살쯤 하향평준화해서 사는 것 같다.
그것마저 바야흐로 삶의 맛을 알기나 하며 사는 건지 모르겠다.
최소한 정신적으로는 내가 걱정하는 대로 발육부진아일 수밖에 없다.

이대로 나이만 먹고 정신은 지체되면 괴테의 말마따나 욕망에 사로잡힌 악마 같은 노인이 되고야 말 것이다.
그동안 애면글면 살아온 관물론(觀物論)적 삶과의 유착을 서서히 멀리하고 독좌관심(獨坐觀心)하여 잃어버린 내 나이를 찾아야 하겠다.
부처님이 눈을 반쯤 감은 뜻을 알기 시작하는 내 나이를 말이다.
눈을 반쯤 감고 보면 실상(實相)은 허상(虛像)인 경우가 많으니까.
나이만 폭식하면 내가 칠십 대가 되어도 연잎에 어린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탐욕에 눈먼 악마 같은 노인네가 될 테니까.
정신적으로는 청맹과니 같은...
신은 때때로 나에게 선각자 대신 반면교사를 보내 주신다.
점잖게 글쓰기 참 어렵네.
결국 나는 나이만 먹었나 보다.
| ☞김성민은? =탐독가, 수필가다. 북제주군청에서 공직에 입문, 제주도청 항만과 해양수산 분야에서 30여년 간 공직생활을 했다. 2002년엔 중앙일보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주관한 제26회 청백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전력도 있다. 그해 12월엔 제주도에 의해 행정부문 ‘제주를 빛낸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8년 월간 한맥문학사의 ‘한맥문학’에 의해 수필부분 신인상으로 등단한 수필가다. 공직을 퇴직한 후에는 그동안 미루어 왔던 깊은 독서와 보이차의 매력에 흠뻑 젖어서 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