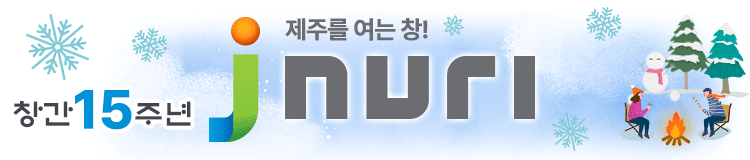아프리카는 하나가 아니었다
아프리카는 밀림이나 초원만 있고 야생 동물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착각인 것처럼 아프리카는 뭐든지 하나로 통한다는 생각도 착각이다. 오기 전에, 아니 도착하는 순간까지 현지 언어를 배운다고 아프리카 남동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해서 '스와힐리어'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다. 동방예의지국 사람으로 인삿말부터 외우고 기본적인 말들을 참 열심히 공부했다.
"아산떼(고맙습니다)"
"싸마하니(미안합니다)"
"함나 시다(괜찮아요)"

거의 24시간 걸려서 도착한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투(Maputo) 공항이야 그렇다쳐도 내가 가야할 곳까지 가면서 그 어디에서도 스와힐리어가 씌여있다든지 그 말을 쓰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니 시골 농부에게 길을 묻거나 상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살 때 가게 주인마저도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말을 쓰지 않았다. 도대체 이 말은 누가 쓴단 말인가? 진료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배운 건데.....
현지에서 나를 안내하는 직원에게 물었더니 오히려 이상한 듯이 나를 쳐다봤다. 당연히 포루투갈말을 쓰지 스와힐리어는 거의 안 쓴다고 하면서 말이다. 포루투갈 500년 식민지 역사는 이 곳의 문화와 관습과 언어 자체를 바꿔놓았던 것이다. 그 직원 말을 듣고는 당장 '스와힐리어의 기초'라고 된 핸드북을 가방 깊숙한 곳에 쳐박아버렸다.
아프리카는 그렇다. 워낙에 많은 종족이 있어서 말도 수십 가지이지만 식민지 통치를 한 나라에 따라 쓰는 말이 또 갈렸다. 주로는 프랑스, 스페인, 포루투갈 말이 주로 사용된다. 조금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국어로 사용한다. 거의 수백 년씩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들도 제대로 된 문자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세종 임금께 큰 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또 드는 생각이..... 그나마 36년간만 강제합병한 일본을 고마워해야 하나? 100년, 200년이 아닌 겨우 36년간만 빼앗아줘서?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나 혼자 피식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코리아에서 온 의사와 만나다
모잠비크는 한반도의 3~4배나 되는 꽤 큰 나라다. 10개의 도 중 하나인 인한바네(Inhanbane)의 잔가모(Jangamo)라는 군단위 지역 마을을 돌며 기초 조사를 마친 후 나는 마을과 큰 병원 간의 의료전달체계 상황을 알기 위해 제일 잘 되어있는 종합병원을 들렸다. 책임자들은 모두 우리에게 잘 대해줬고, 기꺼이 시간들을 내줬다. 그러다가 자기네 병원에도 코리아에서 온 의사가 세 명 있다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다. 언제 여기까지 의료진이 진출했지? 도대체 어느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힘든 역할을 하고 있을까?
오래지 않아 누구의 안내를 받고 그 분들이 찾아왔다. 나는 너무 기뻐서 잠깐 인사를 하고는 그래도 한국의 최근 의료계 소식이라고 원격진료 문제로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했다고 전해줬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파업 여부에 대해서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원격진료요? 무슨 말씀이신지 리해가 안됩니다만 궁금한 거이 있으시면 저희가 설명해드리겠습네다."
"(헉.....) 오... 오... 오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더우신데 힘드시죠?"

그 의사들은 코리아는 맞는데 노스(north) 코리아였고, 이곳 사람들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개했던 것이다. 더욱이 함부로 만나면 국정원에라도 끌려갈지 모른다는 건 더더욱 모를 것이다.
나는 갑작스런 만남에 분위기 파악이 안 됐지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것저거 묻는 척 했다. 조금 대화를 했을 때야 겨우 이해를 했다. 맞아, 얼마 전까지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였지.....
"저희 공화국에서는 모잠비크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인력들이 보내어집니다. 수령님 살아계실 때부터 주욱 그랬습니다."
조금 머리가 쭈볏해졌지만 몇 마디 얘기를 주고 받고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그들을 뒤로 하고 서둘러 병원을 나서서 돌아오는데 창피한 감이 들었다. 그들은 오히려 반갑게 인사하고 더 안내를 해주려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불길한 만남을 한 것처럼 빨리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으니..... 으이그, 이놈의 반공교육의 후유증은 언제 고쳐지려나? 스스로 벽을 만들고, 적대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것이 하루종일 우울하게 만들었다.
이제 3일 지나면 기초 자료 준비를 끝내고 마무리를 하며 아프리카, 아니 모잠비크를 떠난다. 처음 와보는 대륙이라 실수도 있었지만 좋은 경험과 느낌을 얻고 가는 것 같다. 이번 일정이 다른 때와 다르다면 낮에 일하는 거야 비슷하다 쳐도 밤에는 통계수치와 계획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밤 시간만은 자유였는데.... 워낙 짧은 시간에 일을 마무리해야 해서 자기 전까지는 고생해야 했다.
지금 한국은 꽃샘 추위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추운 것보다 더운 게 그나마 나은 것 같다. 그리고 국민도 의사들도 원치않는 원격진료를 정부가 밀어붙이려고 해서 시끄러울텐데, 이래저래 돌아가는 길이 편치 않다.
모잠비크야, 너희들은 지금은 가난해도 의료제도를 처음부터 잘 설계해서 우리처럼 시끄럽게 만드는 법이 없도록 하려무나.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다음에 볼 때까지 잘 있어라.

| ☞고병수는?
= 제주제일고를 나와 무작정 서울로 상경, 돈벌이를 하다 다시 대학진학의 꿈을 키우고 연세대 의대에 입학했다. 의대를 나와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정의학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 세브란스병원 연구강사를 거쳐 서울 구로동에서 개원, 7년여 진료실을 꾸리며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 다니며 도왔다. 2008년 고향 제주에 안착, 지금껏 탑동365의원 진료실을 지키고 있다. 열린의사회 일원으로 캄보디아와 필리핀, 스리랑카 등 오지를 찾아 의료봉사도 한다. 『온국민 주치의제도』란 책을 펴내는 등 보건의료 선진화 방안과 우리나라의 1차 의료 발전방안을 다룬 다수의 논문을 낸 보건정책 전문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