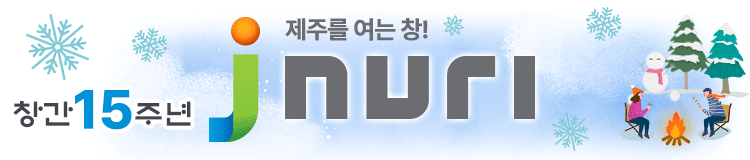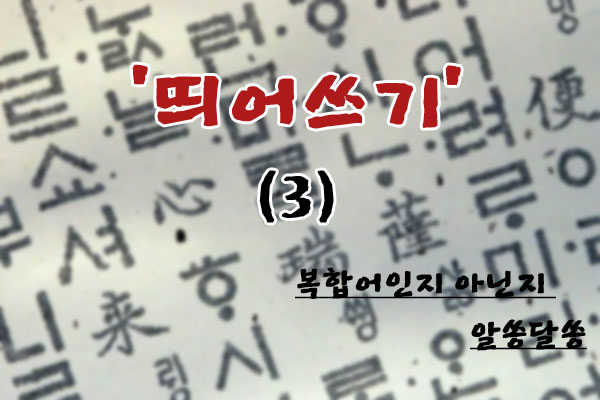
그동안 띄어쓰기를 두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복합어, 즉 합성어와 파생어의 띄어쓰기 문제를 살펴봅시다.
복합어는 사실 띄어쓰기를 걱정할 까닭이 없습니다. 합성어란 ‘돌다리’, ‘작은아버지’처럼 둘 이상의 실질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이고, 파생어는 ‘개살구’, ‘낚시질’처럼 실질형태소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 새로 단어가 된 말이므로, 복합어는 합성어든 파생어든 당연히 붙여 쓰면 그뿐입니다. 너무 전문적이어서 골치 아프다는 분들을 위해 쉽게 말하자면, ‘복합어란 둘 이상이 합쳐져서 새로 하나가 된 말이므로 붙여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기가 말하기는 쉬워도 만만찮다는 겁니다. 복합어는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그 수도 많기 때문에 모두 다루기는 어렵고, 몇 가지만 추려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보기를 한번 보세요.
① 띄어쓰기/붙여쓰기 : 띄어 쓰다/붙여 쓰다
② 끌어내다/밀어내다 : 끌어 놓다/밀어 넣다
③ 뒤돌아보다/되돌아보다 : 돌이켜 보다
① ‘띄어쓰기’와 ‘붙여쓰기’는 한 단어로 인정하여 붙여 씁니다. 그러나 ‘띄어 쓰다’나 ‘붙여 쓰다’는 한 단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합니다.
<참고 1>
심지어 ‘붙여쓰기’는 몇 년 전까지도 한 단어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띄어 써야 했습니다. 해서 어떡하면 ‘체계적이고 쉽게’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교사들은 “아니, ‘띄어쓰기’를 한 단어로 본다면 ‘붙여 쓰기’도 당연히 한 단어라야 옳지, 도대체 이게 무슨 심통이람.” 하고 못마땅해했지요. 그러나 그때 국어학자들의 생각은 ‘띄어쓰기’야 널리 쓰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은 걸로 볼 수 있지만 ’붙여 쓰기‘는 아직 한 단어로 보기까지는 어려우므로 띄어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을 쓰면서 혹시나 해서 다시 찾아보니 아니, 이런! 요게 슬그머니 사전에 올라 있네요. 그새 ‘붙여쓰기’도 합성어로 인정하기로 했나 봅니다. 이러니 저 같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조차 헛다리 짚기 일쑤인 것이 띄어쓰기랍니다.
② ‘끌어내다’나 ‘밀어내다’는 한 단어로 인정하기 때문에 붙여 쓰지만, 그 말과 구조가 비슷한 ‘끌어 놓다’, ‘밀어 넣다’는 한 단어로 치지 않으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③ 이 또한 늘 헷갈립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뒤돌아보다’와 ‘되돌아보다’만 올라 있으므로 표제어에 오르지 않은 ‘돌이켜 보다’는 띄어 써야 합니다.
<참고 2>
지난번에 ‘–아(어)’로 이어지면 ‘먹어보다’, ‘때려주다’처럼 붙여 써도 된다고 했으니 ②와 ③도 따질 것 없이 모두 붙여 쓰면 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으나, 그때는 ‘본용언+보조용언’이었고, 지금은 ‘본용언+본용언’이기 때문에 사정이 다릅니다.
이 비슷한 경우는 다음 보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① 그분, 이분, 저분
② 그때, 이때, 저 때
③ 그중(-中), 이 중, 저 중
간단히 설명하면 ‘그분’, ‘이분’, ‘저분’, ‘그때’, ‘이때’, ‘그중’은 이미 한 단어로 굳은 것으로 보아 붙여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 때’, ‘이 중’, ‘저 중’은 아직 한 단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여 붙여 쓰지 않는 것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붙여 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의 핵심은 오로지 ‘한 단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꼼꼼하게 따져 살펴본 분이라면 ‘아, 뭔가 감이 잡힐 듯도 한데…….’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중간시험을 한번 쳐 봅시다. 두 개씩 짝 지은 다음 단어들 가운데 하나는 붙여 쓰고 하나는 띄어 써야 합니다. 붙여 써야 하는 것들 즉, 복합어들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① 귀 담아 듣다 – 앞 못 보다
② 가슴 깊이 – 가슴 아프다
③ 소리 치다 – 꼬리 치다
④ 낯 익다 – 낯 뜨겁다
⑤ 정 떨어지다 – 정신 차리다
⑥ 힘 쓰다 – 힘 있다
⑦ 바람 피우다 - 게으름 피우다
⑧ 쓸 데 없이 – 쥐 죽은 듯이
⑨ 숨 넘어가다 – 숨 막히다
⑩ 하다 못해 – 보다 못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붙여 쓰고 하나는 띄어 씁니다. 설명보다 정답이 더 궁금하시지요? 정답은 모두 앞엣것들입니다. ①과 ⑧은 셋을 모두 붙여 ‘귀담아듣다’, '쓸데없이'라고 씁니다. 혹시 거의 다 맞힌 사람이 있다면, 띄어쓰기 실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아마 오늘 운세가 좋은 분이겠지요? 이 비슷한 문제를 다른 사람이 내고 제가 푼다 하더라도 절반이나 맞히면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단어로 취급해서 붙여쓰기를 인정했던 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한 단어로 보기 어렵다 하여 도로 띄어 쓰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말이 합쳐지면서 뜻이 새로워졌다거나, 너무 익숙해서 두 말을 하나처럼 이어 쓴다는 점에서 거의 구별하기 어려운데 말이지요.
임시방편으로 ‘~서’를 넣어 보아서 부자연스러우면 복합어로 본다거나 ‘~만’, ‘~도’, ‘~까지’ 같은 보조사를 넣어 보았을 때 뜻이 유지되지 않거나 넣기가 곤란하다면 이미 완전히 한 단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붙여 쓴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완전한 구별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끌어서 내다’는 어색하므로 합성어이고, ‘끌어서 넣다’는 자연스러우므로 합성어가 아니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 보다'와 '돌이켜서 보다'는 여전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조사를 넣어 보는 경우도 비슷한 듯합니다.
이쯤에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누굴 놀리는 건가? 이런 식이라면 일일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도 제대로 띄어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저 잘난 학자 나으리들께서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이러하니 우리 보통 사람들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저 따를 수밖에요.
<맺음>
오늘은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머리만 아프게 한 게 아닌가 싶어 죄스럽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우리말 쓰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띄어쓰기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수준쯤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띄어쓰기를 오늘로 마무리 지으려 했는데, 한 번쯤 더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단어로 봐도 될까?’만 생각하세요. 그렇다 싶으면 붙여 쓰고, 아니다 싶으면 띄어 쓰겠다는 생각만 해도 꽤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로 든 말들은 워낙 헷갈리는 것들이니, 이걸 잘 몰랐다 해도 기죽을 까닭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몇 년 뒤면 이 말들 대부분을 한 단어로 인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붙임 3>
이렇듯 복잡하게 만든 국어학자들을 나무라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쉬우면서도 널리 통용할 만한 규칙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19세기 중반부터 100년 넘도록 자기 나라 말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다듬어 이제 체계가 잡힌 서양 여러 나라들(게다가 서양말들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 남의 것을 참고하기도 수월했지요)과는 달리, 우리는 늦게 출발한 데다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까지 겪으며 기나긴 혼란기를 거치느라 국어를 연구할 시간과 환경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국어만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인 국립국어원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20여 년 되었을 뿐입니다. (국립국어연구원 시절까지 합쳐서) 그 이전까지는 학자들의 의견이 학파와 학교에 따라 여럿으로 갈려 학교문법조차 통일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문 등 출판물은 물론이고 교과서조차 사전이나 맞춤법과 달리 표기하는 경우를 지금도 종종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맞춤법 통일안과 사전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말 연구와 정리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해야 옳겠지요.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책으로는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업데이트하기로 한 것도 이처럼 채 정리되지 못한 언어 현실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저 혼자 생각으로는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언어 현실을 일일이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차피 어려운 만큼 이제는 큰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규정을 대폭 정비한 다음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를 보세요. 발음이나 표기가 단어마다 하나하나 따로 기억해야 할 만큼 제멋대로지만 그게 복잡하다고 통일하려 들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언어는 한 군데 묶어둘 수 없습니다. 글말은 어찌어찌 묶어 둔다 해도 입말은 자꾸 바뀌어갑니다. 표기와 발음이 꼭 같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김효곤/ 서울 둔촌고등학교 교사]

=연세대 국문과를 나와 35년여 고교 국어교사를 하고 있다. 청년기 교사시절엔 전교조신문(현 교육희망)의 기자생활도 했다. 월간 <우리교육> 기자와 출판부장, <교육희망> 교열부장도 맡았었다. 1989년 이후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주최하는 대학언론 강좌를 비롯해 전국 여러 대학 학보사와 교지 편집위원회, 한겨레문화센터, 여러 신문사 등에서 대학생·기자·일반인을 상대로 우리말과 글쓰기를 강의했다. <전교조신문>, <우리교육>, <독서평설>, <빨간펜> 등 정기간행물에 우리말 바로쓰기, 글쓰기, 논술 강좌 등을 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