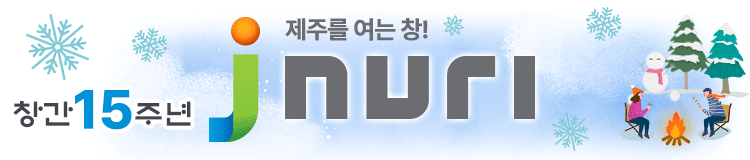그 때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간판을 내걸기 직전이었다. 1995년부터 같은 전략을 추진한 오키나와의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탐라국처럼 류쿠(琉球)란 독립국의 평화교류 전통을 부각,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요충지에 자리했던 지정학적 강점을 염두에 둔 오키나와의 전략이 ‘국제도시’였다.
일주일 여 현지 실태를 취재하며 얻은 결론은 결코 우리가 밀리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었다.
이유는 선점(先占)에 있었다. 그 시절 제주는 4년여 전인 1998년 세계섬문화축제를 연 지역이었다. 한 달간 25개국 27개섬이 참가한 ‘섬들의 문화올림픽’ 향연은 최소한 한·중·일 3개국 섬 지방정부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아시아·미주·유럽 등 5대양 6대주 섬들을 모두 제주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획이었다.
오죽했으면 섬문화축제가 처음 열릴 무렵 일본 오키나와현의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 지사가 당시 신구범 제주지사에게 은근히 ‘축제 양보’를 요구까지 했을까? 제주도는 그 열풍을 몰아 내친 김에 오키나와를 비롯해 중국 하이난, 인도네시아 발리 등이 참가하는 섬관광정책(ITOP)포럼을 창설, 최소한 한·중·일 3국간 섬관광 지방정부 연대의 주도권을 잡았다.
![1998년 오라관광지에서 열린 1회 세계섬문화축제 [제이누리 DB]](/data/photos/201512/25373_34425_04.jpg)
게다가 1998년 수 년여 준비·기획·공사과정을 거쳐 아시아에선 가장 큰 회의중심의 리조트형 컨벤션센터를 서귀포 중문단지에 우뚝 세웠다. 그런 제주도이기에 그래도 일본에 밀리지 않는 인프라도 갖추고 있었다.

'중국의 제주도'로 불리는 하이난성과의 교류는 ‘섬문화축제’ 등이 기획되던 바로 그 때 그런 공격적 전략이 일환으로 시작됐다. 1995년 제주도와 자매결연을 했으니 올해로 꼭 20년이 됐다.
교류 20년을 기념, 제주예술단을 포함해 185명의 대규모 제주대표단을 이끌고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말 4일여의 시간을 하이난에서 보냈다. 더불어 하이난 현장을 지켜보며 수많은 상념에 잠겼다.
무엇보다 규모였다. 그저 같은 섬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겠지만 그게 아니다. 인구가 903만명이고, 그 섬땅의 면적은 제주의 18배나 된다. 남한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의 제주와 서귀포격인 하이쿠어(海口)시와 산야(三亞)시는 시속 200km의 고속열차가 연결한다. 공항은 이미 3곳이 버티고 있고, 추가로 2곳이 더 개항하기 위해 공사에 들어갔다.
2006년까지 12만톱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으로 산야 크루즈항을 개발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부터 22만5000톤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선지 하이난성 류츠구이(劉賜貴) 성장이 ‘제주의 날’ 개막식 현장에서 던지는 인사말의 어조는 곳곳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다. 게다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적극 후원, ‘해양관광특구’로 조성하도록 특명을 내렸다니 한 마디로 부러움이다. 류츠구이 성장은 이를 증명하듯 ‘제주의 날’ 선포식 인사만 마치고 그 즉시 베이징행 항공편에 몸을 실었다. 중앙정부와 협의할 사안이 많아서란다.
더 부러운 것도 봤다. 특유의 사회주의적 정책이다. 무분별한 해안선 개발이 곤란하다고 판단을 내린 정부의 특명으로 아예 해안선 200m 이내 지역에 대한 개발을 불허하는 정책 추진에 들어간 것이다. 기왕의 건축물도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허물기 작업에 들어갔다. 국가사회주의 시스템에 걸맞은 저돌적 자연보전 정책이었다.
이 쯤까지 접하고 나니 두려움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교류 20여년 동안 하이난은 우리를 꾸준히 지켜봤다. 우리의 특장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의 섬 전체에 대한 전면개조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 판에 회한이 밀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선점했던 대표 문화인프라인 ‘세계섬문화축제’는 지금 우리 손을 떠났다. 어이 없는 행사진행과 기획으로 만신창이가 된 섬문화축제는 2001년 2회 축제를 끝으로 폐지됐다. 정책결정자의 무지와 비전의 빈곤으로 우린 우리의 간판을 내렸다.
어느 지사에 이르러선 5000석으로 예정됐던 컨벤션센터 마저 3500석으로 규모를 줄였다. 10년도 내다보지 못해 제주는 지금 대규모 컨벤션 행사를 열기엔 규모가 작다며 제2컨벤션센터를 준비해야 할 판이 됐다. 더욱이 지금의 컨벤션센터는 회의중심의 센터이기에 대규모 EXPO를 열기엔 무리다. 전시컨벤션센터 인프라가 우린 지금 없다. 물론 하이난섬은 한 눈에도 부지가 아닌 건물 내부면적만도 1만평이 넘음 직한 번듯한 전시컨벤션센터를 갖추고 있다. 지난달 말 제주관광홍보관이 차려진 바로 그 컨벤션센터다.
비전은 그래서 중요하다. 무엇을 선점해야 할 지 알아차릴 식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우린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며 ‘비전의 시기’를 ‘갈등과 분열의 시기’로 만들어 버렸다. 잘 다져놓은 전임자의 정책들이 무참히 도륙됐고, 심지어 ‘죽 쒀서 개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러다 하이난섬이 ‘아시아 관광의 맹주’로 군림하게 된다면 우리로선 한 마디로 곤혹이다. ‘빛 나는 보석섬’이 아니라 그저 옆에서 떡고물이나 챙기는 ‘부속효과’나 기대해야 할 제주도가 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신세는 사실 막판 잊혀지는 존재다. 그 점에만 안주하면 잘못하다 중국관광객은 커녕 아시아 관광객 전체를 하이난 시장에 빼앗길 수도 있다.
항공편 2시간 이내 거리에 동북아 주요도시와 맞닿을 수 있는 요충지에 있는 게 제주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들을 우리 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인프라는 제대로 갖췄는지 의문이다. 경쟁자가 등장했기에 그래서 시간이 없다. 보존하려면 제대로 보존하고, 개발하려면 제대로 개발에 나서야 한다.
다 잡은 물고기를 굳이 버릴 필요도 없다. 세계섬문화축제는 이 참에 부활의 길을 걸어야 한다. 아무리 곱씹어봐도 제주에서 그만한 대형기획이 나오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이러다 하이난이 섬문화축제 간판을 들이대면 우리로선 바로 망연자실(茫然自失)이다. 제주도정 관계자에 따르면 하이난은 이미 섬관광정책포럼의 주무대를 하이난으로 이설하고 싶은 속내를 내비쳤다.
오키나와의 도전에 앞서 튼실히 다졌던 우리의 대응력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진가를 발휘했다. 그러나 하이난의 도전에 손 놓고 있다간 향후 수십년 통탄의 세월을 보내야 할 지도 모른다.
제주도정 책임자만 쳐다 볼 일이 아니다. 제주 전체의 전면적 응전의 에너지 결집이 필요한 시기다. ‘제2공항 건설’은 바로 그 응전의 시험대다. 우리 후세대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리의 책무가 시작됐다.
언제나 그런 도전과 역경·시련에 맞서 불굴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던 게 원래 우리 제주인의 진면목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