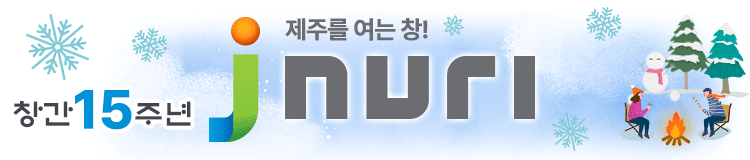이달 28일 중국 하이난(海南)섬 하이커우(海口)시 컨벤션센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한 해양관광박람회 현장은 903만 하이난 인구를 실감케 했다. 드넓은 전시공간을 둘러보며 밀려든 인파에 시달렸다. 하지만 제주관광홍보관에 다다르기 전까지 가설은 ‘그래 봤자’였다.
한 마디로 아니었다. 우리 홍보관은 아시아권 어느 지역이 설치한, 더 솔직히 말하면 단연 그 현장에서 최고였다. 최고의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고, 규모는 가장 컸으며 색채는 녹색과 청색으로 제주를 상징, 가장 세련된 느낌으로 눈 앞에 다가왔다.
제주관광공사가 중심을 잡고 제주테크노파크(TP)와 민간기업이 각을 잡은 우리 홍보관은 분명 흥행돌풍이었다. 솔직히 자부심이 들었다. 인파는 넘쳤고, K-POP 공연까지 곁들이며 관람객의 혼을 쏙 빼놓는 ‘질주’의 현장을 가만히 지켜봤다.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주인’으로서 자부심으로 다가왔다.


중국인들의 제주에 대한 관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우리의 준비와 대응력이 없었다면 보여질 수 없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흥행돌풍을 만들어낸 현장의 주역인 김남진 제주도 투자정책과 중국협력팀장, 문경호 제주관광공사 마케팅사업처장, 고광희 제이어스(J'ers) 본부장 등의 수고로움에 굳이 이름까지 거명하며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그 감동은 사실 하루 전에도 있었다.
27일 오전 11시 하이커우시 아시아 미식(美食) 박람회 현장. 우리의 탐라문화제 격의 그들의 대표축제인 환러(歡樂)제의 부대행사로 열린 아시아 맛 축제다.
역시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은 한국관은 발 디딜 틈도 없는 북새통이었다. 고양숙·채인숙 제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와 김지순 제주향토음식 명인 등이 손잡고 펼쳐놓은 제주의 요리향연은 하이난 중국인들의 입을 사로잡았다. 줄을 지어 입장하는 행렬, 맛보기 위해 줄 지어선 행렬을 보며 오히려 이해가 안될 정도였다.


“반입을 금지한다는 세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하루 반나절을 기다리며 한치·돼지고기 등 제주산 식재료를 기어코 박람회 현장으로 부득부득 우겨 가져갔다. 우리 식대로 음식상을 차릴 수 있었다. 그래야 제주맛이 난다고 제주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데 백방으로 뛰는게 제 역할이었죠.”
현장의 상황을 만들고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닌 박성연 제주도 식품산업 담당의 말을 들을 땐 사뭇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바로 그 전날인 26일 밤 하이난 문예종합센터 공연장을 가득 메운 열기는 바로 그 흥행을 예고한 전주곡이었다. ‘제주의 날’ 선포를 겸해 홍보영상과 공연으로 100분여간 하이난 중국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전략’(?)이 주효했다.
제주도립예술단·무용단과 퓨전국악밴드 ‘제주락’이 선보인 공연은 그래서 3일간 종횡무진 달린 ‘제주호’의 길트기 노릇을 충분히 했다. 이 점에서도 오랜 시간 그 기량을 갈고 닦느라 오랜 세월 수고했을 공연진에게 찬사를 보낸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았다. 나중 귀국길 항공편에서 마주치던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며 고마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이 바로 세계시장 최전방에 선 우리 문화의 ‘전사’란 점도 사뭇 다시 알았다.


그러나 감동 뒤에, 잔치판 뒤에 홀연히 남겨진 느낌이랄까?
185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중국 하이난을 휩쓸고 되돌아온 지금.
벅찬 감동과 자부의 뒤에 소스라치듯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오는 것이 있다. 돌연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 두려움이 밀려오는 게 있다.
이러다 말 그대로 망연자실(茫然自失) 짝이 나는 건 아닐까? 무언지 모를 그림들이 머릿 속을 떠다니다 조각조각 꿰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다시 다가오는 이름들은 제주와 오키나와, 그리고 하이난이었다. <하이난 단상-2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