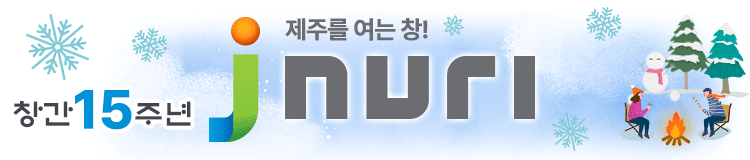마틴 맥도나(Martin McDonagh) 감독의 2022년 작품 ‘이니셰린의 밴시(The Banshees of Inisherin)’는 제목만큼이나 독특하고 흥미롭다. 그해 베니스 영화제를 석권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여러 부문에서 최고의 후보에 올랐다. 더스쿠프의 ‘영화로 본 세상’, 이번엔 이 영화를 펼쳐봤다.
![대한민국의 증오가 만들어낸 집착들이 엽기적인 비극을 잉태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936/art_1693976222657_64a67a.jpg)
영화는 ‘이니셰린’이라는 아일랜드 가상(假想)의 작은 섬에서 벌어지는 파우릭(콜린 파렐)과 콜름(브렌던 글리슨)이라는 두 친구 사이에 절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소 황당하고 엽기적인 사건을 다룬다.
두 인물이 벌이는 짓들은 분명 황당한 코미디에 가까워 보인다.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에 1922~1923년 터진 아일랜드 내전이란 비극적 역사를 밑그림으로 놓으면 대단히 마음 착잡해지는 비극적 블랙코미디가 보인다.
아일랜드 내전을 깔고 있는 이 영화의 각본을 쓰고 영화로 만든 인물은 짐작대로 아일랜드 출신이다. 맥도나 감독은 런던에서 차별받는 아일랜드 출신 가난한 노동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 ‘무학(無學)’에 가까움에도 탁월한 재능을 꽃피운 입지전적인 작가이자 감독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자부심은 남다르다.
맥도나 감독은 “스토리텔러의 유일한 의무는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창조할 재능이 없는 저능아들이나 자신이 경험한 자전적 이야기를 쓴다”는 위험한 발언을 당당하게 할 만큼 거침이 없다.
그는 “겸손해야 한다고? 나는 겸손이 싫다. 잘났으면 잘나지 않은 척하지 말아야 한다. 무하마드 알리처럼 자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증명하면 된다”면서 비겁한 겸손함을 조롱하기도 한다.
사실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겸손하지도 않은 것이 문제이지 정말 잘났으면 겸손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이 오히려 불편하다. 맥도나 감독은 자신이 연출한 영화 ‘이니셰린의 밴시’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겸손하지 않아도 괜찮을 작가이자 감독이라고 부를 만하다.
파우릭과 콜름은 동네에서 매일 붙어살다시피 한다. 둘은 하루도 안 거르고 마을의 사랑방이기도 한 펍(pub)에서 흑맥주 한 잔 놓고 온갖 심각하지 않은 주제들을 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드는 절친이다.
그런데 어느날 콜름이 그야말로 중국의 기예인 변검(變脸)처럼 안면을 바꾸고 절친 파우릭에게 ‘다시는 나를 아는 척도 말라’고 일방적으로 절교를 통보한다. 절교 선언의 이유도 말해주지 않는다. 어안이 벙벙한 파우릭이 이유라도 알자고 하자 ‘이유 따윈 없다’며 저승사자 같이 감정 없는 대답만 반복한다. 세상에 이유 없다는 것보다 강력한 이유는 없다.
![영화 ‘이니셰린의 밴시’ 속 절친은 이상한 집착에 빠져든다.[사진=더스쿠프 포토]](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936/art_16939762222289_c5aa2a.jpg)
이쯤에서 파우릭이 순순히 콜름의 절교선언을 수용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각자의 평온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파우릭은 그러지 못한다. 끔찍한 집착에 사로잡힌다. 파우릭은 자신이 콜름의 절교를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자신이 그만큼 콜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하지만, 집착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욕망이다. 스토킹의 출발점이다. 사람 좋은 파우릭에게는 콜름 말고도 친구들이 많다. 콜름 하나 떠난다고 마을의 외톨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닐 텐데 파우릭은 갑자기 콜름이 떠나면 당장 죽을 것처럼 집착한다.
집착하기는 콜름도 파우릭 못지않다. 나중에야 콜름의 절교선언 이유가 밝혀진다. 나름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자신이 마을의 시시한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낭비했다는 각성을 하고 그중 제일 만만하고 편해서 시간을 유독 많이 낭비했던 것 같은 파우릭을 콕 찍어 절교선언을 해버린 터였다. 그 후에도 다른 마을 사람들과는 여전히 ‘시간낭비’를 하면서 파우릭에게만은 단 1분도 시간낭비를 할 수 없다는 ‘집착’을 한다.
집착에 빠져든 파우릭과 콜름은 막장으로 치닫는다. 콜름은 파우릭이 자신에게 집착할수록 ‘절교’에 더욱 집착한다. 급기야 콜름은 파우릭이 또다시 자신에게 말을 걸면 그때마다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생명과도 같은 자기 손가락을 한개씩 자르겠다고 선언하고 실행에 옮긴다. 결국 콜름은 손가락 다섯개를 모두 자를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집착한다. 그렇게 ‘이니셰린 섬’의 엽기적일 정도로 비극적인 블랙코미디가 완성된다.
![전현직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도를 넘는다. 모두 집착의 산물일까.[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936/art_16939762218353_e21bc1.jpg)
1987년 하버드대학의 심리학자 대니얼 웨그너(Daniel Wegner)는 유명한 ‘흰곰 실험(white bear experiment)’을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하기 어려운지 밝힌다. 간단히 말하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생각난다는 것이다.
대니얼 웨그너는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흰곰 생각에 빠져든다고 「흰곰을 비롯한 원치 않는 생각들」이란 자신의 저서에 기록한다. 흰곰까지 갈 것도 없이 한번이라도 금연을 시도해 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이론이다.
인터넷 기사 댓글을 보노라면 정치와 아무 관련도 없는 기사에까지 뜬금없이 현직과 전직 대통령을 증오하는 댓글들이 넘쳐난다. 생각만 해도 불쾌한 서로 다른 대통령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생각을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집착에서 빠져나오기 어지간히 힘든 모양이다. 파우릭과 콜름의 집착을 닮은 듯하다.
오늘 대한민국의 증오가 만들어낸 집착들이 누군가의 손가락 다섯개를 모두 잘라도 끝나지 않을 또다른 엽기적인 비극을 잉태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하다. 분명 코미디이지만 비극적인 블랙코미디다. [본사 제휴 The Scoop=김상회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