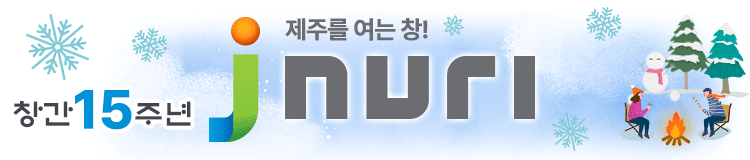이니셰린 섬은 아일랜드에서 격리돼 너무나 똑같거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작은 공동체다. ‘다름’이 없으니 자극이 있을 리 없고, 자극이 없으니 변화가 있을 리 없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은 오늘과 똑같을 것이 분명한 질식할 듯한 따분함과 권태감만이 짓누른다.
![다른 소리나 쓴소리, 혹은 비판은 배척하고 경계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146/art_1700110729398_737931.jpg)
변화가 없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퇴화를 뜻하기도 한다. 모두 똑같다고 평화스러운 건 아니다.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 이니셰린의 주민들은 모두 똑같이 오리올단 부인이 운영하는 동네 유일의 잡화점에 모여 생사람 잡는 ‘가십(gossip)’에 열을 올리거나, 아니면 파우릭과 콜름처럼 사소하다면 사소한 ‘절교’ 문제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기도 한다.
콜름은 절교의 실현을 위해 손가락 5개를 모두 자르고, 파우릭은 절교를 당하느니 차라리 너를 죽이고 말겠다며 콜름의 집에 불을 지른다. 그렇게라도 해야 질식할 것 같은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양이다.
이처럼 매우 균질적으로 똑같은 이니셰린의 주민들 중에서 균질적이지 않은 거의 유일한 ‘다른’ 주민이 파우릭의 여동생인 시오반(Sioban)이다. 시간이 중세 어느 시점쯤에서 멈춰버린 듯한 이니셰린 섬에 표류한 듯한 현대 여성이다.
마치 갈라파고스 섬에서 진화하지 않은 거대한 땅거북이 틈에 섞여있는 진화를 거듭한 한마리 바다거북이처럼 생뚱맞은 느낌이다. 이니셰린 섬에서 가장 교육받은 여성이기도 하고, 오리올단 부인의 잡화점에서 마을사람들과 가십에 열을 올리며 시간을 보내기보단 집에서 혼자 독서로 소일하는 노처녀다.
당연히 오리올단 부인의 잡화점에 들러도 필요한 물건만 사고 잡화점 여주인 오리올단 부인이나 동네 아낙들과는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매몰차게 나온다.
가십에 열을 올리던 아낙들도 시오반이 나타나면 모두 대화가 ‘일시정지’ 모드로 변한다. ‘이니셰린 아낙네’답지 않은 시오반을 바라보는 동네 아낙네들의 시선이 몹시도 불편하다. 시오반이나 동네 아낙네들이나 서로 불편하다.
동거하는 오빠 파우릭에게 상냥한 여동생이긴 하지만 가장 ‘이니셰린스러운’ 파우릭과 대화가 이어지기는 불가능하다. 시오반이 노처녀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결국 마을에서 이질적인 존재였던 시오반은 아일랜드 본토로 떠난다. 이니셰린을 떠난 지 한참만에 시오반이 오빠 파우릭에게 보내온 편지 내용이 인상적이다. 그곳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데, 이니셰린을 떠나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새로 정착한 그곳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많아서 좋다고 한다.
![영화 속 시오반은 ‘기계적 균질’을 이기지 못한 채 섬을 떠난다.[사진=더스쿠프 포토]](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146/art_17001107276329_6bd6c6.jpg)
스페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내전에 시달리는 아일랜드 사람들처럼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지 않고 일찌감치 대항해에 나서 지금의 미국대륙 전체와 필리핀까지 식민지로 개척한 사람들이다.
스페인 국기에 들어있는 문장(紋章)은 가장 스페인적이다. 2개의 기둥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다. 대항해 시대 이전까지 유럽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으로 알려졌던 헤라클레스가 바다를 가르면서 만들어졌다는 지브롤터(Gibraltar)와 세우타(Ceuta) 섬이다.
국기에 사용한 엠블럼은 ‘PLUS ULTRA(세상의 끝을 넘어서)’이다. 안에 갇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세상 끝을 넘어서겠다는 사람들이다. 미국사람들의 ‘뉴프런티어십’의 원조격이다. 그렇다보니 순혈주의 아일랜드 사람들과는 달리 인종적 문화적으로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시오반이 원하던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시오반은 숨통을 조일 것같이 너무나 균질적으로 ‘같은’ 사람들만 모여사는 아일랜드의 이니셰린 섬을 떠나 많은 스페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편안함을 느낀다, ‘같음’이 주는 불편함과 ‘다름’이 주는 편안함이다.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의 창시자인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는 “문명이란 막연하고 비논리적인 같음에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다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스펜서의 정의가 옳다면 1920년대 이니셰린 섬은 아직 문명화하지 못한 사회다.
그것이 이니셰린 섬만의 모습일까. 휴전선으로 한반도 허리가 잘리면서 대한민국이 언제가부터 ‘반도’가 아닌 사실상 ‘섬’이 돼버려서일까. 아니면 우리도 아직 아일랜드 사람들처럼 단일민족의 신화(神話)에 사로잡혀 있어서일까.
우리도 이니셰린 섬 사람들처럼 유난히도 ‘막연하고 비논리적인 같음’을 요구하고 당연시하고 ‘명확하고 논리적인 다름’에는 적대적이다. 우리도 자신들과 다른 시오반을 배척하는 사회인 듯하다. 사회진화론자 스펜서가 2023년 대한민국을 관찰한다면 우리에게도 미(未)문명적이라는 딱지를 붙일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도 이 당(黨) 저 당(黨) 가릴 것 없이 당 내에서 나오는 다른 소리나 쓴소리, 혹은 비판을 ‘품위 손상’ ‘해당 행위’ ‘내부총질’로 규정하고 경고를 날리고, 당원권을 정지시키기도 하고, 아예 제명해버리자고 부들거리기도 한다. 몇몇은 그럴 거면 상대 당으로 가버리라고 비분강개한다.
다수와 다른 생각을 하면 시오반처럼 이니셰린 섬을 떠나야 한다. 그들 모두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진다. 아마도 그들은 1930년대 활동한 독일의 유명한 정치사회학자 칼 슈미트(Carl Schmitt)가 정의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양이다.
![우리나라 정당은 ‘같음’을 강요한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일까.[사진=뉴시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146/art_1700110724805_0ba1f1.jpg)
대단히 뛰어난 정치이론가였던 칼 슈미트는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주의란 두가지 원칙에 기반을 둔다. 첫째는 똑같은 사람을 똑같게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똑같지 않은 사람을 똑같지 않게 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같음’을 실현하고 ‘다름’을 제거하고 추방해야만 하는 것이다.”
극우 정치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만한 인물이다. 이 주장만으로 칼 슈미트가 히틀러의 총애를 받았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칼 슈미트는 나치당 당원으로 맹활약했다.
칼 슈미트의 ‘민주주의론’은 서구에서는 당연히 폐기됐지만, 불행하게도 21세기 대한민국 정당과 조직에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듯하다. 이 이론은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 서구 정치사상가 가운데 가장 그럴듯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기도 하다. 칼 슈미트의 ‘민주주의론’이 민주주의라면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정당들도 모두 ‘민주정당’이 맞겠다. [본사 제휴 The Scoop=김상회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