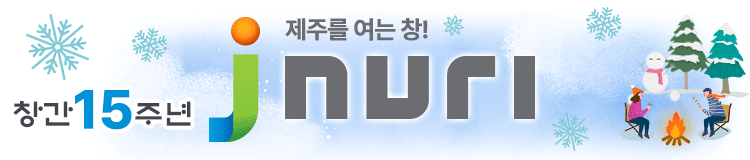나름대로 음악교육을 받은 ‘인텔리’이자 연장자이기도 한 콜름이 ‘동네 바보형’인 파우릭에게 절교를 선언했다면 콜름의 뜻이 관철되는 게 통상 정상적이다. 한데 파우릭은 의외로 절교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를 고집한다. 예상치 못한 파우릭의 고집에 멈칫했던 콜름은 한 번만 더 말을 걸면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다. 그래도 파우릭이 말을 걸자 정말 손가락을 자르는 엽기적인 총공세를 펼친다.
![권력자가 국민을 개돼지 쯤으로 보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249/art_17019249668384_5395f2.jpg)
파우릭은 콜름의 난폭한 공세에 난폭하게 대응하지도 않는다. 격렬하게 그 부당함을 따지지도 않는다. 그저 무표정하게 눈만 껌뻑거릴 뿐이다. 그러면서도 절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
콜름이 유리할 것 같았던 싸움은 묘한 방향으로 흐른다. 싸움을 시작했던 콜름이 점점 수세에 몰린다. 무엇보다 바이올리니스트의 생명과도 같은 손가락 5개를 모두 자른 건 치명적이다.
결국 콜름이 먼저 “아일랜드 내전도 끝난 모양이니 우리도 이쯤에서 싸움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고 슬그머니 종전을 제의한다. 그런데 모두 ‘없었던 일’로 하자는 콜름의 제안에 감지덕지할 것 같았던 파우릭은 뜻밖의 무시무시한 대꾸를 한다. “아니다. 이 싸움은 네가 죽어야 끝난다.”
그렇게 콜름이 일방적으로 우세할 것 같았던 이 기묘한 싸움은 콜름의 완패로 끝난다. 콜름은 상대를 만만하게 보고 고스톱 판을 벌였다가 진정한 ‘타짜’에게 걸려서 손가락 5개 모두 털리고, 집까지 불타 없어지고, 목숨만 살려달라는 ‘호구’ 꼴이 된다. 만만해 보였던 파우릭은 ‘종전 제안’을 거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콜름의 목숨까지 요구한다.
요즘 집권당에서 몇몇 당원에게 내렸던 징계를 철회하고 사면을 해서 다시 받아주겠다는데 정작 사면대상자들이 절대 사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기탱천하고 오히려 당대표가 먼저 물러나야 이 싸움이 끝난다고 선언하는 풍경과 많이 닮았다. 파우릭과 콜름의 싸움만큼이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나 결과를 흔히 ‘아이러니(irony)하다’고 말한다면 ‘이니셰린의 밴시’는 ‘아이러니 극(劇)’이다. 아이러니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Nicomachean Ethics)」 중에 나오는 ‘희극론’에서 기원한다.
![권력자가 국민을 개돼지 쯤으로 보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249/art_17019249649977_f7c3cc.jpg)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세상을 투영하는 희극에는 항상 어수룩해 보이고 약자인 ‘에이론(eiron)’과 잘난 척하지만 실상은 우둔한 ‘알라존(alazon)’이 등장하는데, 어수룩하고 약자로 보이는 ‘에이론’이 잘난 척하는 ‘알라존’에게 승리를 거둔다고 한다. 이니셰린의 밴시에서 파우릭은 ‘에이론’이고 콜름은 ‘알라존’인 셈이다.
‘알라존’은 권력자들이고 ‘에이론’은 힘없어 보이는 백성들이기도 하다. 어수룩해 보이는 ‘에이론’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뜻밖의 상황을 아이러니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이니셰린의 밴시와 같은 상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이론’이라는 신조어를 그리스어로 위장을 뜻하는 ‘에이로니아(eironia)’에서 따왔다고 한다. 파우릭이 어수룩해 보이지만 단지 어수룩한 척 위장했을 뿐인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권력자들이 보기에 백성들이 개돼지처럼 단순하고 못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위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러니 극(劇)’ 이론에는 ‘에이론’과 ‘알라존’이라는 캐릭터들 외에, 상식을 뒤집는 ‘아이러니’를 발생시키는 주범 격인 또 다른 캐릭터가 있다. ‘보몰로쿠스(bomolochus)’라는 캐릭터들이다.
현란한 말재주로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알라존’을 현혹시키거나 부추기는 어릿광대와 같은 캐릭터다. ‘보몰로쿠스’가 있어야 비로소 잘난 척하는 ‘알라존’에게 제대로 망조가 들고 어수룩한 ‘에이론’이 승리하는 한 편의 아이러니가 완성된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보몰로쿠스들이 등장한다. 1340년 슬루이 해전(Battle of Sluys)에서 프랑스 함대가 당시만 해도 별 볼 일 없던 영국 해군에 궤멸적인 패배를 당한다. 당시 프랑스 필립 6세에게 누군가 보고를 하긴 해야겠는데 난감하다.
![집권당에서 몇몇 당원에게 내렸던 징계를 철회했다.[더스쿠프=뉴시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249/art_17019249624393_817a8f.jpg)
현란한 말솜씨로 필립 6세의 ‘이쁨’을 받고 있던 측근이 총대를 메고 그 패전을 이렇게 보고한다. “폐하! 우리 프랑스의 수많은 병사가 가라앉는 배에서 용감무쌍하게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영국군은 그럴 용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천재적인 ‘패전 보고’다. ‘졌잘싸’라는 것인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겼다’는 것인지, ‘지금처럼 싸우면 무조건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보고다.
필립 6세도 패전을 패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다음 승리를 기약하기 위한 대책도 없다. 그렇게 프랑스가 휘청대기 시작한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화다.
1970년대 니카라과를 시작으로 남미의 정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을 때, 많은 학자가 그 원인을 민중의 분노와 요구에 지도자들이 ‘지나치게 늦고 그마저도 미흡하게(too late, too little)’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정권에선 공통적으로 수많은 보몰로쿠스가 현란한 말솜씨로 지도자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 흔적이 나타난다. 우리네 권력 주변에는 그런 보몰로쿠스들이 만에 하나라도 없기를 소망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김상회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