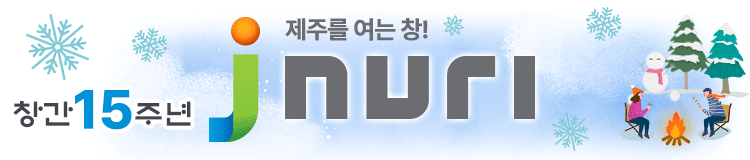표지에 백마를 탄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단숨에 넘을 것 같은 그림만 보아도 정복욕이 저절로 솟아났었다.
나중에 이 그림이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왕관을 쓰고 황제가 된 나폴레옹을 영웅(우상)으로 추앙하기 위해 다비드라는 화가가 야욕적으로 그린 정치선전물이란 걸 알았다.
병사들의 뒤에서 노새를 타고 알프스를 넘은 나폴레옹보다 다비드의 그림재주가 더 비루하게 생각되었다.
얼마 전에 다비드의 그림에 빗대어 볼만한 진경(眞景)이 도내 신문지상을 장식했다.
金형이 회장으로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를 비롯한 관변단체들의 도정이슈에 대한 찬양광고가 그것이다.
광고의 문구마저 천편일률적인 소위 ‘그들의 입장’은 과연 주관적인 애향심의 발로인가, 아니면 모종(某種)의 ‘완전정복’을 도모함인가.
그들의 몰개성(沒個性)이 만들어 내었을 만만치 않은 민심(?)에 최소한의 의문이 든다.
산전수전 다 겪은 李형의 좌우명은 ‘시류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다.
‘모난 돌’이 못되는 유약함을 스스로 위로받거나 의분에 복받친 상대방으로부터 수세를 모면하고자 할 때 그가 곧잘 떠 올리는 말이다.
아마 5공비리 청문회에서 일해재단 성금의 부정성(否定性)에 대한 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오늘날의 현대가 있기 까지 불가피한...” 운운하는 군색한 변명에 감화되었거나, 나이가 들면서 왕년에 열혈이 식어 내 가족과 내 호주머니의 문제가 아닌 바에야 굳이 구업(口業)을 지지 않겠다는 소시민적 귀착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살아 보니까 맞다. 성가신 것은 관여하지 않거나 입방정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럭저럭 잘 지내려면 서로 건드리지 않고 적당히 비위맞추며 난장판은 슬며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속으로는 비위가 상해도 세상의 나쁜 체질에 적당히 물들지 않으면 여간해서는 살기가 어려운 것이 시류이니까 순응하지 않을 재간도 없다.
인정한다. 연민도 느낀다.
그래서 朴형마저 李형처럼 그런 ‘시류에 편승’하며 산다.
그러나 어떤 때는 마냥 그렇게 사는 내 꼴이 눈물겹지 않은가.
시류가 쾌청하면이야 무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金李朴 누구에게나 인지상정이랄 수 있겠지만, 룸살롱에서 분냄새에 취하고 절 방에서 시줏돈으로 도박하는 파계승이 종무원장하겠다고 나서도 “뭐가 대수냐”는 범승(凡僧)들의 무념무상함이란...
빗대어 요사이 여론조사에서 세분들에게 보내준 도민들의 너그러운 지지율이란...
사회는 소수의 악의보다 다수의 게으른 선의에 의해 더 많이 나빠진다고 했던가.
그러나 나쁜 것은 나쁠수록 내막을 들여다보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
나쁠수록 나와는 무관한 것 같던 일들이 어느 날 나의 일상 속으로 유의미하게 다가오고야 만다.
그래서 굳이 루소의 사회계약설이 아니더라도 나는 갑(甲)인 천부의 개인이며 을(乙)인 사회인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시민의 역할에 어느 정도라도 나의 자아를 할애하여 사회의 나쁨을 살펴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수와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게으른 선의들 속에서 서성이고 있는가.
또 다른 金형과 李형인 우리들은 왜 사회라는 체제 속으로만 들어오면 누구 하나 “여기 질문 있습니다.”하고 손 한번 번쩍 들어 볼 용기마저 없는 힘 빠진 연체동물이 되어버리는 것인가.
글을 쓰면서 늘 겪는 고통은 무슨 말을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를 더 고민한다.
내 말이 비판을 넘어서 사분(私憤)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성찰은 무참하기까지 하다.
여전히 ‘시류에 불응’이 내 마음에 남길 찰과상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글발이 무디어 진다.
그러나 부조리에 눈감고 진실에 무지하며 불공정을 방관하는 다수의 ‘시류에 순응’이 세계로 가는 제주호를 황천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제주호의 난간과 갑판 아래에서 온 몸으로 숨 가쁘게 노를 젓고 있는 기구한 하류들의 삶이 온전히 그들 개인만의 문제인가에 대한 생각마저 아예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누구의 말마따나 민심은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심이 마냥 ‘시류에 순응’하면 누구에게는 민심이 만만해져 버릴 수도 있다.
책에서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다’고 배웠다.
책을 읽으면 용기가 생기고 책대로 살려면 겁이 나는 세상이다.
사회를 제대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운 사회인이 될 수 없는 사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무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가엾게 ‘낱’쪽의 안간힘을 쏟았던가...

| ☞김성민은? =탐독가, 수필가다. 북제주군청에서 공직에 입문, 제주도청 항만과 해양수산 분야에서 30여년 간 공직생활을 했다. 2002년엔 중앙일보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주관한 제26회 청백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전력도 있다. 그해 12월엔 제주도에 의해 행정부문 ‘제주를 빛낸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8년 월간 한맥문학사의 ‘한맥문학’에 의해 수필부분 신인상으로 등단한 수필가다. 공직을 퇴직한 후에는 그동안 미루어 왔던 깊은 독서와 보이차의 매력에 흠뻑 젖어서 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