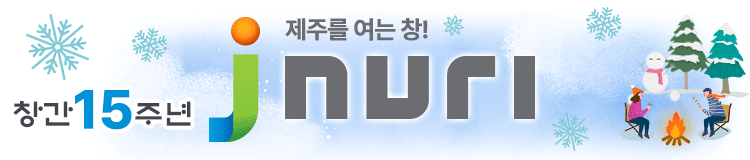벌써 이십 년이 지났다. 1999년 봄부터 초여름까지 천미천을 탐사했다. 한라일보사에서 강문규 기자가 기획한 하천 탐사에 동행하게 되었다. ‘한라산 학술 대탐사’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인 탐사의 제1부가 하천과 계곡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멤버가 아니었다.
어느 날 시청 앞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강문규 팀장이 “시간 나면 언제 한번 같이 가게”라고 하여 그러겠다고 해두었다. 동행의 목적은 하천을 한번 걸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지않아도 당시 오름을 전수 조사한 후라서 야외조사에 불이 붙기 시작하던 때였다. 동굴도 따라가 보았다.
벵듸굴을 하루종일 기어서 그야말로 고생 직 싸게 했다. 하천과 한라산 계곡도 보고 싶었다. 마음속으로 나는 제주의 자연 전부를 단지 보고 싶었다. 그러고 보니 한라산과 오름은 물론 곶자왈, 하천, 해안선과 섬을 거의 다 둘러본 셈이다.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봐야 연구를 하던지, 생각을 할 것이 아닌가.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자연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면서 느껴야만 한다. 탁상공론은 안 되고 제주도야 하루만 시간 내면 어디라도 갈 수 있으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던 차에 마침 일요일에 시간이 나서 한번 구경이나 하자고 천미천 조사를 시작하는 날에 탐사단과 같이 걸은 게 어쩌다 보니 5년 동안이나 하천과 계곡을 조사하며 냇창을 쉼 없이 걷게 된 계기가 되어버렸다.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 천미천
제주에는 60여 개의 지방하천이 있는데 16개 주요 하천을 탐사했다. 대부분의 큰 하천은 모두 조사한 셈이다. 천미천, 효돈천, 한천은 책자로도 발간되었다. 맨 처음 발간(2000년 2월)된 것이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 천미천’이다.
이어서 효돈천과 한천이 책자로 출간되었다. 효돈천과 한천은 한라산의 남북사면을 대표하는 하천이다. 효돈천은 한라산 백록담 남벽에서 발원하여 ‘산벌른 내’로 하여 ‘돈내코’를 지나 ‘쇠소깍’에서 바다와 만난다. 한라산 북측에서도 똑같이 한천은 백록담 북벽에서 발원하여 ‘탐라계곡’으로 하여 ‘방선문’을 지나 ‘용연’에서 바다와 만난다.
천미천은 한라산 백록담 동쪽의 어후오름 상류의 돌오름 기슭에서 발원한 후 동쪽으로 흐르다 부대악, 부소악, 비치미, 개오름 등의 오름군에 막혀 남쪽으로 방향을 튼다. 그리하여 동부 중산간에는 하천이 없다. 발원지는 해발 1160m의 돌오름 하류이다. 천미천 하구인 하천리에서 이곳 발원지 폭 1m 정도의 곡두까지 47km를 걸어왔다.

발원지 돌오름은 최근 연구 결과 제주에서 가장 최근에 분출한 화산체로 밝혀졌다. 지금부터 2천 년 전에 분화했다. 역사 시대가 시작되던 때였다. 돌오름 분화 후 다시 천년이 흐른 서기 1002년과 1007에 분화기록이 전해진다. 어후오름을 관통하는 경사 급변 점의 폭포가 위용을 자랑한다.
수직으로 용암류가 3단으로 층을 이룬 폭포는 높이가 거의 40m에 이른다. 한라산 속에 숨겨진 절경이다. 발원지 탐사를 한 이날 성판악 코스로 나오는데 길을 잃어 어두컴컴할 때가 되어서야 사라오름 옆으로 겨우 길을 찾았던 잊지 못할 고생의 기억이 남아있다. 교래리를 지나온 하천 줄기는 영주산까지 중산간 지대의 용암 평원을 사행천으로 흐르며 넓은 범람원을 만든다.
영주산 옆의 좁은 황통지 목을 넘으며 황토를 토해낸 선상지의 충적평야에 성읍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성읍리가 정의현의 읍성이 될 수 있었던 자연지형 조건이다. 이후 하류는 하천리까지 거의 직선으로 흐른다. 매년 호우시마다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한라산 동부 지역 중산간 지대의 모든 물이 모여드는 곳이라 홍수는 어쩔 수 없었다.
이 하류의 8.5 킬로미터 구간은 오래전부터 수차례에 걸친 하상정비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 때문에 이곳의 하천 바닥은 거의 원형을 찾아볼 수 없다.
아름다운 하천 바닥(냇창)의 암반 위를 걸어가는 여정
당시 탐사는 하천 하구의 바닷가에서부터 한라산 정상부의 원류를 찾아가는 고난의 행로였다. 아름다운 하천 바닥의 암반을 걸어 올라가는 건천 탐사는 제주에 사는 일반인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된다. 올해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천미천 중류를 한번 걸어보시길 바란다.
직접 걸어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 바닥의 현무암 암반을 포크레인으로 부숴버리고 시멘트를 바르는 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누구나 화가 나게 마련이다. 성읍 마을 뒤편의 영주산 옆에서부터 교래마을까지 구간을 걸어보라. ‘황통지’ 좁은 목에서부터 구불구불 물이 고여있는 사행천은 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정소암’과 어우러져 그야말로 비경이다.

이런 곳에 하천정비사업이라니. 하천정비사업이란 무엇일까. 몇 해 전 담당 공무원에게 이렇게 들은 적이 있다. 그에게 단지 홍수 예방이 목적이라면서 왜 이렇게 암반을 다 부숴야만 하는지 물었다. 대답은 의외로 충격적이었다.

하천 양안을 옹벽으로 하고 바닥까지 시멘트로 발라서 완전히 박스형으로 하면 인공적인 것이고, 양안의 옹벽에다가 바닥만 포크레인으로 골라서 그냥 자갈을 깔아 놓으면 ‘생태하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물이 하천 바닥으로 스며들게 하는게 생태하천이라는 말이다. 하천 바닥과 양쪽 벽의 암반을 포크레인으로 다 부숴버리고 말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생태하천의 하천정비사업의 실상이 이렇다. 제주도 현무암 화산지대의 건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육지의 우리나라 하천법에 따른 공사 방법이다. 제주의 건천은 육지의 강과는 다르다. 제주에 맞는 하천정비 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