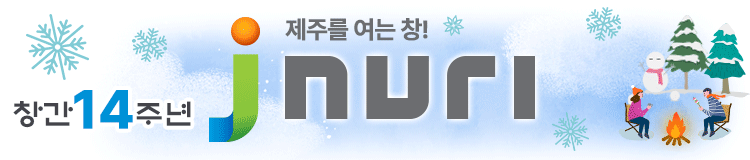![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높이는 선제 조치에 나섰다. 도심 고밀도 개발과 ‘제주형 압축도시’ 구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보지만, 실수요 기반과 시장 수용성, 공공성 훼손 가능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6/art_17449367995289_27f62f.jpg)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높이는 선제 조치에 나섰다. 도심 고밀도 개발과 ‘제주형 압축도시’ 구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보지만, 실수요 기반과 시장 수용성, 공공성 훼손 가능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고도관리 해제 앞두고 층수 완화? 이도·화북 재건축 단지 직격 수혜 = 도는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5층에서 25층까지 허용된다.
이는 도가 추진 중인 고도지구 고도제한 해제와 연계된 사전 조치다. 현재 도내 267개 지구에 설정된 고도지구는 1996년부터 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높이를 제한해왔다. 도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248개 지구의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착수한 상태다.
고도제한이 사라지더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층수 제한이 남아 있다면 고층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제도 간 충돌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정비 성격이 짙다.
직접적 수혜 지역은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제주시 일도·이도·삼도·용담·건입동 등 원도심 일대다. 특히 1987년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는 오는 5월부터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의 재건축이 시작되는데 조례 개정으로 최대 25층까지 확대가 가능해졌다. 화북주공과 일도지구 등도 유사한 혜택이 예상된다.
층수 완화는 곧 세대 수 증가로 이어진다. 분양 물량이 늘면 조합원 분담금은 줄고 사업성은 높아진다. 재건축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0일 열린 제주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6/art_1744936797362_fa500b.jpg)
◇ 실효성·형평성·지속가능성, 놓친 질문은 무엇인가? = 조례 개정이 가져올 사업성 향상에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부동산 업계와 금융권은 실현 가능성과 후폭풍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제주 부동산 시장은 이미 수요 한계에 직면해 있다. 노형·연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거지역에서 미분양이 누적 중이고, 매매가격도 정체 또는 하락세다.
제주도내 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조례만 풀린다고 사업을 바로 추진하긴 어렵다"며 "법적 여건은 열렸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일 사업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 관계자도 "금융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는 리스크 평가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다"며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자본 유입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매리츠증권 부동산PF 관계자는 "제주에 투자 붐이 일었을 당시 많은 업체들이 PF를 유치했지만 이후 잇따른 금융사고로 이어졌다"며 "이 때문에 현재 제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도는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고도제한을 풀어도 지금처럼 냉각된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시 고밀도화는 단순히 용적률 상향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인구 증가와 교통량, 폐수 처리, 상하수도, 주차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재정비가 병행돼야 한다. 또 무분별한 고층화는 교통혼잡과 경관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 후속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선(先)규제 완화, 후(後)정비’ 방식이 장기적 도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고도제한 해제는 도심 내 사회적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고층 아파트가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자산 가치 차이는 지역 간 불균형과 주거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중요한 것은 수용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민과의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향후 도민 반발과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도시계획은 물리적 설계가 아닌, 시민의 삶을 담는 구조다. 규제를 푸는 것보다 앞서 지켜야 할 가치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민선 8기 도정이 내세운 ‘15분 도시’나 ‘도심 재편’ 구상과도 방향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의 미래보다는 단기 성과에 초점을 둔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제주형 압축도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인지, 아니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일회성 정책에 그칠 것인지는 결국 도민의 감시와 참여에 달려 있다. 고도지구 해제는 단순한 고층화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곧 제주라는 공간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올해 1분기, 제주지역 아파트 분양 실적은 '0건'이다. 정책의 속도보다 앞서야 할 것은 냉정한 현실 진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해 전국 미분양 현황 그래프다. 제주는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6/art_17449367992444_dbce6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