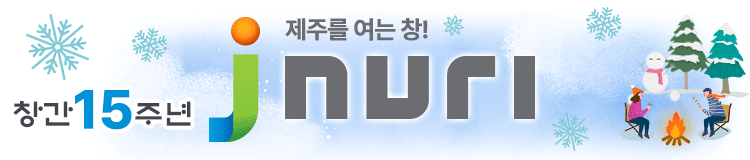해군사관학교를 64기로 나와 장교로 복무하며 어엿한 대위 계급장을 달았다. 제주방어사령부 정훈과장이란 보직을 받아 제주에 내려온 지도 근 한 달.
한 달 만에 그 청춘은 비상출동 명령으로 서귀포로 향했다. 8년여를 끌어오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현장.
기지조성 공사가 한창이건만 군 관사 공사현장 앞을 차지한 농성천막장이 ‘과제’였다.
그로선 국방부와 해군본부의 명을 받은 처지.
지난달 31일 국방부 장관 명의의 행정대집행 계획에 따라 오전부터 그는 서귀포 강정마을 현장을 지켰다. 100여명의 용역 등 1000여명의 인력이 동원돼 ‘해군기지 반대’를 외치던 농성천막과 망루는 모두 철거됐다.
고단했다. 해군장교로서 소임을 다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늦은 시각 그는 서귀포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하지만 그 숙소가 그가 마지막을 맞이할 운명의 장소인지는 그도 몰랐다.

야심한 새벽 무렵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그는 창문을 열고 숙소 베란다로 나갔다. 입춘이 다가왔지만 아직도 찬 바람이 감돌았다. 객실에 남은 온기라도 사라질까 싶어 문을 닫았다.
그게 화근이었다. 무심코 닫은 문은 객실 밖에서는 열려고 아무리 손을 써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은 지 얼마되지 않은 건물은 ‘첨단’을 과시하듯 객실 내부와 베란다 사이를 2중창으로 설계했다. 숙소 내부에서나 문을 열 수 있지, 밖에서는 아예 열 수 없도록 ‘자동잠금’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도난방지 등의 이유였다.
하필이면 휴대전화기도 손에 쥐어있지 않아 도움을 요청할 길도 없었다.
막막한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는데 한 켠 구석에 로프가 달린 완강기가 눈에 들어왔다. 야심한 시각 고성으로 소동을 부릴 처지도 아니기에 완강기에 몸을 맡길 생각을 했다.
그 쯤은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아찔한 바닥을 내려보며 완강기에 연결된 로프를 몸에 감고 내려오다 그만 로프가 목을 휘감았다. 급작스레 목을 짓누른 로프에 정신은 혼미했고 이내 온 몸에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서귀포 강정포구 해군기지 부두 조성공사 현장. [제이누리 DB]](/data/photos/201502/22012_29084_128.jpg)
지난 1일 새벽 서귀포의 한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장교 장모 대위 이야기다.
사고경위는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동안의 수사상황과 정황으로 당시 사고의 가능성을 추론해 본 것이다.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이다.
그 젊디 젊은 나이에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인재가 이리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도 안쓰럽다.
그가 유명을 달리한 것 만큼 안쓰러운 건 그가 가야만 했던 해군기지 조성공사 현장이다.
8년여를 끌어온 분쟁과 갈등엔 강정마을 공동체의 아픔이 있다. 요란한 발파소리에 아예 모습을 감춘 ‘구럼비 바위’도 있다.
그래도 그 ‘자동잠금’ 이중문은 안에선 열 수 있지만 강정마을을 에워싼 이중문은 안팎 어느 곳에서도 열 방법이 없어 보인다.
어이 없이 우리의 청춘이 비명횡사하지 않는 날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그 숱한 눈물이 마를 날이 이리도 오래 걸리는가?
8년의 세월이 너무도 아프다.
탓하기 보단 이젠 서로의 입장을 존중했으면 한다. 최소한 서로 마음을 풀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
국책사업이란 명분은 ‘통 큰’ 집행보다 ‘통 큰’ 지혜와 더 잘 어울린다.
이젠 제발 평화로운 강정마을, 평화로운 제주시대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양성철=제이누리 발행·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