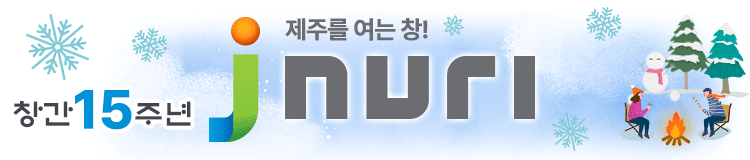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막시무스와 함께 음산하기 짝이 없는 지금의 오스트리아 어디쯤에서 게르만과의 전투를 지휘해 대승을 거둔다. 하지만 황태자 코모두스는 전투가 끝난 뒤에야 전선에 도착해 설친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코모두스에게 “황제 자리를 막시무스에게 물려준다”고 통보한다. 분노한 코모두스는 아버지를 목 졸라 죽인다.
![찾지 않는 것은 결코 보이지 않는 법이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http://www.jnuri.net/data/photos/20220519/art_16523311908661_2ef185.jpg)
아버지와 막시무스가 이뤄낸 승리의 영광을 모두 가로챈 코모두스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 꽃을 뿌리며 로마로 개선한다. 그러나 길에 늘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무표정하거나 냉랭하다. 몇몇은 난생처음 보는 불쾌하고 불길한 짐승을 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코모두스의 로마 입성 장면을 잿빛으로 처리한다. 분명 화창한 날씨인데 화면은 음산하다. 잿빛 화면 속에 흩날리는 붉은 꽃잎들이 방사능 낙진처럼 음산하기 짝이 없다.
코모두스는 원로원 앞에서 마차에서 내린다. 새 황제를 맞이하는 원로원 의원들의 표정은 시민들만큼이나 떨떠름하다. 코모두스는 족히 50여개는 돼 보이는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 원로원 의원들은 까마득한 계단 위 입구에서 새 황제 코모두스를 기다린다. 아무도 계단을 내려가 황제를 맞이하거나 에스코트하지 않는다. 황제가 맞는가 싶다.
황제 호칭은 흔히 ‘폐하陛下’라고 한다. ‘폐’는 계단이나 섬돌이다. 신하는 황제를 대할 때 섬돌이나 계단 아래에 서야 한다. ‘폐하’라는 호칭은 자신이 섬돌이나 계단 아래에 서서 우러러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하殿下, 저하邸下, 합하閤下 모두 자신이 상대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칭인데, ‘다리 아래’라는 의미의 ‘각하脚下’는 왠지 느낌이 고약하다. ‘각하’ 호칭은 폐지돼 다행이다.
그런데 원로원 의원들은 감히 계단 위에서 황제를 내려다보고 있다. 과연 SPQR(로마의 원로원과 로마의 시민ㆍSenatus Populusque Romanus)의 나라답다. 로마의 엠블럼에 황제 따위는 없다. 황제도 원로원 명령의 집행인일 뿐이다.
![새 황제 코모무스는 원로원과 처음부터 거칠게 대립한다.[사진=더스쿠프 포토]](http://www.jnuri.net/data/photos/20220519/art_16523311912948_0336dd.jpg)
사실 원로원과 황제의 긴장관계는 아우구스투스 이래 황제정 시대에도 계속돼 온 일이다. 하지만 원로원의 상대가 코모두스가 아닌 아우렐리우스 황제였어도 원로원 의원들이 저리 오만하게 황제를 대했을까 싶기는 하다. 원로원은 미덥지 못한 새 황제를 ‘엿 먹이고’ 기선을 제압하고 길들이기로 작심한 듯하다.
원로원 회의장에서 새 황제와 의원들의 첫 대면이 이뤄진다. ‘황제 지원자’ 면접장 분위기다. 원로원 의장 격인 그라쿠스 의원이 서류를 들이밀며 코모두스에게 ‘업무 지시’를 한다. “지금 그리스 지역에 흑사병이 창궐하니 그 사람들을 돌보시라”는 게 골자다. 삐딱하게 앉은 코모두스는 “그런 일은 원로원이 할 일 아닌가”라고 받는다. ‘니가 가라 하와이’다.
그라쿠스가 다시금 “백성을 품는 것이 황제의 일”이라고 가르치려 들자 코모두스가 폭발한다. “너희들은 뒷돈 받고 계집 끼고 놀 시간은 있어도 흑사병 돌보러 갈 시간은 없나 보구나… 한번만 더 무례하게 굴면 너부터 흑사병 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 옆에서 지켜보던 ‘공주’ 루실라가 일촉즉발의 장면을 간신히 수습한다.
거처로 돌아온 코모두스는 루실라를 붙잡고 원로원에서 받은 냉대와 무시, 그리고 모욕에 어쩔 줄 몰라 한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건 역시 피붙이밖에 없다. 실제로 코모두스 황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원로원에 치를 떨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로마의 엠블럼 SPQR을 PQSR(Populusque Senatus Romanus)로 바꿔버린 인물이기도 하다. 엠블럼에서 원로원을 뒷전으로 밀어버렸다. 의회를 통하지 않고 국민들과 직접 통하겠다는 ‘반의회적’인 위험한 발상이다.
코모두스는 원로원의 인정받기를 포기하고 대규모 ‘검투사 경기’를 기획해 대중의 인기에 호소하려 한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다. 코모두스 황제는 콜로세움에서 대중들 앞에서 직접 검투경기를 벌이는 ‘쇼’를 펼쳐 대중들을 열광시킨 황제이기도 하다.
![희망을 주는 건 대통령의 몫이지만, 희망을 발견하는 건 시민의 몫이다.[더스쿠프=뉴시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20519/art_16523311917696_0103eb.jpg)
우리도 곧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새 대통령의 성대한 취임식이 열릴 것이고, 새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위해 국회도 방문할 거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역대 최저로 나타난다고 한다.
낮은 기대치의 이유가 무엇이든 ‘낮은 기대’ 자체가 불안하긴 하지만, 취임식 날 식장에 참석한 시민들이나 TV로 지켜보는 시민들의 얼굴에서 미소와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국회를 방문한 새 대통령을 진영을 떠나 모두 기립해서 박수로 맞이하고 또한 배웅하기를 바란다.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새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기도 하다. 찾지 않는 것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 숲에서 꽃을 찾는 데 몰두하면 호랑이도 안 보인다고 하지 않는가.
상대의 결점을 찾는 데 집중하면 아무리 큰 장점도 보이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상대에게서 긍정과 희망을 찾으려 하는 것이 곧 상대에 대한 대접일 듯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서로가 서로를 먼저 ‘대접’해 주는 게 순서일 듯하다. [본사 제휴 The Scoop=김상회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