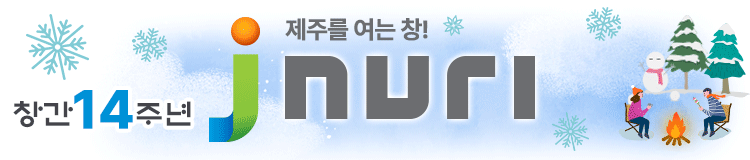![기후변화로 해양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제주 바다가 빠르게 아열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 인근 해역에서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아열대 어종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기존 주력 수산자원의 어장이 북상하면서 제주 어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오징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1/art_17418248261148_72e0fd.jpg)
기후변화로 해양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제주 바다가 빠르게 아열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 인근 해역에서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아열대 어종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기존 주력 수산자원의 어장이 북상하면서 제주 어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13일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아열대화 영향 기후변화축 해양생태계 먹이망 구조 연구’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연근해 해역의 수산자원 변동을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제주를 포함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아열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수온 상승으로 어류의 서식지와 산란장이 이동하면서 제주 해역의 생태계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 남부 해역에서는 태평양 참다랑어와 같은 아열대 어종이 포획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참다랑어는 지난 2021년 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점차 동해까지 어장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제주 인근에서 대량 어획되던 오징어 역시 이제는 동해 북부로 주 어장이 옮겨갔다.
도루묵과 멸치 등 제주 어민들의 주요 어획 대상이었던 어종들도 서서히 제주 바다에서 사라지고 있다. 멸치는 제주 남부 중심에서 서해와 동해 전역으로 확산됐고, 삼치 또한 남해 중심에서 서해와 연근해로 어장이 이동 중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역시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제주 해역을 포함한 동해와 울릉도, 독도 주변에 열대·아열대 어종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동해와 제주 해역의 수온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해양 환경 변화가 단순히 생태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에서는 이미 멍게, 전복 등 양식 어류가 고수온으로 대규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지난해 제주 양식장 60곳에서는 약 17만6000마리의 양식 어류가 폐사해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가 소득 저하도 현실화되고 있다. 수온 상승으로 어장 자체가 바뀌고 있지만 이에 맞춘 어업 변화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앞으로 5년간 제주 해역을 포함한 전국 연근해에서 바닷물 직접 채취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어종 및 먹이망 변화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어업인들이 변화된 어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어장 환경 속에서 어업인들이 효과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제주 연안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변화하는 어장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 허가나 면허 조정, 새로운 어장지도 제작·배포 등 어업인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다.
수협중앙회도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대응과 어업인 지원 방안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바뀐 어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1970~2020년 주요 어장 변화도. [해양수산부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1/art_17418240700239_6a2b5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