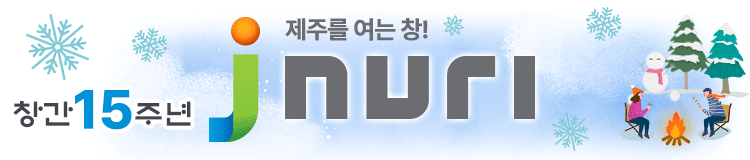현미경을 볼 수 없는 나는 누군가 대신 보고 그대로 재현해 그려놨을 염색체의 복제그림으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다.
엿보는 것이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감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림이 남(아버지)과 여(어머니)로부터 각각 23개씩의 염색체를 물려받아 46개의 염색체인 한 인간이 태어나게 된다고, 참으로 천연덕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염색체는 색으로 표시돼 있다. 수정 되어 복제되기 전까지는 실(염색사)이었던 것이 모여 굵어져 염색체로 바뀐단다. 두 번의 분열(감수1분열, 감수2분열)로 모세포가 딸세포를 복제해내는 과정의 그림은 그 복잡한 생명의 탄생을 단순하게 그림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려니... ‘그런가?’가 아니라 ‘그런가 보네’로서의 이해로 드뷔시가 했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음악은 음과 음 사이에 놓인 침묵이다.”
나는 음악을 그림으로 바꿔본다.
“그림은 종이와 붓 또는 연필 사이의 침묵 그리고 잡념이다.”
특히나 남의 그림이나 사진 또는 장면을 본 따 그대로 재현(복제일 것이다)하는 때엔 더 그렇다. 그리는 과정에서의 수없는 침묵과 잡념이 나를 그림에 몰두하게 하는 이유다.
이 침묵과 잡념을 나는 염색체의 복제그림처럼 단순하게 ‘명상’이라고 한다. 달리 더 마뜩한 단어가 딱히 생각나질 않아서다. 아마도 육체 안의 생명복제는 침묵과 잡념도 끼어들 시간 없이 척척척 진행되어야 할 과학일 테지만 육체 밖에서의 그것에서 침묵이나 잡념이 다분히 있을 수 있겠다고 추측해본다.
그것은 내가 그림에 빠지는 이유와 같은 감정이고 감성이며 바로 사랑일 것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지만(가끔 쌍둥이가 나오거나 임신날짜 266일을 꼭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하나 같이 같은 생명이 없는 걸 보면 역으로 현미경이든 인간의 육체적 기능으론 발견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침묵과 잡념, 바로 사랑이 채우는 건 아닐까. 이 또한 잡스러운 나의 막연한 추상이겠지만.
그런데 그림을 복제하다 보면 그리는 대상은 같은데 그릴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을 단지 내 그림실력부족으로 탓하기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든 생각에 침묵과 잡념의 힘으로 이해확산된다. 바로 상황이며 그림 복제 중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 나의 산만하거나 집중된 감정과 대상과의 교호로 이어지는 사랑 또는 집착이란 감성 때문일 것이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우연히 만난 장면이 마치 몇 십 년 전 제주도에서 본 것과 매우 유사하다. 카메라를 주렁주렁 매달고 똑같은 기념사진을 찍어대던 관광버스기사의 일사분란한 모습이다.
제주도에서 지리산으로 옮겨와 사는 나는 한참 후 이 사진을 보고 복제할 생각을 하다가 사진으로 떠올리게 한 제주도로 서귀포에서 잔뜩 사둔 매니큐어들을 꺼냈다. 염색체복제 과정의 그림에서 받은 잡념이 붓과 물감 대신 매니큐어를 들게 했다. 붓질그림과 매니큐어를 찍어 그린 그림의 느낌이 사뭇 다르다.

또 잡념에 섞인 침묵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복제되었다는 그 염색체분열 그림의 단조롭고 단순한 과학과는 달리 우린 서로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나의 형제나 내 아들을 보면 생김은 얼추 비슷한 구석이 있으나 삶은 꽤나 다르듯이. 또 잡념으로 글이 꼬인다.
나의 근원일 나의 염색체가 배배 꼬였었듯이. 꼬인 그대로 놔둔다.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래선가? 염색체그림보다는 쿠르베가 그렸다는 <세상의 근원>이 더 가슴에 와 닿는다. 내친김에 <세상의 근원>을 보고 따라 매니큐어를 찍는다.
근원의 사이를 살짝 감춘 거웃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찍어 그리면서 또 든 잡념은 복제라기보다는 변형이 더 적절한 단어라고 일러준다. 종이와 매니큐어로의 그림화한 명상은 또, 짧은 잡념이 되고 깊은 명상이 되어 수렁에 나를 빠트린다.

| ☞오동명은? =서울 출생.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사진에 천착, 20년 가까이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을 거쳐 국민일보·중앙일보에서 사진기자 생활을 했다. 1998년 한국기자상과 99년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사진으로 세상읽기』,『당신 기자 맞아?』, 『신문소 습격사건』, 『자전거에 텐트 싣고 규슈 한 바퀴』,『부모로 산다는 것』,『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울지 마라, 이것도 내 인생이다』와 소설 『바늘구멍 사진기』, 『설마 침팬지보다 못 찍을까』 등을 냈다. 3년여 제주의 한 시골마을에서 자연과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카메라와 펜, 또는 붓을 들었다. 한라산학교에서 ‘옛날감성 흑백사진’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에서 신문학 원론을 강의하기도 했다. 현재는 지리산 주변에 보금자리를 마련, 세상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