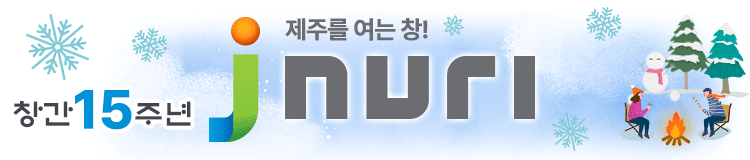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그의 창조물인 ‘괴물’은 서로 다른 ‘생명관(view of life)’을 놓고 부딪힌다. 흔히 문화나 이념, 종교의 차이만 해도 화해가 힘든 법인데 ‘관점(view)’이 다르다면 난감한 문제가 된다. 인생관, 세계관도 그렇지만 어쩌면 서로 다른 ‘생명관’은 더욱 합치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된다.
![영화 프랑켄슈타인 속 박사와 괴물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사진|더스쿠프 포토]](http://www.jnuri.net/data/photos/20260101/art_17673152972218_0f7696.jpg?iqs=0.6774896197332059)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생명관은 대단히 근대적이고 기계적이다. 생명은 조작의 대상이며, 기술적으로 창조 가능한 현상으로 파악한다.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생명관은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보편적ㆍ실용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명체는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도 여느 ‘상품’과 마찬가지다.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자신의 창조한 생명이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선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 취소와 제거가 답이다.
그러나 생명을 바라보는 괴물의 관점은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전혀 다르다. 생명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괴물은 자신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프랑켄슈타인 박사와의 관계 설정에 실패하고 사랑받지도 못한다. 결국 괴물은 “나는 사랑받지 못했기에 악해졌다”고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한다.
우리 대통령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게 “연명 치료를 중단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명의료’ 문제를 온전히 경제의 효율성과 비용의 문제로 치환해버린 듯해 당황스럽다.
자칫하면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부담만 되는 ‘가성비 떨어지는 생명’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제거를 장려하는 듯 들리는 것은 화자(話者)의 입보다 청자(聽者)의 귀가 잘못된 것이라 믿고 싶다.
◆ 실용주의 뜻밖의 어원
혹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제시라 해도 대통령이 던지는 한마디 화두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력은 너무나 크다. 대신 ‘젊은 탈모인’들의 탈모문제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에 포함해 줘야 한다고 역설한다. 조금은 어지럽다.
우리 대통령은 자칭타칭 ‘실용주의자’라고 하는데, 과연 실용주의자답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실용적(pragmatic)의 어원이 ‘프랙시스(praxis)’이지만 둘의 뜻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불행하게도 ‘프랙시스’의 우리말은 없다.
프랙시스는 사안을 판단할 때 실용성보다는 본질적 의미를 추구한다. 반면에 ‘실용주의(pragmatism)’는 의미와 원칙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생명관에 대입하자면, 생명의 차등적 가치는 실용적인 관점이며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관점이기도 하다. 프랙시스는 태어난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그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다. 괴물의 관점이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이에게 장려금을 주는 게 실용일까.[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www.jnuri.net/data/photos/20260101/art_17673152968585_b303eb.jpg?iqs=0.9033305577683327)
프랙시스는 대개 그 의미에 천착하지만 실용주의는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진다. 연명치료 중단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탈모치료를 가뜩이나 빠듯한 건보재정으로 보살펴주는 것 모두 ‘실용적(practical)’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프랙시스하지는 않다.
문득 나치에 반대하다 7년간 악명 높은 다하우(Dachau) 강제수용소에 7년간(1938~1945년) 수감됐던 독일 신부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öllerㆍ1892~1984년)의 저서 「그들이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When They Came: I did not speak out)」가 떠오른다.
“처음에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을 잡으러 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그다음엔 노동조합원들을 잡으러 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그다음엔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이번에도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그다음엔 나를 잡으러 왔다. 그때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연명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연명치료자 생명의 부정否定에 침묵한다면 그다음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들이대며 장애인ㆍ노인 등등의 생명도 부정하고,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1%에 속하지 못하거나 세계 경쟁력이 없는 나의 생명까지도 가치 없는 것으로 부정당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 연명치료에 효율성 적용하는 순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약 40%에 육박한다고 하고, 이 비율은 우리가 즐겨 비교대상으로 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수준이고, 노인들의 자살률 역시 인구 10만명당 40.6명(65세 이상ㆍ2023년 기준)으로 OECD 압도적인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국가 생산성 향상에 하등 도움도 되지 못하고 빈곤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노인들에게도 마음 같아선 ‘자살 장려금’을 제공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매우 ‘실용적인 생명관’이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의 지옥의 묵시록과 같은 ‘어른들을 위한 우화’ 하나. 제목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How Much Land Does a Man Need)」이다. 어느날 땅에 대한 소유욕이 희박한 유목민 바시키르(Bahkirs) 부족 사람들이 자기들 사회에 합류한 아마도 욕심 많은 러시아 농사꾼인 듯한 파훔(Pahom)에게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다가 해가 지지 전까지 돌아오면 네가 표시해놓고 돌아온 곳까지의 땅을 모두 주겠다”고 제안한다.
![지난 12월 24일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더스쿠프|뉴시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60101/art_17673152964977_c82a34.jpg?iqs=0.1020817806147063)
파훔은 말을 달려 죽기 살기로 최대한 멀리까지 최대한 넓게 달려 선을 긋는다. 욕심껏 달리다보니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고 해는 지기 시작한다. 죽을힘을 다해 돌아왔지만 탈진해서 말도 파훔도 숨을 거두고 만다. 파훔은 당연히 한 뼘의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2m 남짓의 땅을 파고 드러눕는다.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파훔처럼 죽기 살기로 달린 것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 살게 됐으면 우리가 그동안 먹고사느라 정신없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람들도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린 것 아닐까. 우리가 ‘G7’이 되고, 혹시 ‘G2’가 되고 세계패권을 장악하면 비로소 실용보다는 프랙시스에 눈을 돌릴 수 있을까. 아마도 그 전에 우리 모두 파훔처럼 죽을지도 모르겠다.
지도가가 출산장려금처럼 연명의료 중단에 장려금 지급 정책을 만지작거리는 이런 생명관을 가진 사회에서 혹시 G7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은 아무래도 난망(難望)할 듯하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본사 제휴 The Scoop=김상회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