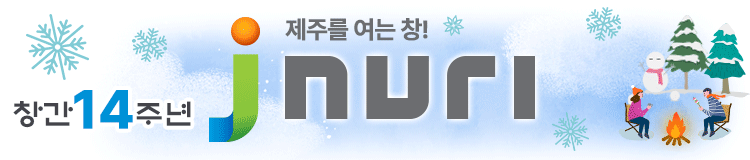16 “보지도 못한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다.”
셀마는 나에게 종이 한 장을 내보였다.
大韓民國이 아니라 大恨民國이다.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리워 울지요.
한라산 시로미는
봄을 맞아 열리건만
우리네 풋사랑은
어느 봄에나 열리나.
뒷면엔 영문자의 메모가 보였다.
The Great Regrettable Nation? South Korea=Sorrowful Korean
헬레나의 글씨다.
“네 아버지는 부모와 동생을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셨다.”
헬레나가 아버지의 사진이 없다며 대신 건네준 아버지의 흔적을 받아든 셀마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엄마로부터 듣는다.
“그렇게 사랑했던 조국, 한국이 아버지를 버렸고 그 아버지를 미국이 죽였다. 아버지의 부모, 형제까지도.”
이 말을 듣고 있는 내 눈에 평화의 섬, 제주도라 쓴 현수막이 들어왔다. 광고용 현수막 문구는 이루지 못한 희망이며 절망의 절규다.
제주도에 평화가?
한국에 평화가?
자문하고 있던 나는 내게 평화란 무엇인가 물었고, 평화라는 단어가 엄마를 떠올리게 했다.
‘제주도에 얼마나 더 있을 것이냐?’
셀마에게 묻기 전에 오빠에게 전화를 넣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 왔어. 여기 제주도야.”
국제의학세미나에 참석한 것쯤 여겼는지 오빠는 오랜만의 통화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담담하다.
“곧 미국으로 돌아가겠구나.”
오빠는 내가 군하리에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나보구나. 그래야지.”
나는 보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해대고 있었다. 오빠도 엄마도 아빠도. 셀마가 나를 보며 빙긋 웃어 보인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오빠가 엄마를 부르듯 속삭인다.
“응, 엄마.”
내게 눈을 떼지 않고 웃고 있는 셀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오빠, 조금 후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셀마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웃던 그녀가 내 가슴에 묻혀 흐느꼈다.
“아빠 대신 널 안고 있다.”
안아야 할 사람은 없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운다. 나도 역시 그녀와 같았다. 나도 눈물이 났다. 마음으로 중얼거린다.
“난 엄마 대신 널 안는다.”

셀마가 빛이 바래 누렇게 변한 흑백사진을 내보인다. 한국에 오기 전에 아버지의 친척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사진이다. 바랜 얼굴의 어린 아이가 흐릿하게 그 안에 있다.
“이 꼬마가 나를 낳았다.”
예닐곱 살 돼 보이는 사진 속의 어린 아이를 가리키고 이 꼬마가 아버지라며 그녀는 또 울기 시작한다. 그리움은 대를 이어가며 아픔으로 남는다. 마음도 연좌한다. 옥죄어오는 슬픔은 부르고 싶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음이며, 안고 싶어도 안겨올 사람이 없음이다.
“아버지는 이 사진으로밖에 더 떠올릴 게 없다. 딸에게 아버지를 돌려줄 수 없는 엄마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제주도에 오지 못한 것 같다. 한국에도 오지 못한 것 같다. 여행하듯 갈 곳이 아니라던 아빠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가지 못한 이유와 같을 것이다. 지금 나도 그렇다. 곧 미국으로 돌아가려한다. 여기 더 있으면 아빠도 엄마도 미워질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이기적이다. 어떤 아픔도 책임에 우선할 순 없다. 얼굴 한 번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한 딸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셀마의 손을 잡으며,
“네 아버지는 네 곁으로 가려했다. 미국으로 가려했다. 그것을 누군가 가로막았다. 은폐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죽음 하나쯤 벌레 죽이 듯 하는 존재들에 의해. 다시 살고자 했던 네 아버지의 꿈은 좌절이 아니라 묵살되었던 것이다. 미국인인 네 어머니에게도 한국은 大恨民國이다. 국민을 한스럽게 하는 나라 말이다. 너, 셀마 또한 한국은 大恨民國이다. 하지만 아버지와 엄마를 네가 보듬어야 하는 것은 한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다. 이것이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의 몫이 아니겠느냐.”
셀마가 한라산으로 올라가고 있을 이른 아침, 나는 제주공항에서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려놓는 것도 사랑일 것이다. 이제는 여행하듯 한라산에 오르고 싶다.”
그녀는 헤어지면서 내게 물었다.
“엄마가 한국에 살아계시느냐?”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륙한 비행기 창밖으로 한라산이 보인다. 새이듯 몇 초 만에 등반한 한라산이 눈 아래에서 황급히 회전하며 사라진다. 시간만큼 잔인한 건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움을 슬프고 아프게 진화시키는 시간을 그리움으로 다시 되돌려놓으며 나는 오빠에게로 다가갔다.
교회로 들어서니 전에 교회 문턱에서 잠깐 본 오십대 후반의 남자가 나를 맞는다. 목사란다. 문 변호사의 방이라며 오빠가 없는 방으로 안내한다. 커피를 내오겠다는 목사가 사라지기도 전에 방을 둘러보았다. 매우 좁았다. 한 사람 누울만한 공간에 발을 딛고 있으려니 가슴이 답답했다. 벽 한 면은 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또 다른 한 면은 종이 박스들이 가지런히 쌓여있다. 박스마다 작은 쪽지에 써 붙여놓은 글들의 글씨체가 낯에 익었다. ‘속옷, 양말, 춘추복, 여름옷, 겨울옷, 양복...’ 글씨체가 변하지 않았다. 오빠는 얼마나 변해있을까. 책장에서 굵은 스크랩북을 꺼냈다. 내리 세로 면에 우표라고 써 있어서다. 아빠가 사준 옛 우표첩이 아니다.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 등 탈것 우표가 아니다. 인물우표들과 동물우표들이다. 대부분 어린이의 그림이나 사진이 담긴 우표다. 커피를 들고 온 목사가,
“좁지요?”
내 마음을 읽은 듯 말을 걸어온다.
“오빠가 왜 교회에서 머물지요?”
목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교만하지 않고 악하지 않아서지요.”
성경구절이라며 한 마디를 보태는데 내겐 뜬금없이 들린다.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고 듣지도 않으신다.’
‘왜 오빠가 교회에서 사느냐니까요?’
대신 엉뚱한 질문을 하고 말았다.
“오빠가 교회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건가요?”
목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웃으며,
“우리 교회는 아주 작습니다. 버스를 갖고 있을만한 교회가 못 됩니다. 문 변호사, 그땐 검사였지요. 문 검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 기울여주시고 들어주신 거지요.” 글.그림=오동명/ 15편으로 계속>>>
☞오동명은? =서울 출생.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사진에 천착, 20년 가까이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을 거쳐 국민일보·중앙일보에서 사진기자 생활을 했다. 1998년 한국기자상과 99년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사진으로 세상읽기』,『당신 기자 맞아?』, 『신문소 습격사건』, 『자전거에 텐트 싣고 규슈 한 바퀴』,『부모로 산다는 것』,『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울지 마라, 이것도 내 인생이다』와 소설 『바늘구멍 사진기』, 『설마 침팬지보다 못 찍을까』 등을 냈다. 3년여 전 제주에 정착, 현재 제주의 한 시골마을에서 자연과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카메라와 펜, 또는 붓을 들고 있다. 더불어 한라산학교에서 ‘옛날감성 흑백사진’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에서 신문학 원론을 강의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