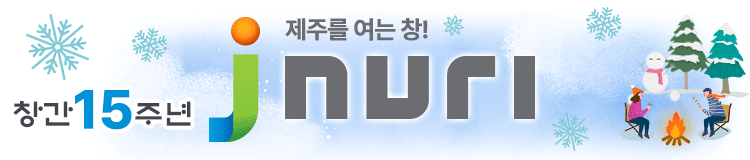음식은 시대적으로 계속 변화한다. 사람들의 생활환경의 변화, 지구 환경의 변화, 과학의 발달 등 외적인 요인에 따라 시대적으로 선호하는 맛의 기호가 달라지고 심미적 감각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토음식도 시대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향토음식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향토음식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향토음식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최소한 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년이 두어번은 지나야 비로소 향토음식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마산 아구찜이나 부산의 돼지국밥이나 밀면, 강릉 아바이순대, 춘천 닭갈비, 통영의 충무 김밥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모두 해방 이후의 격변의 시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지역의 향토음식들이다. 그래서 음식의 기원을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시작된 외식상품인지 증명이 되면 세월이 지나 지역의 향토음식으로 자리잡게 되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향토음식의 변화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제주의 고기국수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식재료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과거의 전통 향토식재료의 조달 방법이나 식재료 자체의 고갈과 개량종의 범람으로 인해 옛 맛을 살려내기 힘든 시장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룰이 있다. 사전적 정의에 표현 되었듯이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와 ‘그 지방 특유의 조리방법’이라는 룰이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향토음식이라 고집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최소한 이중 한가지 만이라도 지켜져야 향토음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한 향토음식점 업주들의 노력과 양심에 달린 문제다.
예를 들어 지금 제주에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갈치조림을 살펴본다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조리법은 전라도 서남해안 형식이고, 갈치는 수입산을 사용한다. 조림 양념의 고춧가루도 경북이나 전북에서 들여온 것이고 공장에서 생산된 설탕과 소금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원료의 원산지가 중국산인 간장과 곁들여주는 된장국의 된장도 마찬가지이다.
곁들이는 반찬은 어떠한가? 수입콩으로 만든 콩나물에 전라도에서 들여온 나물류에 육지부에서 들여온 풋고추와 오이를 썰어 이름만 재래식인 공장 된장을 찍어먹으라고 내 준다. 밥은 당연히 호남 또는 경기미로 지은 쌀밥이고 김치 또한 다르지 않다.
이것이 제주 향토음식의 정체라면 심하지 않은가? 향토음식점이라는 타이틀을 내 걸고 차려주는 식탁에 제주의 음식이 없고 심지어 그 음식의 역사를 물어보면 옛날부터 그렇게 먹었노라고 전문가인냥 설명까지 곁들인다. 손님이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제주도내 갈치조림 맛은 MSG가 완성시켜 주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맛을 거론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서두에 거론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렴한 재료를 찾기에 혈안이 되었을 뿐이다. 이 와중에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식당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창피함을 모르는 식당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성업중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면에는 소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놀러는 다니고 싶은데 돈은 없고 남들 누리는 호사는 따라서 누리고 싶으니 주머니 사정에 맞춰 비슷한 짝퉁으로 만족을 느끼며 나도 제주의 유명한 음식 먹어봤다고 SNS에 기록을 남기는데 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장사꾼은 그것을 고객의 트랜드라며 맞춰주기에 혈안이다.
여기에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맛을 쉽게 완성시켜주는, 식품첨가물의 결과물인 반 가공 또는 완전 가공된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겉으로는 완성도 높은 음식을 판매하기 용이한 시대가 되었고 이른바 HMR, 밀키트 등의 외래어를 붙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기도 하다. 돈 앞에서는 창피함도 자존심도 다 팽개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세상이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의 흐름이라고 애써 자부하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마치 도태되어 버릴 것처럼 여기는 창업자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식자재 전용 매장으로 달려가 카트를 가득 채우고 돌아와 식당 문을 연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재료를 기계를 조립하듯 섞어서 자신이 요리했다고 손님들한테 내 놓는다. 냉동식품을 해동시켜서 깡통이나 튜브에 든 소스를 부어 버무리거나 볶는 것을 요리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나 비판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만다. 총체적 난국이다. 적어도 외식산업은 그렇다. 음식이 사라지고 상품만 떠도는 판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향토음식도 결국 일반적인 외식상품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길에 접어든 것이다. 굳이 그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총체적이라고 표현 했듯이 모두가 그렇게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도 어렵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고도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