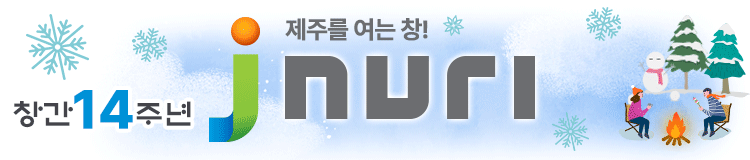박찬욱 감독은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서 2개의 해고 장면을 보여주고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 둘 모두 사회적 약자가 쫓겨나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영화 속 국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이게 비현실적인 영화 이야기냐는 거다.
![영화 속에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돕지 못한다.[사진=더스쿠프 포토]](http://www.jnuri.net/data/photos/20240626/art_17195364012268_3ae09a.jpg)
# 해고➊= 동진(송강호 역)의 회사에서 자신의 젊음을 몽땅 용접기에 녹여냈던 팽기사(기주봉 역)는 해고통지를 받는다. 사장인 동진의 집에 찾아와 동진의 출근차량을 막고 절박함을 호소하지만 어림없다. 팽기사는 셔츠를 올리고 커터칼로 배를 긋는 최후의 호소까지 한다.
그런데도 동진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다줄지언정 해고를 취소하진 않는다. 결국 팽기사는 가족들과 쥐약 뿌린 피자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생을 마감한다. 나락으로 떨어진 팽기사 가족의 목숨을 건져줄 국가의 ‘안전망(safety net)’은 없다.
# 해고➋= 류(신하균 역)의 누나는 신부전증으로 사경을 헤맨다. 유일한 희망은 신장 이식이다. 신장 기증자를 기다리지만 기약이 없다. 누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류는 장기 밀매업자를 찾아가지만 그들은 류의 전 재산 1000만원을 강탈하고 류의 신장까지 적출해간다.
그러나 류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국가’에 호소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병원 화장실마다 벽에 전화번호 박아놓은 불법장기매매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어도 모른 척하는 국가가 이런 일까지 발 벗고 나서주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류도 이미 눈치채고 있는 모양이다.
재앙은 항상 단발로 끝나지 않고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사기꾼에게 모든 것을 잃은 류는 공장에서 해고를 당한다. 아마 그 비위생적인 곳에서 의사 아닌 백정에게 신장을 적출당하고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한순간에 팽기사와 같은 한계상황에 내몰린다. 아마도 비정규직 노동자였는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최소한도의 안전망은 류에게 없다.
사회적 약자가 한계상황에 내몰리면 2가지 선택지 외에는 없다. 팽기사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목숨을 포기할 수 없으면 ‘각자도생(各自圖生)’에 나서야 한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팽기사나 류 모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햄릿의 심각한 고뇌 끝에 다른 길을 간다. 팽기사는 죽음을 택하고 류는 삶을 택한다. 삶을 택한 류에게는 범죄밖에는 탈출구가 없다.
누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부잣집 아이 유괴를 결심하고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류에게 영미(배두나 역)가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유괴범들이 피해 아동들을 살해하는 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다. 신고만 안 하면 모두에게 ‘해피엔딩’이다.”
![국가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불필요악’일 뿐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www.jnuri.net/data/photos/20240626/art_17195364015834_62f6a1.jpg)
개인끼리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 해피엔딩인데, 아이가 죽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신고하는 ‘무식한’ 부모들의 잘못이라는 논리다.
영미가 보기에 ‘정부’란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손대는 일마다 망쳐먹는 ‘똥손’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고당해서 일가족이 쥐약 먹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팽기사나 류와 같이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외면한 채 ‘부잣집’ 아이들 유괴사건에 달려드는데 그나마 ‘똥손질’로 아이를 죽인다. 새만금 잼버리나 부산엑스포 유치에서 정부가 선보인 똥손질을 기억하는 우리도 영미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점이 생긴다.
‘우리는 무정부 사회에 살고 있다. 이 꽉 물어라’는 영미의 설법을 들은 류도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기로 한다. ‘무정부주의적’으로 장기밀매업자들의 아지트에 침투해 ‘혁명적’으로 모두 죽여 버린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영미와 류만 무정부주의적인 건 아니다.
외동딸을 납치당한 중소기업 사장 동진도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경찰을 매수해 해결에 나선다. 납치범인 영미와 류의 소재를 파악한 동진은 그 응징도 믿음 안 가는 똥손 경찰과 검찰에 맡기는 대신 자신이 직접 범인 체포와 참수 작전에 나선다. 그러나 정부를 믿지 못하고 각자도생에 나선 이들 모두의 결말은 참혹하다. 동진의 딸도 죽고, 동진, 영미, 류 모두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나간다.
‘국가’라는 것이 태동한 이래, 그것이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공산주의이든 자본주의이든 어떤 형태의 국가와 정부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당연히 ‘무정부주의(Anarchism)’의 대두는 국가의 태동과 동시에 시작된 오랜 사상적 흐름이다.
스페인 무정부주의자들의 구호인 ‘mismo perro, distincto collar(똑같은 개, 다른 목줄)’는 전세계 무정부주의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는다. 목을 무지막지한 밧줄로 묶었든 예쁘장한 가죽끈으로 묶었든 똑같은 목줄일 뿐이고, 개 신세는 개 신세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국가에 ‘목줄’을 맡기고 있는 것은 그래도 국가가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필요악’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국가가 팽기사나 류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국가는 필요악이 아니라 ‘불필요악’일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가 팽배하면서부터인가. 여기저기서 ‘이게 나라냐?!’는 탄식 섞인 외침이 끊이지 않는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팽기사처럼 생활고에 목숨을 끊거나 류나 영미, 동진처럼 각자도생의 결의를 다진다.
![정부가 해외직구 규제책을 발표하자, 소비자들이 즉각 반발했다.[더스쿠프=뉴시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40626/art_17195364019278_a159cb.jpg)
각자도생이라는 이 참담한 말은 조선왕조실록 선조 27년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임진왜란(선조 25년~32년) 초기 김해·부산 등지를 모두 왜군들에게 내어주고 그 지역 백성들에게 조정이 내린 교지엔 이런 말이 쓰여있다.
“평양의 싸움에서 패한 뒤에 왜적은 분한 김에 도성의 백성을 다 죽이고서 물러갔는데 이제 또한 이런 일이 필시 있을 것이니, 동래, 부산, 김해, 울진의 백성들도 장차 살육의 환난에 걸릴 것이다. 그러니 미리 알려 주어 각자 살길을 도모(각자도생)할 것을 몰래 전파하라.”
정부가 국민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각자도생의 죄를 묻는다. 물가고에 해외직구하면서 각자도생하니 그것도 금지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넘어 정부에 ‘이럴 거면 차라리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는 그야말로 무정부주의적 하소연까지 등장하는 모양이다. [본사 제휴 The Scoop=김상회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