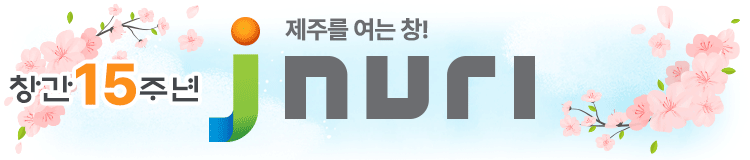![제주 감귤 [제주관광공사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1148/art_17640328190966_02227e.jpg?iqs=0.6616798363062836)
나는 감귤을 까먹는 모습만 봐도 단박에 그 사람이 제주 살이 몇 년 차인지 얼른 알 수가 있다. 대부분 귤을 까먹을 때, 밑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손톱으로 껍질을 벗기듯 까먹지만, 제주 사람들은 움푹 들어간 부분에 손을 대고는 단번에 귤을 둘로 쪼개 먹었다. 맛있는 귤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다. 일단 만져봤을 때, 두께가 두껍지 않고 얇으면서 과육에 적당히 달라붙은 느낌의 귤이 맛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감귤이 아주 흔한 과일이지만 한때 ‘대학나무’라 불리던 감귤은 과거보다 위상이 많이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를 먹여 살리는 고마운 생명 과일이다.
1968년 감귤 가격이 10kg당 2398원이다. 당시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던 조생 감귤 성목(成木) 한 그루당 보통 60~70kg 감귤이 생산됐다. 그 덕에 다 큰 감귤나무 한 그루당 대략 1만4388원에서 1만6786원 정도 소득이 났다.
당시 서울대학교 등록금이 1만4050~3만350원이었다고 하니, 집세며 하숙비, 책값, 생활비 다 해도 넉넉잡고 3~4그루면 서울에 있는 국립 대학 다닐 경제적 형편은 됐다고 보아 진다. 단순 계산으로는 집 울타리 텃밭에 감귤나무 몇 그루만 심어 키우면 충분히 자녀들 대학공부 시킬 수 있었다. 물론 자녀가 서울 대학갈 실력과 공부할 의지가 있다면 말이다.
50년 전 우리 부모님은 4000㎡ 정도의 보리밭을 감귤 과수원으로 조성해 지금까지 감귤 농사를 짓고 있다. 그 덕에 자식 넷 모두 대학, 대학원 공부시켰다. 어머니는 자주 “초등학교 교사였던 네 아버지 월급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 하지만 매년 고맙게도 우리 감귤 과수원에서 너희들 학비며 생활비가 나와 어렵게라도 그게 가능했단다”라고 말씀하신다.
현재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는 내 딸의 일 년 학비와 생활비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을 마련하려면 2024년 말 시세로 노지 감귤 2만kg 정도가 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대략 215~250그루의 다 큰 노지 감귤 나무가 해거리 없이 맛있는 감귤이 주렁주렁 달려줘야 했다. 텃밭에서는 어림없고 3547~4125㎡ 규모의 감귤 과수원을 경작하는 전업농만이 가능하다. 요즘은 ‘대학나무’라기보다는 ‘대학과수원’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
물론 50여 년 전 비해 50~60배 정도 체감소득이나 소비가치가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감귤은 제주 농가의 고마운 생명줄이다. 2021년엔 1조271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1조418억원, 1조3248억원으로 3년 연속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상황이다. 감귤은 물론 대한민국 과수 산업 역사상 처음이다.
우리나라 고문헌에 나오는 감귤은 20여 종이다. 현재 제주도에 남아 있는 재래감귤로 확인된 12종은 당유자(唐柚子), 지각(枳殼), 사두감(獅頭柑), 편귤(扁橘), 감자(柑子), 병귤(甁橘), 동정귤(洞庭橘), 진귤(陳橘), 청귤(靑橘), 빈귤(檳橘), 홍귤(紅橘), 유자(柚子) 등이다.
내가 아주 어릴 적, 증조 외할머니네 뒤뜰에는 ‘댕유지(당유자)’와 ‘산물(산 귤)’ 나무 몇 그루가 있었다. 설날에 세배 가면 증조 외할머닌 항아리에서 소중히 보관해둔 댕유지와 산물 몇 개를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다.
하지만 어린 나는 그걸 먹기가 어려웠다. 당유자는 껍질 벗기기가 엄청 어렵기도 하고 게다가 맛이 너무 시어, 증조 외할머니가 그리 고맙지 않았다. 지금에야 단 두 번의 터치로 완벽하게 모든 감귤 껍질을 벗길 수 있지만, 그땐 왜 그리 눈물이 났던지? 하지만 산 귤은 열매 크기가 작고 껍질도 얕은 편이라 그럭저럭 먹을 만했는데, 그 역시 씨가 너무 많아 번거로웠나 보다.
『고려사(高麗史)』에 476년(백제 문주왕 2년) 4월 탐라에서 방물(方物)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925년(고려 태조 8년) 11월 '탐라에서 방물을 바쳤다, 토물(土物)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 세가(高麗史 世家)』 권7에 '1052년(문종 6년) 3월 탐라에서 세공하는 귤자 수량을 일백 포로 개정 결정한다'라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이전부터 제주산 감귤이 세공(歲貢)으로 고려 조정에 진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공’이란 해마다 정례적으로 공납하던 상공(常貢)이다.
1392년(조선 태조 원년)부터 제주도 귤유(橘柚) 공물에 대한 기록이 있다. 1426년(세종 8년) 호조의 게시로 전라도와 경상도 남해안에 유자와 감자를 각 관서에 심게 하였다. 1456년(세조 원년)에 제주도 안무사에 내린 유지 『세조실록(世祖實錄)』 권 2, '감귤(柑橘)은 종묘에 제사 지내고 빈객을 접대함으로써 그 쓰임이 매우 중요하다'로 시작된 유지에는 감귤 종류 간 우열, 제주 과원 관리 실태와 공납 충족을 위한 민폐, 사설 과수원에 대한 권장방안, 번식 생리와 재식 확대, 진상 방법 개선방안 등이 기록되었다.

감귤은 진상으로 바쳐지는 공식적인 용도 외에 제주 목사와 관리들이 사사로이 감귤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로 인한 폐단이 많았다. 중앙 재력가에게 바치는 뇌물로 쓰이거나 사적 용도를 위해 징수되기도 했다.
관에서는 더 많은 감귤을 징수하기 위해 8월경 직접 감귤나무의 열매 개수를 기록하여 열매가 떨어지거나 나무에 손상이 있을 시 감귤나무 주인에게 책임을 물곤 했다. 제주도민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몰래 그 나무들을 말려 죽이기도 했다.
감귤이 풍작이어도 멀리 떨어진 섬 제주에서 진상하기 위한 운송 역시 어려움이 많았다. 풍랑의 때를 기다려야 했으며, 때를 만나지 못하면 감귤이 썩어서 문책을 받기도 하였다. 표류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이때만 해도 ‘황금 과일’이 아닌 ‘애물단지’였다. 이처럼 공납량이 매년 증가하고 지방관리 횡포까지 가중되어 민폐가 많아 차츰 재배 주수(株數)가 감소했다. 1893년 진상 제도가 사라진 후 과수원이 급속히 사라졌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진관훈은? =서귀포 출생, 동국대 경제학 박사(1999), 공주대 사회복지학 박사(201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 특보를 역임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식산업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근대제주의 경제변동』(2004), 『오달진 근대제주』(2019), 『오달진 제주, 민요로 흐르다』(2021), 『제주의 화전생활사』(202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