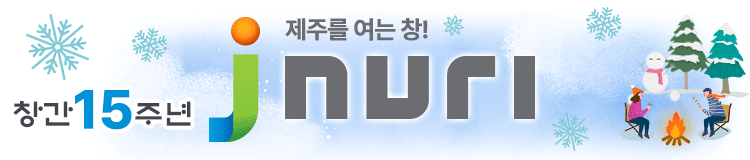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제주 '올레'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자료]](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2/art_17424454866562_8fcdc0.jpg)
정낭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올레’다. 올레는 몇 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진입로다. 제주도 올레는 먼 올레를 가운데 두고 마을 큰길, 즉 ‘가름 질(마을 길)’과 이어진다. 먼 올레에 맞닿은 집이 모여 ‘올레 집’이라 한다. 올레 집은 지역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제주도 공동체는 집-골-가름-마을로 전개된다. ‘골’은 뿌리에 달린 감자처럼 골목길로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감자 뿌리 큰 줄기에 해당하는 ‘가름 질’, 가름에서 골로 이어지는 길인 ‘먼 올레’, 골에서 각각 집 마당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올레’라 했다.
제주 기후는 취사와 난방 문화에도 영향을 줬다. 거센 비바람 때문에 부엌은 집 밖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 집을 크게 짓지 않았다. ‘굴묵’과 ‘솟덕’은 이런 지리적 특성화 문화를 잘 볼 수 있는 시설이다. 보통 육지에서는 부엌 아궁이가 취사와 난방 겸용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취사와 난방시설이 분리된다. 각각 ‘솟덕’과 ‘굴묵’이라고 불렀다. 성읍민속마을보존회 강희팔 이사장은 “집을 크게 짓지 못하게 되자 부엌 구조도 육지와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무더운 기후도 전통가옥 형태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정지(부엌)'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자료]](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2/art_17424452071241_9183f7.jpg)
육지에서는 부엌과 안방이 붙어 있지만, 제주도 정지(부엌)와 큰 구들은 상방(上房·주인이 거처하는 방) 좌우에 따로따로 설치한다. 정지의 솥단지도 돌 3개 위에 올려놓는다. 땔감을 태우고 난 뒤 남은 재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 고안됐다.
제주도 전통가옥에는 굴뚝이 없다. 이 역시 강한 비바람 때문이라고 한다. 비바람이 굴뚝 안으로 향하면 연기가 역류해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는 탓이다. 제주도에서 난방을 위해 불 때는 일을 ‘굴묵 짓는다’라고 한다. 표준어 ‘군불 때기’ ‘군불 지피기’에 해당한다. ‘군불’이란 밥하기 위한 불이 아닌 방을 데우기만 하는 군더더기 불이란 의미다.
‘굴묵’을 지피며 잡일 도맡아 하는 사람을 ‘굴묵 지기’라고 한다. 제주도에는 굴묵 지기에 관한 설화가 많다. 제주시 용담동에서 전해지는 민담인 '굴묵지기'는 가난한 집 아들이 부잣집 셋째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는데, 어찌나 가난한지 아들이 성장하여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나 시집을 오겠다고 나서는 여자가 없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명주옷 한 벌만 해주면 색시를 구해 오겠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어디 가서 색시를 구하느냐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나, 몇날 며칠을 졸라대므로 할 수 없이 명주로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두루마기를 만들어 주었다. 아들은 그 옷을 보따리에 싸서는 집을 나섰다. 아들은 길을 가다 어떤 마을의 부잣집 앞에 이르렀다. 그 집에 들어가 "굴묵지기라도 좋으니 써주시면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하고 간청하였다. 집주인이 보니 매우 똑똑하고 영리하게 생겼으므로 시킬 일은 없지만 굴묵지기나 하라며 받아들였다. 그 집은 부자인데 딸만 셋이 있는 집이었다. 아들은 그날부터 굴묵에 불을 잘 때 집안 식구들의 호감을 샀다.'
!['굴묵' [사진=디지털제주문화대전]](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2/art_17424469944497_4872c5.jpg)
굴묵 입구는 가로 30㎝, 세로 20㎝ 정도였다. 굴묵 연료는 말린 쇠똥이나 말똥과 보릿대·까끄라기 등이었다. 늦은 봄보리를 수확할 때 이삭에서 낱알이 떨어진 까끄라기를 모아 쌓아둔다. 이를 겨울철에 굴묵 땔 때 사용했다. T자 모양 ‘굴묵 근대’로 ‘ᄀᆞ시락’을 굴묵 안으로 밀어 넣고 ‘굴묵 어귀’ 쪽에 불붙였다. 그런 다음 넓적한 돌멩이, ‘굴묵 돌’로 굴묵 어귀를 막는다.
젖은 쇠똥으로 굴묵 어귀와 굴묵 돌 틈새를 막기도 했다. 이를 ‘굴묵 막는다’고 한다. 이렇게 막아야 굴묵 불기운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지속할 수 있다. “굴묵 때려고 하면 말똥을 주로 주웠지. 남보단 일찍 주우려고 막 애썼어. 온 가족이 따뜻하고, 방이 너무 뜨거워 장판이 다 탈 정도로 뜨겁게 했었지" 강희팔 이사장의 어릴 적 기억이다. 강 이사장은 “쇠똥이나 말똥 성분의 건조 상태에 따라 화력이 달랐다”며 “가축 먹이가 되는 식물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듯하다”고 했다.
굴묵 땔 때 아래로 퍼지는 연기와 그을음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온갖 벌레와 곤충을 막아주는 부차적 효과가 있다. 특히 뱀이나 지네 등 곤충을 퇴치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신석하 제주국제대 교수는 말한다. 하지만 난 이 연기를 아주 싫어한다. 너무 맵고, 눈물 나서 더 그렇다.
초등학교 시절 방학만 되면 어머닌 나를 서귀포 할머니 댁에 보내곤 했다. 그곳은 내가 살던 면 소재지 마을 중문보다 더 시골인 ‘예래’라는 마을이다. 지금에야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단지의 핵심지역이지만, 예전에는 비포장도로에 시외버스는 하루 네 번 정도 다녔고, 텔레비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놀 거리가 없었던 터라 정말 가기 싫었다. 그나마 여름방학은 지낼 만했다.
하지만 방에만 있어야 하는 겨울방학 기간은 너무 힘들었다. 굴묵 연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께서는 저녁마다 굴묵을 지피셨다. 이때 몰려오는 방 안 가득한 연기가 어린 나의 눈과 코·목구멍을 가만두질 않았다. 군대 화생방 훈련 때 조교가 방독면 벗고 ‘어머니 은혜’를 부르라고 했을 때 느꼈던 참혹한 기분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눈물이 나는 건 비슷했다.
굴묵을 막기 위해 굴묵 어귀에 발랐던 촉촉한 쇠똥은 이틀 동안 쓰고 나면 바싹 마른다. 그 쇠똥을 다시 굴묵 연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5일에 한 번 굴묵 근대로 굴묵에 있는 재를 긁어내어 솟덕(솥단지)에서 나오는 재거름과 같이 일정한 곳에 저장했다가 메밀 파종할 때 밑거름으로 쓴다. 굴묵 짓는 일은 동짓달에서부터 음력 2월까지 3~4개월 동안 해야 했다.
보리농사에는 통시(변소)에서 나오는 돼지거름을 사용했다. 반면 조나 메밀·유채에는 재거름을 썼다. 재거름은 ‘뜬 밭’ 같은 산성 토양에 알맞다. 산에 가서 고사리를 태워 ‘불치(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유채나 메밀은 오줌 서너 바가지 뿌린 재에 씨앗을 버무려 수제비 뜨듯 손으로 떠서 파종했다.

화산회토(화산분출물로 이뤄진 토양)가 많은 제주도에서 메밀은 소중한 작물이다. 제주 신화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 메밀은 척박한 토양에서도 단기간에 잘 자라며 구황작물로도 적합하다. 메밀로 만든 대표 음식은 빙 떡과 꿩메밀칼국수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할머니는 가끔 보리와 메밀을 섞어 만든 죽을 내게 만들어 주셨다. 요즘으로 치면 건강식이라 할 수 있다.
정낭과 굴묵 문화는 해방 이후 근대화 물결 속에 차츰 사라졌다. 다만 요즘도 제주도 밭에 개량한 정낭이 놓여 있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굴묵을 갖춘 가옥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중요민속자료 제188호)에 보존하고 있다. 이곳에 제주도 옛 민가 600여 동이 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진관훈은? =서귀포 출생, 동국대 경제학 박사(1999), 공주대 사회복지학 박사(201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특보를 역임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천사나래 주간활동센터 시설장을 맡아 일하며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제주한라대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는 『근대제주의 경제변동』(2004), 『오달진 근대제주』(2019), 『오달진 제주, 민요로 흐르다』(2021), 『제주의 화전생활사』(202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