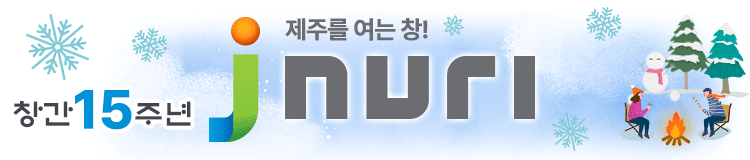언어의 보물창고
'제주도의 생명력을 키워 온 다양한 문화유산 가운데서 가장 제주 원형을 읽을 수 있는 자산이 바로 제주 언어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제주도를 언어의 보물창고라고 했다.'
이는 평생 제주어를 연구해 온 제주어 연구 2세대 강영봉 제주대 명예교수의 지론이다.
제주의 삼보(三寶)는 바다, 식물, 언어가 보물이라는 뜻이다. 제주 언어는 제주 사투리·제주도 방언·제주어·제주말이라고도 한다. 2010년대 이후 학계에서는 제주말을 ‘제주도 사투리' 혹은 ‘제주도 방언'이 아니라 ‘제주어'로 접근하고 있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독립된 언어로, ‘제주어'를 인식하는 관점이 보편화 되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제주도 방언’이 아닌 ‘제주어’로 분류하고 있다.
‘제주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제주의 문화 정체성이 담겨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제주어 교육 활성화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495호).
조선 중기 문신 김상헌이 1601년 8월부터 제주도에 6개월 체류하며 쓴 여행 일기인 『남사록(南槎錄)』에 보면,
'귀양살이를 한 신장령(申長齡) 역관이었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이 섬의 말이 중국말과 아주 흡사하여 소나 말을 몰 때의 소리는 더욱 분간하지 못하겠다. 기후가 중국과 차이가 없어서 그러한 것인지 일찍이 원나라가 점거하여 관리를 여기에 둠 때문에 중국말과 서로 섞여서"라 하였다. 내가 들은 바는 지지(地誌)에 이르지 못하나 소위 사투리란 다만 높고 가늘어 알아듣지 못하여 그럴 것이다. 숲을 곶이라 하고 메뿌리를 오름이라고 하는 등의 말은 앞서 얘기했다.'
라고 하여 당시 제주어의 특징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 전쟁 때 함경북도 청진에서 제주로 피난 온 교사 출신 피난민과 제주도 도민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일본어로 임시 의사소통 했다는 일화가 있다. 또 북한군의 도청을 막기 위해 제주도 출신을 통신병으로 임명해 제주어로 무선 교신을 수행한 적도 있다고 했다. 제주어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당시 해병대의 주축인 해병 3기와 4기생, 3000여 병사 모두가 제주도 출신이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집에 엄마 인?
“달래야! 엄마 집에 계셔?”
“언”
“달래야! 엄마가 집에 계시는지 물어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빠! 내가 없다고 대답했잖아!”
제주도에서는 ‘했어'를 ‘헨'으로, ‘안 했어’를 ‘안 헨’으로, ‘먹었어'를 ‘먹 언'으로 하는 등 줄여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와 함께 한라산 남쪽과 북쪽에서 쓰는 제주어가 다르듯,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가 달리 있다.
‘있어? 없어?'를 ‘인? 언?'이라 한다. ‘인’이라고 하면 긍정을, ‘언’이라고 하면 부정으로 보면 된다. “시간 이서?”라는 물음에 ‘인’이라고 대답하면 시간 여유가 있다는 말이고, 만일 ‘언’이라고 대답한다면 시간 여유가 없다는 말이다. 엄마가 집에 있느냐는 질문에 ‘언’이라 대답했다면, 그건 엄마가 집에 없다는 뜻이다. 그걸 몰랐던 나는 딸이 성의 없게 대답하는 줄 착각했다.
이를 제주도 사투리라고 하긴 어렵다. 제주도 사투리라기보다 ‘있니? 없니?'를 줄인 말이라고 보는 게 맞다. 제주도 안에서 생겨 제주도 안에서 사용되는 제주도만의 언어 습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구한말 제주민란들과 ‘제주 4.3’과 같은 굴곡진 역사를 견디면서 차별의 시선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제주어 사용을 자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어에는 전통과 문화, 정서, 풍토, 기질, 향토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할망 손지
아들은 ‘할망 손지’다. ‘할망 손지’란 어릴 적부터 할머니 품에서 자란 손주라는 말로, 자라면서 할머니의 정을 듬뿍 받고 자라 제주말이나 정서를 여느 어른들보다 더 잘 안다. 아들은 마당에서 흙 ‘좁아’ 먹으며 자란 아이다. 제주에서는 예전부터 ‘흙 집어 먹으며 자란 아이는 건강하다’라는 속설이 있다.
아들은 생후 100일 때 고향 서귀포시 중문으로 내려와 맞벌이 엄마 아빠 대신 6살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다. 아들은 매일 어린이집 마당에 핀 들꽃 두 송이를 꺾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선물했다. 아버지는 생전 한 번도 하나뿐인 아들 손주를 무릎 아래 내려놓질 않았다. 그런 아들은 대학원에서 조경학을 전공했다.
이런 ‘할망 손지’를 영어 유치원에 보냈으니.... 영어 유치원에 보낸 일주일이 채 안된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학부모인 아내와 나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성근이가 할머니랑 오래 살았나 봐요? 우리도 모르는 제주도 사투리를 참 많이 쓰네요. 아버님! ‘ᄇᆞ름 들어 왐져 문 더끄라’가 무슨 뜻이에요?”
아들은 영어 유치원 가서 하라는 잉글리쉬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늘 쓰던 제주도 사투리를 태연히 친구들에게 말했나 보다.

아들은 식당에 가서 ‘아이가 참 점잖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아들은 밥상머리에서 굳이 덤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어도 할머니가 된장국에 밥을 말아 옥돔생선 살을 숯가락 위에 놓아 주었기 때문에 먼저 설칠 이유가 없었다. 그런 아들이 할머니 품을 떠나 엄마 아빠랑 살게 되면서 다소 야위기 시작했다. 아침 시간 출근하기 바쁜 엄마가 할머니처럼 천천히 밥을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성이 친정인 아내보다 ‘할망 손지’인 아들이 제주말을 훨씬 더 잘하는 건 확실했다. 아내는 충남에서 대학을 나와 분당에서 교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나 충청도 말은 물론이고 표준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안다. 하지만 제주에 내려온 초기에는 이곳 말이나 풍습을 몰라 본의 아니게 황당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시어머니의 복심(腹心)이 되어야 할 큰며느리가 태연히 따로 놀았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진관훈은? =서귀포 출생, 동국대 경제학 박사(1999), 공주대 사회복지학 박사(201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특보를 역임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천사나래 주간활동센터 시설장을 맡아 일하며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제주한라대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는 『근대제주의 경제변동』(2004), 『오달진 근대제주』(2019), 『오달진 제주, 민요로 흐르다』(2021), 『제주의 화전생활사』(202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