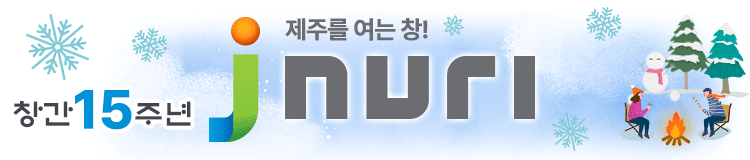지금으로부터 100년을 지나 11년을 더 보탠 111년 전의 일이다.
1901년 가을 독일 쾰른신문의 아시아특파원이자 지리학자인 지그프리트 겐테(Siegfroied Genthe·1870~1904)는 당시 조선 황실고문이었던 미국인 샌즈(William F. Sands)의 소개로 제주에 도착했다. 그의 손엔 일종의 ‘출입허가증’ 격인 고종황제의 칙서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제주목사(牧使) 이재호(李在頀)에게 매달리듯 졸랐다. 결국 그는 한 무리의 조선인들과 백록담이 있는 한라산 정상에 올랐다. 서양인으로선 첫 등반자였다.
“이렇게 방대하고 감동적인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곳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 바다 한 가운데에 있고, 모든 대륙으로부터 100km이상 떨어져 있으며, 끝없는 해수면 위로 높이 치솟아 오른 한라산은···그 정상에 서면 시야를 가리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도대체 그 누가 이 산 위 공중에서 바다를 품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 산 위에서 보이는 그 모든 기이한 것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현상으로, 마치 대양이 하늘로 올라오기라도 한 듯, 마치 평지 전부가 우당탕 열려서 해수면으로부터 거의 2000m 위에 서 있는 이곳에서도 또다시 우리를 우리의 눈이 닿는 데까지 밀어 올린 듯,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우리의 안계(眼界)를 끌어올려준다.”
독일로 귀국, 그가 쾰른신문에 1년1개월간 연재한 ‘겐테 박사의 한국여행기’ 기사는 한라산 정상등반의 감격을 이렇게 적었다.
![한라산국립공원. [제주도 제공]](/data/photos/201211/9412_13023_4041.jpg)
지리학자인 그의 전문성은 한라산 정상에 오르자 빛났다. 그는 정상에 오르고 한동안 감격에 겨웠지만 뒤이어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시작했다. 독일제 무수은 기압계를 이용, 정상 분화구의 최외곽 가장 높은 곳의 해발고도를 측정한 것이다. 1950m! “영국제 기구로 재차 측정한 결과도 6390피트였다”며 확인을 거듭한 그는 “어떤 백인도 올라보지 못한 산을 내가 올랐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정상등반의 감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나는 지름이 약 400m인 의외로 작은 분화구가 약 70m높이의 가파른 벽들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아냈다. 바닥에는 겨울눈에 다 덮이지 않고 남겨진, 큼직한 웅덩이보다 약간 더 큰, 작은 호수가 빛나고 있었다. 제주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호수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지하세계로 통하는 입구가 그 호수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긴 깊은 틈새일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한라산의 해발고도를 처음 측량한 그는 백록담의 풍경을 그렇게 스케치했다.
![한라산 산정화구호인 백록담. [제이누리DB]](/data/photos/201211/9412_13025_4043.jpg)
‘하늘을 끌어당기는 산’이라고도 하고, ‘은하수와 맞닿은 산’이라고도 하는 ‘한라산’(漢拏山)은 조선조 문인·관리들에게도 경외(敬畏)의 대상이었다.
조선조 문인으로서 부친 임진(林晉)의 제주목사 시절 제주도를 찾았던 백호(白湖) 임제(林悌․1549~1587)는 그의 기행록 ‘남명소승’(南溟小乘)에서 “한라산 정상은 ··· 못을 이루었고 둘러선 봉우리들의 둘레도 가히 7~8리나 된다 ··· 속세의 풍광이 멀리 삼천리 밖에 떨어져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의 기록은 “산 밑에서 정상까지 60리 길이다”라고만 전할 뿐 더 이상의 언급이 없다.
국립지리원은 1960년대 초부터 한라산의 높이를 1950.1m라고 고시하고 있다. 토지조사사업에 열을 올리던 일제의 1918년 측량과 해방 후 재측량의 결과다. 10㎝의 차이가 있을 지언정 겐테의 첫 측정은 그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하지만 한 서양인의 ‘과학적 접근’과 달리 조선조 선인들의 속뜻을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다. ‘속세의 풍광’을 내려다보는 그 한라산 정상은 오랜 과거부터 제주의 통치그룹이라면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방문지였다. 그런데도 한라산 정상에는 아직까지 옛 선현들이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시(詩) 한수라도, 이름이라도 남길 듯 하건만 마애명(磨崖銘)으로 불리는 글귀마저 대다수가 방선문(訪仙門)과 같은 ‘한라산 초입 길목’(?)에 불과하다. 신성(神聖)의 영역이니 당연 불가침(不可侵)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과학’으로 풀어낼 수 없는 절절한 감동이 수많은 선인(先人)들의 ‘한라산 등정기’를 채우고 있는 까닭도 그렇다.
4·3사건의 광풍이 사그라진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고 난 뒤 토벌대의 총수인 제주도경찰국장이 세운 ‘한라산개방기념비’가 어찌 보면 유일한 인공구조물이다.
![1954년 한라산 출입을 허용하는 금족령 해제후 제주도경찰국이 세운 한라산개방기념비.[제이누리DB]](/data/photos/201211/9412_13024_4042.jpg)
그 한라산의 산정화구호(山頂火口湖)인 백록담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이 됐다. 옥황상제와 산신령이 노닐던 한라산에서 한 장면을 연출했던 전설속의 백록(白鹿)이 마시던 물을 머금은 못이자 호수다. 강원 태백의 검룡소와 전남의 순천만, 더불어 서귀포의 정방폭포 등이 이미 명승으로 지정된 바 있기에 남한 최고봉의 산정호수가 이제야 명승으로 지정된 건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조금만 과거로 거슬러 가면 그 백록담은 사실 난장판이었다. 198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전국등반대회가 열리면 수많은 등산객이 한라산 정상으로 밀려 들었고, 정상 분화구 지대에선 야영텐트를 치는 게 일쑤였다. 심지어 그 백록담에서 식기 설거지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조선조 관리와 유학자, 선비가 경외했고 서양인도 감복했던 그 현장을 현대인들은 마구잡이로 유린했던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도 그 장엄한 한라산이 내뿜는 자연의 경이로움은 우리보단 세계시장에서 더 인정받았다. 한라산이 있었기에 제주도가 유네스코(UNESCO)의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지질공원, 생물자원보호구역이란 ‘3관왕’ 타이틀을 거머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그 영광을 얻기까지 지형·지질 적 특성에 이렇듯 겐테 박사의 이야기와 백록담에 얽힌 전설 등 ‘스토리’가 더해졌다. 그래서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과 더불어 ‘드라마적 상상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한라산을 오가는 수많은 탐방객들이 이런 ‘스토리’를 머리에 새기고 가는 경우는 드물다. 그나마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이란 사실이라도 알고 가면 다행이다. 더 기가 찬 건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자연유산’ 타이틀보단 정체불명의 ‘세계7대 자연경관’ 구호가 제주에선 더 요란하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한라산 백록담이 왜 이제야 국가지정 ‘명승’에 이름을 올린 이유를 알 것 같다. 세계인이, 이방인이, 선조가 인정한 가치를 제주에 터 잡고 사는 이들이 과연 제대로 알고나 있을까?
하기야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제주시 탑동의 먹돌해안을 뚝딱 매립한 것도 모자라 추가매립을 운운하고 있고, 세계적 이중화산체 구조인 대정읍 송악산 분화구 지대를 갈아엎어 호텔·콘도를 짓겠다고 부르짖던 이들이 권력을 틀어쥐고 있으니 ‘세계 7대 자연경관’ 이상의 자랑거리가 기억 속에 있을 리 만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