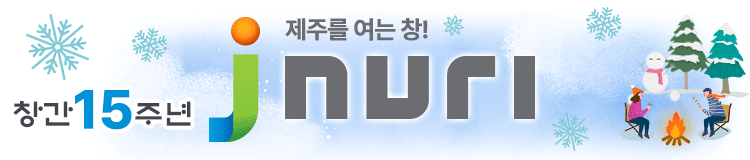이 까마귀쪽나무나 그 열매를 제주에선 ‘구럼비’라고 부른다. 구룸비·구름비라고도 한다.
구럼비!
그 구럼비는 지금 제주를 상징하는 이름이 됐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현장이다. 강정마을 해안에 떡하니 자리한 용암바위의 이름이 바로 ‘구럼비바위’다. 구럼비(까마귀쪽나무)가 주변에 많아 구럼비 바위란 이름이 붙여졌지만 사실 이 구럼비 바위는 구럼비에 비견할 ‘급’을 넘어선다.
길이 1.2km에 너비가 150m나 되는 거대한 바위가 바로 구럼비바위다. 검은색의 용암너럭바위는 한 덩어리로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지형이다. 게다가 그 바위의 한 켠에선 용천수가 솟아나 국내 유일의 바위습지를 형성하고 있다. 붉은발말똥게·맹꽁이·층층고랭이 같은 멸종 위기종들이 살던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구로 지정됐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 용천수를 ‘할망(할머니)물’이라 부른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마시면 아이가 생기고, 아픈 아이가 마시면 낫는다고 여겨지던 신성한 물이다.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정한수이기도 했다.
그 구럼비는 이제 눈앞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백척간두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부지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최근 해군기지 시공업체로부터 발파신청서가 경찰에 제출됐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험발파와 본발파를 위한 자료보완 등의 사전작업이 진행돼 왔기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발파작업은 허가될 것 같다. 이미 발파를 위한 폭약 장전을 위해 구럼비 바위 곳곳에 구멍을 뚫는 천공(드릴링)작업도 이뤄졌다. 시공업체의 신청서를 보면 발파에 쓰일 폭약이 무려 44t이나 된다고 한다.
수년간의 논란을 끌어왔고, 구럼비 바위를 절대보전지구에서 지정해제한 절차가 위법적이었다란 법률적 견해가 많지만 이 구럼비 바위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날 운명으로 치닫고 있다.

그 구럼비 바위를 지켜보겠다고 전국의 종교인, 평화운동가 심지어는 외국의 평화운동 단체·인사까지 제주 남단 서귀포에서 애쓰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것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단호한 의지를 밝히자 경찰과 사법당국의 움직임도 재빠르고 대담해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구럼비 주변에서 ‘해군기지 반대’를 주장하다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은 109명이다. 2010년 이후 2년 2개월간 연행된 사람이 연인원 329명인 것도 대단한데 최근 2개월 새 경찰의 공적이 더 눈에 띈다.
새해 초인 1월10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연행된 천주교 신부와 수녀 29명에겐 공사장 정문에서 기도회를 열어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적용됐고, 지난달 18일엔 반대측 인사들이 카약을 타고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 현수막을 설치하자 집시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같은 달 26일엔 철조망을 뚫고 구럼비 해안에 들어간 16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또 연행됐다.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선 흡사 까딱 잘못하면 끌려갈 분위기다.
'범죄없는 마을 강정마을'이란 마을 팻말이 무색하게 이 마을 주민들은 이 해군기지 문제로 전과자가 된 사람이 숱하다. '벌금 폭탄'을 맞아 생계를 걱정하는 주민들도 한둘이 아니다.
강력한 국책사업의 의지를 천명한 대통령의 한마디가 여느 시절과 남다르게 들린다. 최소한 제주에선 그렇다. 제주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최소한 강정마을에선 민주주의의 햇볕은 사라지고, 또 다른 어둠만이 드리우고 있다.
“텅텅텅~텅텅텅~ 굴착기에 매단 정이 발가락 마디를 짓뭉개고 손가락을 으깨고 정수리를 뚫었어요. 하얀 살이 터져 포말처럼 강정바다에 흩뿌려졌어요. 까만 피가 쏟아져 구름처럼 제주하늘에 흘렀어요···이봐요 이봐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이 미친 짓 그만두라고 말해주세요.”
<오마이뉴스>에 연재됐던 글을 모아 나온 책 『구럼비의 노래를 들어라』의 한 구절이다.
한동안 현역기자 생활을 떠나 있었다. 그 때도 그랬지만 현역기자 생활 중에서도 잠시 고향을 떠나 뭍(?)기자 생활을 할 때도 ‘구럼비의 노래’는 내 귓전에 들리지 않았다. 아니 미세하게 귓전을 때리던 그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다.
이념갈등과 보수·진보언론의 대립, 제주의 정파간 대립, 제주의 지역간 갈등구조에 신경 쓰는 사이 정작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이제 그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다. 송구스러움과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난 역사의 죄인이다. 사무치도록 사랑하는 내 고향 제주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러다 ‘민간 제주’와 ‘정부 대한민국’의 대결로 가는 최악의 파국으로 간다면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 4·3이 이미 가르쳐준 교훈이기에 더 그렇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도무지 밝은 빛이 보이지 않아 몹시 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