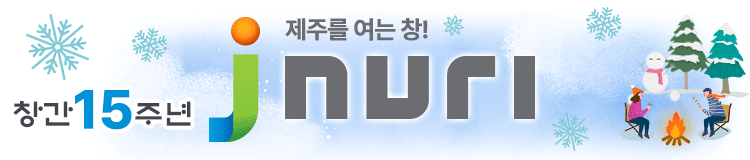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제주 무덤과 산담 [사진=김유정]](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041/art_16969007656277_38e4c9.jpg)
◇ 세상을 이루는 형태의 생(生)
“삶은 형태이며, 형태는 삶의 방식이다. 자연 속에서 형태들을 이어주는 다양한 관계가 순전히 우발적인 사건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삶이라 일컫는 것도 형태들 간의 불가피한 관계로 보인다. 따라서 형태가 없다면 자연히 삶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형태를 자연의 모든 삶의 근원으로 보는 이러한 앙리 포시용(Henri Pocillon)의 사유는 발자크(Honoré de, Balzac,1799~1850)의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형태이다. 그리하여 삶 자체도 하나의 형태이다"라는.
그렇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물은 형태로 규정된다. 돌(石), 나무(木), 사람(人), 물, 눈(雪), 산소(酸素)마저도 형태를 이룬다. 눈에 보이는 형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형태로 이루어내는 예술을 말함에 있어서 포시용은 어떤 미술작품이라도 형태적인 측면에서 파악되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세계는 다양한 형태들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개별 형태들은 서로가 물질·공간·정신·시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은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찾기도 하고, 인간 스스로의 사유활동에 의해서 찾아내는 아름다움도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 즉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형태들을 복제하는 것과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 즉 순수한 인간의 정신 활동에서 나온 형태를 만드는 것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연의 형태든 순수한 창작의 형태든 이 형태들에는 각각의 물질적 재료들이 관여한다.
물질(物質, substance)은 물리학에서는 일정한 질량을 가진 대상을 말하는데 화학에서는 균일한 조성을 가진 순수물질과 2종 이상의 순수물질이 모인 것을 혼합물질이라고 한다. 물질은 구성성분을 이루는 구조가 있다. 화학자들에게 구조란 순수한 화합물에서 어떤 원자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간에서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만일 하나의 암석에 성분이 다른 두 물질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을 분별결정화(分別結晶化)라고 부른다.
광물(mineral)은 보통 금, 은, 구리 등 땅속에서 나온 모든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광물은 규칙적인 결정구조와 일정한 화학 성분을 가지며,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무기적(無機的) 고체(固體)로 정의 된다. 광물은 가장 흔하게 보이는 암석(rock)을 이루는 기본 블록(block)이다, 암석은 지구의 한 부분으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수많은 광물들과 비광물질로 이루어진 고체덩어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암석들은 광물질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광물을 포함한 모든 물질들은 원자라고 부르는 미세한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원자로 구성되지만 원자는 다시 더 작은 부분들로 나눌 수 있다. 그것들은 다시 전자, 양성자, 중성자들로 구분되고 얼마만큼 더 작게 나눌 수 있는 지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물질이 어떻게 처음 생기는 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물질은 액체, 고체, 기체라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모든 물질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로만 존재한다. 우리가 아는 물질을 공통적으로 구성하는 기본 입자 같은 것은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성되고 사라지는 물질들 사이의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공간은 무한히 작은 공간에서 우주로, 또는 그 너머로 연속적으로 확장된다.
돌은 고체이다. 화강암도 소금 결정 같은 결정체로 만들어지고 조면암 또한 무수한 사각의 결정으로 분해된다. 돌을 이루는 결정들 자체는 매우 단단한 것 같지만 그 결정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형성돼 있어 그 결정들 사이에는 간격과 구멍이 있기 때문에 미립자 사이의 결합은 사실상 그리 견고하지 않다. 물질의 특성은 그 물질의 구성 요소들이 이루는 형태와 그 구성 부분들의 결합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 구성 요소들이 견고하냐, 느슨하냐의 결합 정도에 따라 강한 물질인가 아닌가가 판명된다.
![무령왕릉 출토 유리동자상(2.8㎝), 백제 [국립공주박물관 소장]](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041/art_16969007661286_dfc11f.jpg)
조각(sculpture)은 실재하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체들에 대한 입체적이고 공간적인 재현예술이다. 조각은 스쿨페레(sculpe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며 ‘잘라내는’, ‘깎아내다’라는 의미를 말한다.
조각가들은 이 어원에서 보듯이 쓸데없는 재료를 떼어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재료를 덧붙이는 일도 한다. 덧붙이는 일인 소조(塑造)와 깎아내는 일(刻)을 합쳐 조소(彫塑)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조각의 다른 표현으로도 쓰인다.
예술가가 사용하는 재료가 작업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재료의 성질상 사람마다 깎아내기를 선호하는 사람은 돌이나 나무 재료를 선택할 것이고, 덧붙이는 사람들은 찰흙으로 모형을 만들어 석고나 브론즈로 형상을 만든다. 또 현대 조각이나 설치미술에서 보듯이 개념적이거나 부피를 확장하거나, 또 부분들을 증축하며 이루는 것 등 조각은 매우 범위가 넓어졌다.
사실상 조각은 표면에서부터 심층으로, 그리고 심층으로부터 외부로 진행하는 두 가지 양식은 바로 재료의 특성으로써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조각은 의심할 여지없이 소묘에서 생겼고, 소묘는 평면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소묘는 깊게 파여짐으로써 부조(浮彫)와 환조(丸彫)가 되었다. 소묘는 조각의 깊이를 더해 주는 형상을 만들어낸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각형의 돌이 서 있는 사람으로 탄생한다.
그러므로 형태란 막연한 어떤 것일 수가 없다. 예술마다 각각의 재료가 형태를 따른다. 포시옹의 말대로, 예술가의 정신 속의 형태는 붓, 크기, 면, 선(線)의 행로이자 반죽된 그 무엇이며, 색칠해진 그 무엇이고, 한정된 재료 속에 있는 덩어리들의 배열이다. 형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형태 자체가 사물이라는 것은 아니다. 형태는 촉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을 끌어들인다.
◇ 동자란 무엇인가
동자는 어린아이(兒童)이다. 같은 말로 동치(童稚), 소사(小士)라고 한다. 아이는 천진무구하고 해맑은 모습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동자의 머리 모양은 두 가닥 쌍계(雙紒)를 짓고 있거나 세 가닥으로 결발을 지은 머리, 그리고 땋은 머리나 풀어헤친 머리 모양 등을 하고 있다.
동자를 부르는 말에는 갓난아이를 적자(赤子)·영아(嬰兒)라 하고, 젖먹이 아이를 해동(孩童), 품에 안길 정도의 아이를 해포(亥抱), 네 살 된 아이를 소아(小兒)라 하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아동(兒童), 열 살 된 아이를 유(幼), 어리석은 아이, 혹은 아직 장가들 기 전 아이를 동몽(童蒙)이라고 한다.
맹자는 중국 고대의 어린아이를 ‘5척 동자(五尺之童)’라고 불렀다. 당시 5척이면 아이들의 평균 신장이었는데, 전국시대에는 아이들의 키가 1척에 23㎝여서 5척이면 1m 15㎝가 된다. 그러나 당·송대(唐宋代)에 와서는 ‘아이의 키가 5척 동자가 3척 동자로 바뀌었는데 송대의 1척은 약 31.7㎝이므로 아이의 키가 1m 15㎝인데 아이의 키가 전국시대보다 당·송대가 작아졌다.
![3세 동자 [사진=김유정]](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041/art_16969007665575_2590a3.jpg)
◇ 동자석의 명칭
제주 동자석은 제주인의 와음과 변음의 발음으로 동제석, 동ᄌᆞ석, 동주석, 동제상, 동자상, 애기동자1) 등으로 제주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동자석’이라고 한다.
동자(童子)+석(石:돌), 즉 동자석은 돌로 만든 아이 형상이다. 돌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돌 조각(石彫刻) 유형이다. 그러니까 형식은 돌 조각이고 내용은 어린 아이(童子)가 되며, 범주는 현대조각 이전의 전통조각이 되고 조각의 성격은 유교의례용으로 수호적인 정면성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종교가 습합되었다.
동자석의 민속적 개념이 신당의 무속 기자석(祈子石)에서 유래하고 그 기자석이 마을 입구에 세워져 오가는 여인들이 아들 낳기를 바라고, 또 조선의 유교적 의례 전통에 기인한다. 동자석은 십자가, 꽃, 무속 기물, 뱀, 새, 까마귀, 오리, 숟가락, 젓가락, 술잔과 술병, 칼, 달거울, 창, 고리, 적(狄)꽂이 등 제주의 종교적 흐름과 연관이 있다.
도교 신선의 시중을 드는 아이〔侍童〕, 불교의 선업 동자, 무속의 기자석이나 동자석과 동자 판관, 유교의 학동(學童)이나 제사때 조상의 혼백을 대신하던 시동(尸童)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탄생한 석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연물이나 선조각(先彫刻:자연물에 부분적으로 가미한 조각) 형상은 언제나 사상에 선행하는데 자연에서 형태를 찾아 상징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또 동자석이라는 말은 왕릉의 난간과 난간 사이를 지지하는 ‘동자석주(童子石柱)’ 기둥이 세종 때에 등장하고, 자연석 입석을 ‘동자석(童子石)’으로 부른 것은 조선시대 선조 때에 나타나며, 그리고 ‘동자석인(童子石人)’이라는 말은 인조 때에 등장한다. 이와 같이 동자석은 도교, 불교의 석상, 왕릉의 난간 기둥〔童子石柱〕으로 불렀고, 또는 절간의 입구에 세우는 표석으로도 부르고 있어 조각예술로 개념적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제주도 무덤에 세우는 아이 형상의 석상만을 동자석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현재도 동자석을 골동품으로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어서 미술관보다는 박물관 소장에 집중돼 있고, 연구자 또한 미술학적인 시각보다는 역사학 시각에서 다루다 보니 조각예술을 형태학적이고 미학적인 눈이 결여돼 조형성을 왜곡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조형에 대한 뎃생력과 구성력, 미학적인 분석이나 미술적인 안목없이 다루다보니, 사실적이면 걸작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무엇이 그 조형의 문제이고 서툰 것인지 의도적으로 고졸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동자석은 옛 문헌에는 아이 형상으로, 동자석주, 동자석, 동자석인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었다. 그렇다면 동자석과 동자석인에 대한 용어 출현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자.
![육지의 동자석, 이건의 쌍계 동자석 [사진=김유정]](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041/art_16969007669294_7b49e9.jpg)
『세종실록(世宗實錄)』 에는 동자석주(童子石柱)를 왕릉의 난간 사이를 받치는 돌을 말한다.
성혼(成渾 1535~1598)은, 사찰 가는 길에 “옛사람이 두 개의 큰 돌을 골짜기 가운데에 서로 마주 보도록 세워서 표시하였는 바, 수십 보(步)마다 이러한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동자석(童子石)이라고 하였다(古人以兩石相對立于谷中以誌之, 數十步必有一對, 名其石曰童子石).” 여기에 언급된 동자석(童子石)은 사찰 입구에 서로 마주 보게 세운 입석을 말하고 있다. 즉 사찰로 가는 경계 표시로써 불교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은 산릉(山陵)을 조성하는 역사(役事;노동) 가운데 항상 석역(石役:돌일)이 늦는 것을 염려하는 글에서 동자석(童子石)이라는 말을 썼다, “그 나머지 외면(外面)에 배열하는 문무석(文武石)·양마석(羊馬石)·망주석(望柱石)·동자석(童子石) 등은 결코 기한 안에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인데 옛날에도 이렇게 해 놓았다가 성분(成墳)한 뒤에 추후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其餘外面排列者如文武,羊馬,望柱,童子等石. 决不能及, 古亦有如此, 而追設於成墳之後者).”
『인조 실록(仁祖實錄)』 인조(仁祖) 4년(1626) 2월 3일 기사, 이정구의 말에 동자석인(童子石人)이라는 말이 나오며, 이정구(李廷龜, 1564~1635)의 『월사집(月沙集)』에도 한 쌍의 석인을 동자석인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6년이 지나(1632) 왕릉의 석물 중 동자석을 다시 문석(文石:文官石)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고 왕이 이를 허락한다.
이후 정조(正祖) 시대의 기록들에 등장하는 동자석주는 난간 사이에 세우는 작은 기둥을 말하기 때문에 동자석의 석상 의미와 혼동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석인(石人)이란 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으로, 왕릉이나 양반 사대부 등 신분이 높은 사람의 무덤 앞에 세우며, 그 종류로는 문관석인(文官石人·문석(文石)·문석인), 무관석인(武官石人·무석(武石)·무석인), 동자석(童子石) 등이 있다. 무덤 앞에는 다양한 석물이 있다, 그 석물은 조선시대 무덤에 사용되는 민간 석재품(石材品)으로 동자석, 문석인, 무석인, 비석, 망주석, 혼유석, 상석, 토신단, 제절(除節)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동자석 금기(禁忌)라는 사뭇 다른 표현이 나온다. “(무덤에는) 절대 동자석(童子石)을 세우지 말 것이며, 다만 망주석(望柱石)은 세우지만 서민(庶民)에게는 금하는 법이 있다.” 라고 하여, 동자석이 양반 사대부의 신분적인 제약이 있는 석물이므로 산림에 사는 선비들은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게 무덤에 동자석을 세우지 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자석은 정작 한양에서 멀어질수록 지방에서는 토호 향리층이나 돈 있는 서민들의 무덤에도 가문의 위세를 세우려는 기념물로 유행하였다. 특히 제주의 문석인은 복두를 쓰고 있고, 무석인은 돌하르방 모습으로 등장하며, 동자석은 댕기머리와 쪽진 머리를 하고 있어 육지 동자석과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골동품으로 취급된 동자석
동자석이 터부가 있는 무덤이라는 “성(聖)의 영역에서 사고 팔리는 일상의 속(俗)된 영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일제 식민지의 골동상품으로 인식한 군국주의의 폐해였다. 식민지란 남의 나라 것은 함부로 수탈하고 자기 나라 것은 적극적으로 팔아먹는 시장구조였기에 한국의 석상들과 전통 유물들이 일명 골동품이 돼버린 것이다.
일제 강점기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와 같은 일본인들이 잠시 애잔함을 보이면서 식민지 조선의 골동품을 비감하게 수집하던 여파도 크거니와, 1970년대 초 새마을 운동으로 낙후된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되면서 골동품으로 취급된 계기가 마련되었다. 골동품이라고 하는 소유 개념이 유행하면서 서민들은 안목이 없었고, 돈푼깨나 있고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사람들은 싼값에 끌어 모았다.
1970년대는 유력 정치인과 식자층이 고미술이라는 이름으로 한때 호사(豪奢)했던 시절이었다. 새마을 운동은 근대화라는 기치를 걸고 농촌계몽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문화가치들을 일거에 정신 개조시키는 바람에 유물들은 한꺼번에 쓸모없이 버려지다시피 쏟아지면서 그 기회를 타고 골동품 시장은 인사동을 중심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실체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내고 물질은 여러모로 생각을 다각도로 헤아리게 만든다. 어떤 보석도 가치를 알지 못해 흙 묻은 채 놔두면 그냥 돌일 뿐이고, 보물마저 결코 알아챌 수가 없다. 순진 어리숙한 섬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1970년대를 전후로 무덤 석상들을 위시한 남방애, 문자도, 민화, 정주석, 궤, 허벅 등이 이때부터 대거 육지로 밀반출되었다.
동자석은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도굴돼고 있으며, 장묘제도의 급변으로 무덤의 남은 석물들은 파묻어버리거나 세간의 뜨락을 떠돌고 있다. 석상의 보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순간이다. 동자석은 기껏 이장하지 않은 무덤에 겨우 “수레바퀴 자국의 고인 물에서 겨우 숨만 붙어있는 붕어와 같은(涸轍鮒魚) 신세”가 돼버렸다.
골동품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 최근에는 소위 가짜가 부쩍 늘었는데 여기서 가짜란 무덤의 유물주소가 없이 새로 조작된 이미테이션 석상을 말한다. 그것을 판별할 줄도 모르고 무식한 기록으로 남게 되면, 미술의 역사가 조작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다.
![김만일 무덤의 동자석, 2차례 도굴됐다. [사진=김유정]](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041/art_16969007674664_7bdb7b.jpg)
◇ 제주도 초기 동자석
육지의 동자석인 경우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15세기부터 동자석이 등장하지만 초기 형태라 그런지 매우 고졸하다. 조선중기에 해당하는 17세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여파로 말미암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불신이 확산되는 시기이며, 이에 위기를 느낀 지배층은 수령권을 강화하여 중앙집권화를 꾀하고 유교의 강고한 지배질서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제주도 동자석은 17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데 김만일 무덤과 아버지 김이홍 무덤에 있던 석물이 그것이다. 김만일 무덤의 동자석은 험상궂은 인상에 작은 손을 가슴 아래 모으고 있으며, 향을 꼽을 수 있게 작은 구멍을 뚫었다. 형태는 졸렬하면서 툴툴하고 둥그스름한 머리는 민머리를 하고 있다. 헌마공신 김만일 동자석의 편년은 1632년, 그가 타계한 연도로 추정할 수 있다. 김만일의 아버지 김이홍의 문석인과도 동일한 양식인 것으로 보아 아들 김만일의 석성을 조각할 때 여느 때처럼 윗대를 예우해서 만든 석상 임을 알 수 있다.
![쪽 진 동자석(동녀, 왼쪽), 쪽 진 머리 300년전의 시녀(오른쪽) [사진=김유정]](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041/art_16969027015405_971d21.jpg)
◇ 제주도 동자석의 양식적 독창성
동자석의 다음 7가지 기능은 필자가 지속적인 보완을 거쳐 구상된 것으로 제주도 무덤석물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모티프가 된다.
⦁숭배적 기능 : 사자(死者)에게 제례를 행하기 위한 공경(恭敬)
⦁봉양적 기능 : 영혼을 위한 심부름꾼, 정성으로 공양하는 시동(侍童)
⦁교훈적 기능 : 동심(童心)으로 수신(修身)하여 염치 있게 살라는 가르침
⦁수호적 기능 : 사자(死者)를 악귀에서부터 수호하기 위한 임무 수행
⦁장식적 기능 : 가문의 권위(權威)를 알리기 위한 무덤의 치장(治裝)
⦁주술적 기능 : 사자의 영혼을 위무(慰撫)하기 위한 종교·신앙적인 기능
⦁유희적 기능 : 사자(死者)와 벗해 놀아주는 아이, 또는 말벗
제주도 동자석이 육지의 무덤 석상과 크게 다른 특징이 있다면 머리와 손에든 기물(器物)이다. ‘자(子)’가 남자와 여자를 모두 지칭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동자에는 남자 아이를 가리키는 동자가 있고, 여자 아이를 말하는 동녀가 있는데 이 차이는 머리의 모양에서 쉽게 구별된다.
![댕기머리 동녀(왼쪽), 댕기머리 몽골(오른쪽) [사진=김유정]](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041/art_16969027019053_fa888c.jpg)
필자는 2001년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전’을 열 때만 해도 풀리지 않은 것이 바로 여자의 쪽 진 머리였다. 동자석의 댕기머리는 동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당시 만해도 동녀가 쪽 진 머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쪽을 지었다는 것은 곧 혼인한 여자라고 생각하여 ‘시녀(侍女)’라고 임의적으로 기록했었다. 그러나 두 기 한쌍으로 세우는 석상의 형식상 동남과 동녀라는 의미는 맞았으나 동남과 시녀라는 개념이 영 맞지 않아 고민하던 중 고서(古書)에서 마침내 겨우 그 의문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
제주 어사로 왔던 이증(李增, 1628~1686)의 『남사일록(南槎日錄)』에는 제주 여자아이들이 쪽진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 눈이 번쩍 트였다. 지금까지 동자석 중에 동녀를 나타내는 쪽진 머리를 시녀(侍女), 또는 부인(婦人)으로 여겼으나 이증의 기록 때문에 제주에서는 어린 여자 아이도 쪽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자와 여자는 길가에서 우뚝 서 바라보는데 남정들은 모두 가죽옷에 가죽 모자를 했고, ‘여인들은 비록 7, 8세 아이라도 모두 머리를 두 가닥으로 땋아 묶어 쪽을 지었다(女人則雖七八兒皆辮髮兩條爲髮髻)’.”
제주도 동자석의 독창적인 특성 중 손에 든 기물(器物)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구상과 추상 영식의 동자석 [사진=김유정]](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041/art_16969007694841_0867a8.jpg)
◇ 파격적인 동자석
동자석의 파격미는 우연이 아니다. 한 동자석에 구상과 추상 양식이 동시에 표현된 예는 전(全) 조각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동자석은 수준 높은 조각임을 보여주고 있다.
손은 직선으로 매우 단순하게 표현하면서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마치 인간의 육체는 단순한 자연에 머물지 않고, 형태와 구조상 그 안에서 곧 정신도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현존재로 나타난다.
사실상 정면성의 의례 조각이면서도 긴장하여 경직되지 않게 표현된 조각인데 얼굴 표현을 보면 이목구비가 균형이 잡혀서 살 오르는 볼 처리하며 표정과 시선이 매우 자연스럽고 앳띠어 생기가 돌고 있다.
이마는 알맞게 튀어나와 머리에서 턱까지 전체 균형이 타원을 이루면서 목 선(線)을 타고 부드럽고 은은하게 상체와 합치고 있다. 목은 보이지 않게 옷깃을 세운 채 어깨로 스미듯이 하나가 된다. 입술은 살짝 다물고 있어 오히려 튀어나온 듯이 보여서 야무지다. 귀는 너그럽게 보이도록 큰 편이어서 얼굴의 긴장감을 잡아준다.

어깨 아래 몸체는 하부로 내려올수록 약간 비스듬하게 처리돼 밋밋한 전면(前面)이 무게 중심이 필요한 것을 알고 넓은 직사각의 긴 띠로 처리하고 있다. 두 손은 단순한 기하학적 직선으로 처리하여 디테일하게 세부 묘사된 얼굴과 대조로 이룬다.
정교함과 단순함, 돌출된 운동과 조용한 평정(平靜)이 한 석상에서 이질적으로 부딪치지 않고 서로 교감하고 있다. 머리는 쪽을 지고 있는 동녀이다. 맞은 편 동자석은 얼굴이 선묘 중심으로만 표현돼 있는데 이 동녀석보다는 제작 형식이 단조로운 것으로 보아 제작자가 다른 사람일 수가 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1) 변정섭, 68세,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2000년 채록).
![길 잃은 동자석 [사진=김유정]](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041/art_1696900770174_8f8ebc.jpg)
![문석인과 돌하르방 문석인 [사진=김유정]](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041/art_1696900769803_1cab42.jpg)
<참고문헌>
게오르크 빌헬름 헤겔, 『헤겔의 미학강의』, 두행숙 옮김, 은행나무. 2012.
김유정, 『제주도 동자석 연구』, 제주문화연구소, 2021).
김유정, 『제주도 돌담의 형태, 구조, 미학』, 제주문화연구소, 2022.
로얼드 호르만,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이덕환 옮김, 까치, 2018.
로제 카이유와, 『일반미학』, 이경자 옮김, 동문선, 1999.
이돈주, 『중국의 고대문화』, 태학사, 2006.
이만영 편저, 『재물보2』, 남종진 옮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9,
李增 著, 『南槎日錄』, 金益洙 譯, 濟州文化院, 2001,
Frederick K. 외, 『지질환경과학』, 함세영외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6.
크리스토퍼 윌리엄스, 『형태의 기원』, 고현석 옮김, 이데아. 2023.
힐데브란트, 『조형미술의 형식』, 曺昌燮, 옮김, 民音社, 1989.
☞김유정은?
= 최남단 제주 모슬포 출생이다. 제주대 미술교육과를 나와 부산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술평론가(한국미술평론가협회), 제주문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제주의 무신도(2000)』, 『아름다운 제주 석상 동자석(2003)』, 『제주의 무덤(2007)』, 『제주 풍토와 무덤』, 『제주의 돌문화(2012)』, 『제주의 산담(2015)』, 『제주 돌담(2015)』. 『제주도 해양문화읽기(2017)』, 『제주도 동자석 연구(2020)』, 『제주도 산담연구(2021)』, 『제주도 풍토와 문화(2022)』, 『제주 돌담의 구조와 형태·미학(202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