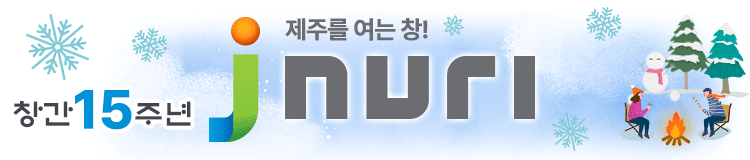1. 남반미술에서부터 20세기 일본 미술
일본의 근대는 메이지 유신과 함께 찾아왔다. 메이지 시대는 일본의 신구(新舊) 세력이 새롭게 재편되는 격동의 시기이기도 한다. 1889년은 일본 제국 헌법이 발포된 해이고 이어서 이듬해 교육칙어가 발포되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근대국가체제가 확립되어 갔다.
이렇듯 일본의 근대적인 미술은 곧 그런 근대체제 위에서 피어난 것이지만 일본의 근대미술은 메이지 유신과 함께 시작된 것은 아니다.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의 내항으로부터 1858년의 미일수호통상조약 체결에 의해 에도 막부에 서양화(西洋化)의 시작을 알렸고, 쇄국정책의 붕괴와 함께 바야흐로 일본근대체제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일본의 개항 항구 요코하마에는 미국, 러시아, 영국의 상선들이 빈번히 왕래하면서 외국인 거류지로 정비되어 갔다. 요코하마는 국제도시로써 서양의 문물과 기술, 예술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다.1)
일본미술사에서 서양 풍경화의 일본 유입은 1571년 최초의 포르투갈 배가 나가사키에 입항하면서부터 서서히 점화되고 있었다. 1639년(寬永 16) 도쿠가와 이에야쓰(德川家康) 막부가 쇄국정책을 실행하기까지 약 70년간 외국 무역 상관(商館)이 운영되고 있었고 기독교 선교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렇지만 쇄국정책이 시행되는 1639년 이후에는 나가사키에 인공섬 데지마를 기점으로 네덜란드 선박과 중국 선박에만 유일하게 열리게 된다. 이로부터 나가사키는 남반미술이 유입되게 된다.
1549년 8월 가고시마에 예수회 선교사 자비에르가 도착한 이후 일본으로 서양 문물이 안착되고, 이후 조선의 일제강점기까지 일본의 서양화 전개 과정은 모두 5기로 나눌 수 있다.2)
1기는 16~17세기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유럽문화가 소개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미술에서는 난반병풍(南蠻屛風)과 같이 유럽 사람이 일본에 도착한 사건이 그림으로 그려진 시기이다. 2기는 18~19세기에 네덜란드 학문인 난학(蘭學)이 유입되면서, 일본 전통회화에 유럽의 원근법과 음영법이 결합된 시기이다.
제3기는 메이지 유신을 전후로 유럽의 화가들이 일본으로 와 일본인 화가들을 가르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4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본인 화가들이 직접 유럽으로 가서 서양화를 배워 온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제5기는 20세기 초에 일본제국주의의 아래 일본서양화가 한국, 대만, 만주 등 동아시아에 전파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모두 5기의 구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국 서양화의 유입시기라고 할 수 있는 제4기와 5기이다. 제4기에서 프랑스에서 유학한 구로다 세이키(黑田淸輝, 1866~1924)의 존재이다. 구로다 세이키는 리파엘 콜랭에게서 인상주의 외광파(外光派) 화풍을 배워, 1896년 도쿄미술대학 서양화가를 설립하여 최초 서양화과 주임교수가 된 인물로 그후 일본 서양화의 주류 화풍을 이끌었다.
한국인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이 도쿄미술대학 출신이며, 뒤이어 평양 출신 김관호도 그 학교를 졸업한 인물이다. 또 변시지의 스승인 데라우찌 만지로는 구로다 세이키가 설립한 백마회연구소 출신이고, 1944년 조선미술전람회 23회 서양화 심사위원이었다.
2. 일제강점기의 제주풍경화
일본제국주의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구실 아래 아시아 전역을 식민통치했다. 특히 일본은 조선에 대해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부르짖으며, 부산, 제주에 직항로를 설치하여 식민지 시장을 경영하면서 일본을 쉽게 오갈 수 있었다. 일본인 화가들은 조선 전역을 내지처럼 다닐 수 있었고, 제주인들은 오사카항을 통해서 값싼 임금의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그려진 일본인 화가의 풍경화를 보면, 1935년 츠루타 고로(1890~1969)가 그린 '제주도'와 '서귀포'라는 제하의 연필 스케치 작품이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이 보이고 밭담길에 앞서서 가는 두 마리 등짐 진 소를 따라 머리에 수건을 쓰고 허벅을 진 아낙네가 마을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서귀포'라는 작품은 서귀포 앞바다 문섬을 뒤로 하고 초가 돌담 사이 오르막 길을 흰 수건 쓰고 등짐 지고 가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제주도 돌담과 초가가 매우 인상적으로 보인다.
당시 제주도 풍경을 스케치한 츠루타 고로는 도쿄 출신으로 백마회연구소(白馬會硏究所)를 거쳐, 태평양화회연구소(太平洋畫會硏究所)에서 나카무라 후세츠(中村不折)에게 사사를 받고, 1912년 경성일보사에서 삽화를 그리기도 했다. 1930년, 1935년에 걸쳐 조선 뿐만아니라 전세계로 사생 여행을 다녔고, 태평양전쟁 중에는 전쟁기록화를 그렸다. 나카무라 후세츠는 태평양미술학교 출신 제주화가 고성진의 스승이기도 했다(고성진 증언).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제주인 화가의 서양화 풍경 작품들은 보기가 매우 어렵다. 일제강점기에 풍경화를 남긴 화가로는 김인지, 변시지 등이다.
김인지의 호는 심석(心石)이며, 1907년 서귀포시 중문면 하례리 출신으로, 1925년 제주공립농업학교 졸업, 1929년 전남공립사범학교(현재 광주교육대학)를 졸업하고, 1934년 도쿄 고등사범학교 부속 동광회도화강습회에서 서양화를 배웠다. 일제강점기 식민지문화통치의 기구로 설치된 조선미술전람회 14회(1935), 15회(1936), 17회(1938) 등 세 번에 걸쳐 서양화부 입선을 수상했다. 비록 일제강점기 문화기구였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연거푸 입선하며 등용한 서양화가로서 전라남도 최초의 서양화부문 수상자가 되었다.

김인지의 풍경화 작품으로는 기정 아래에서 흐르는 물에서 두 아낙네가 빨래를 하는 장면을 그린, 1935년 제14회 선전 입선작 '애(涯)'와 서귀포항을 차분하게 그린 1936년 제15회 선전 입선작 '서귀항'이 있다. 그리고 서귀포의 해녀를 그린 1938년 제17회 선전 입선작 '해녀'를 비롯해 초기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연도 미상의 '제주향교', 1940년대 '제주항' 풍경, 성산일출봉 아래 항구를 그린 제목미상의 풍경화, 서귀포 항구를 그린 '서귀항' 등이 해방전의 풍경화라고 할 수 있다.
김인지의 작품에서는 일본의 송진파 영향이 배어난다. 송진파란 물감을 두텁게 바르고, 갈색과 청록을 사용하여 탁한 색조의 마티에르와 검은 색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고전적인 화풍이다.

변시지가 그린 풍경화는 1943년 주황색의 주조로 그린 '농가'라는 작품이 있다. 또 해방 이듬해 일본에서 그린 1946년작 위트릴로 화풍을 연상하게 하는 '백색가옥과 흑색가옥', 1947년작 나목의 숲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모습을 그린 '겨울나무'가 있다.
세 작품 모두 물감을 두텁게 발라서 질감을 살리고 있는데 '백색가옥과 흑색가옥'은 흑백의 대비를 통해 묵직한 느낌으로 화면의 중심으로 균형을 잡고 있으며, '겨울나무'는 추운 겨울 앙상한 가지뿐인 숲의 삭막함을 따스한 햇살이 김싸주듯이 비추면서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다.

변시지는 서귀포 서홍동 출신으로 오사카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여 일본 광풍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귀국전 한 때 좌파계열의 미술가 단체에 몸담기도 했으나 그 단체가 급진적인 행보를 보이자 탈퇴하고 1957년 서울로 귀국하여 1975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서양화 교수가 되었다.
일본 유학생 가운데, 제주인 서양화가 고성진은 서양화 작품이 소실돼 버려 삽화만 전해오고, 송영옥과 양인옥도 일제강점기에 그린 풍경화 작품들을 볼 수가 없다. 김광추는 1930년작으로 추정되는 '정지(庭池)'라는 풍경화 소품이 전해온다.

화가에게 작품은 자신의 내면적 발언과도 같다는 점에서 색채의 시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꼭 해당 작가의 정신세계와 의미론적인 가치가 따를 것이다. 그러기에 풍경화는 작가의 인생에서 얻은 경험적 해석에 다름 아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1) 山下裕二‧高岸 輝, 『日本美術史』, 株)美術出版社, 2014.
2) 국립중앙박물관도록, 『일본근대서양화(日本近代西洋畵)』, 국립중앙박물관, 2008.
☞김유정은?
= 최남단 제주 모슬포 출생이다. 제주대 미술교육과를 나와 부산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술평론가(한국미술평론가협회), 제주문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제주의 무신도(2000)』, 『아름다운 제주 석상 동자석(2003)』, 『제주의 무덤(2007)』, 『제주 풍토와 무덤』, 『제주의 돌문화(2012)』, 『제주의 산담(2015)』, 『제주 돌담(2015)』. 『제주도 해양문화읽기(2017)』, 『제주도 동자석 연구(2020)』, 『제주도 산담연구(2021)』, 『제주도 풍토와 문화(2022)』, 『제주 돌담의 구조와 형태·미학(202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