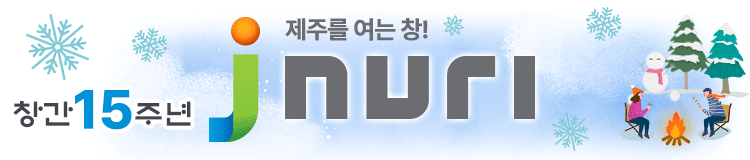목사 이약동(李約東;1416~1493)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그 해묵은 곰솔나무 그늘 아래에는 자연석 한 면을 다듬어 ‘漢拏山神古墠碑(한라산고선비)’라는 글씨가 새겨진 옛 비가 있다. 조선 성종 때의 제주목사 이약동(李約東;1416~1493)이 백록담에서 지내던 한라산신제의 폐해를 알고 이곳으로 옮긴 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다.
이약동이 제주목사로 도임한 것은 1470년(성종 1) 10월이었는데 심재(心齋)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을 보면, 이 무렵 제주도에서는 매년 겨울 백록담에서 한라산신제를 지냈는데 동상에 걸려 죽고 다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약동은 많은 사람이 눈 쌓인 한라산에 오르며 추위와 싸워야 하고 또 기상이 악화될 때에는 희생자까지 내게 한다는 것은 사실을 알고 신단을 산천단으로 옮겨 이곳에서 제사를 봉행하도록 했다. 이때부터 이곳을 산천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비는 산천단의 설단 내력을 기록한 지문비(誌文碑) 1기(基)와 함께 1978년 고(故) 홍순만 제주문화원장이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편, 지문비는 모두 2기로 달필의 초서로 새겨져 있는데 마모가 심하고 연대와 새긴 이의 이름이 새겨진 부분이 파손되어 언제 누가 새겼는지는 알 수 없다.
이약동은 세종 때 기건 목사와 함께 조선시대 제주를 거쳐 간 280여 목사 중 청렴으로 그 이름이 알려진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이다.
이약동의 자(字)는 춘보(春甫), 호는 노촌(老村), 시호(諡號)는 평정(平靖)이며, 본(本)은 벽진(碧珍;星州)이다. 1441년(세종 23) 진사시를 거쳐 1451년(문종 1) 증광시에 문과 급제하여 사섬시직장(司贍寺直長)로 첫 벼슬길에 오른 이후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까지 40년간을 벼슬살이를 하면서 청백리에 올랐고, 그와 관련한 많은 전설을 남기고 있다.
괘편암 전설
이약동 목사가 제주에서 만 3년을 재임한 뒤 1473년(성종 4) 8월 떠나게 되었는데, 재임 기간에 쓰던 관물인 관복이나 물건들을 정리하여 모두 관부(官府)에 두고 떠났다. 그런데 도중에 문득 손에 쥐고 있는 말채찍이 제주도의 관물임을 깨닫고 되돌아가 그 채찍을 성벽 바위에 걸어 놓고 다시 떠났다. 무의식중에 들고 떠났던 말채찍은 제주에 부임 와서 평소에 쓰던 것이었는데 이것마저 제주에서 난 것이라 하여 다시 되돌아와 관루(官樓) 기둥에 걸어놓고 떠난 것이다.
이전 수령들이 잡다한 명목(名目) 하에 섬사람들을 착취했고 또 떠날 때에는 수많은 토산품을 배에 가득 싣고 떠났다는 말을 듣고 분노를 가누지 못했던 그였기에 이후에 오는 목사들에게 이러한 악폐를 고쳐야 한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 후 제주의 향리들이 그가 걸어놓고 떠난 채찍을 그대로 두게 하였는데, 그 채찍이 오래되어 썩은 그 자리에 다시 채찍 모양을 그대로 본 떠 돌에 새겨 제주에 부임하여 온 목사들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고 한다. 그 바위를 ‘괘편암(掛鞭岩)’이라 불렀는데, 아쉽게도 그 자취는 전하지 않는다.
투갑연 전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설이 전해오고 있는데, 새로운 부임지로 향하는 그가 탄 배가 바다 한 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 배는 더 오도 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었다. 사공들은 그곳을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별 효과 없었다. 그때 이약동 목사가 태연히 일행을 향해 묻기를, “우리 일행 가운데 혹시 섬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느냐?”하니, 그를 수행하던 비장(裨將) 중 한 사람이 엎드려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사또께서 떠나시게 되자 섬사람들이 갑옷을 한 벌 만들고 와서 사또께 드리면 거두지 않으실 게 분명하므로 몰래 가지고 가셨다가 필요하실 때 쓰시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뢰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아마 신명(神明)께서 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고 하였다.
이 목사는 비장에게 명령하여 그 갑옷을 곧 바다에 던지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그 사납던 파도가 차차 가라앉아 배가 나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육지에 닿을 수가 있었다 한다. 이 갑옷을 던졌던 곳을 후세 사람들은 투갑연(投甲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김석익은 그의 또 다른 저술 『파한록(破閑錄)』에서 금갑(金甲;갑옷)이 제주산이 아닌 이상 투갑의 갑은 포갑(鮑甲)이라 하여 세수 대야용 전복껍질로 보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추론이라 하겠다.
이약동은 제주를 떠난 후에도 여러 차례 임금에게 건의하여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고 도민의 이익을 위하여 힘쓴 기록이 실록에 여럿 보인다. 그가 대사간(大司諫)으로 있을 당시인 1477년(성종 8)에 제주도민의 교육 문제를 들어 제주 3읍의 수령을 문무를 겸비한 사람을 임명하게 한 것도 그 중 하나이다. 또한 내수사(內需司)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농간으로 제주도민의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말년에는 끼니조차 걱정할 정도로 청백하게 살았던 이약동. 그의 냉철한 가슴 한 켠에는 뜨거운 애민(愛民)의 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글.사진=백종진/제주문화원 문화기획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