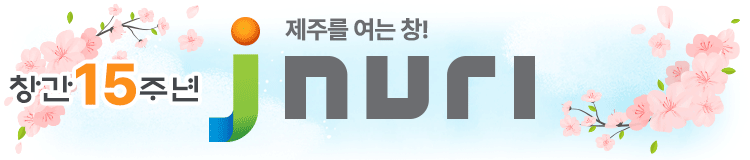1924년 9월 24일, 노신(魯迅)는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산문시를 발표하였다. 『야초(野草)』집에 수록된 산문시로 상징과 사실 수법으로 묘사하였다.
나는 벗겨진 높은 벽을 따라 부드러운 먼지를 밟으며 걸어간다.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벽 위로 솟아오른 높은 나뭇가지가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잎을 단 채 내 머리 위에서 흔들거린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사방이 온통 먼지다.
한 아이가 나에게 구걸한다. 겹옷을 입었다.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는데 막아서며 절하고 쫓아오며 애원한다.
나는 그의 말투와 태도가 싫었다. 나는 슬프지도 않으면서 장난치 듯 하는 그가 싫었다. 나는 쫓아오며 애원하는 그에게서 진저리가 났다.
나는 길은 걷는다.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사방이 온통 먼지다.
 한 아이가 나에게 구걸한다. 겹옷을 입었다.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벙어리이다. 양손을 나란히 벌려놓고 손짓한다.
한 아이가 나에게 구걸한다. 겹옷을 입었다.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벙어리이다. 양손을 나란히 벌려놓고 손짓한다.
나는 그의 손짓이 싫다. 그리고 결코 그는 벙어리가 아니다. 구걸하는 방법일 뿐이다.
나는 희사하지 않는다. 희사할 마음도 없다. 나는 단지 자선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혐오와 의심과 증오를 보낼 뿐이다.
나는 무너진 토담을 따라 걷는다. 잘린 벽돌이 무너진 돌담 사이에 쌓여있다. 돌담 안에는 아무 것도 없다. 산들바람이 가을 한기를 내 겹옷 속으로 스며들게 한다. 사면이 온통 먼지다.
나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걸할지를 생각한다. 소리를 낸다면 어떤 말투로 할까? 벙어리로 가장하면 어떤 손짓으로 할까? ...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나는 앞으로 보시를 받을 수 없고 베풀어 도우려는 마음(布施心)도 얻을 수 없으리라. 나는 앞으로 자선가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혐오, 의심, 증오만을 받게 되리라.
나는 앞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침묵으로 구걸하리라! ...
나는 적어도 허무는 얻게 되리라.
산들바람이 불어와 사면이 온통 먼지다.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먼지, 먼지...
...
먼지...
과거에 노신 작품을 평가할 때 학계에서는 예술의 상징과 사실 두 방면만 주의할 뿐이었다. 요 몇 년, 중국에서는 작품의 상징 의의를 더 중시하고 있다. 그중에는 생경한 정치공리주의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인문과학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노신을 연구한 일본 학자 오다 타케오(小田岳夫)는 노신의 산문시 중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당시 회색의 심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중국학자는 문제를 제기했다.
 “노신 『야초』 속에는 분명 비교적 농후한 허무와 비관적 정조가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고 「구걸하는 사람」이 그런 허무, 비관의 ‘회색의 심경’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신은 전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싫어하고 암울과 허무를 부정하였다. 그는 항쟁으로 암울한 사회를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 표정의 소침은 내심의 치열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구걸하는 사람」의 서정적 특색이다.”(「손옥석(孫玉石), 『야초』 연구」)
“노신 『야초』 속에는 분명 비교적 농후한 허무와 비관적 정조가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고 「구걸하는 사람」이 그런 허무, 비관의 ‘회색의 심경’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신은 전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싫어하고 암울과 허무를 부정하였다. 그는 항쟁으로 암울한 사회를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 표정의 소침은 내심의 치열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구걸하는 사람」의 서정적 특색이다.”(「손옥석(孫玉石), 『야초』 연구」)
과연 그럴까? 「구걸하는 사람」의 상징과 사실 두 방면 중 어느 한쪽도 버려서는 안 된다.
사실, 노신은 이 산문시에서 사실 방면에서 거지들의 관용적인 사기 수법을 주의해 드러내 보였다. 예를 들어,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는데 막아서며 절하고 쫓아오며 애원한다.”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벙어리이다. 양손을 나란히 벌려놓고 손짓한다.”
이 모두 예나 지금이나 흔히 보이는 사기 수법이다. 그렇기에 노신은 명확히 표명하였다.
“나는 그의 말투와 태도가 싫었다. 나는 슬프지도 않으면서 장난치 듯 하는 그가 싫었다.”
“나는 그의 손짓이 싫다. 그리고 그는 벙어리가 결코 아니다. 구걸하는 방법일 뿐이다.”
이런 사기술과 위장은 한 세대 한 세대 전승되고 연속돼, 반복적으로 희사자의 측은지심을 찔렀다. 그래서 노신은 말했다.
“나는 희사하지 않는다. 희사할 마음도 없다. 나는 단지 자선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혐오와 의심과 증오를 보낼 뿐이다.”
세상사가 늘 변하는데 누가 감히 자신의 일생 중 결코 거지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노신도 자신이 그러한 지경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상하였다.
“나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걸할지를 생각한다. 소리를 낸다면 어떤 말투로 할까? 벙어리로 가장하면 어떤 손짓으로 할까?..."
그런데 노신은 사기 치지는 않고 그저, “나는 앞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침묵으로 구걸하리라!”
결과는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보시를 받을 수 없고 베풀어 도우려는 마음(布施心)도 얻을 수 없으리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선가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혐오, 의심, 증오만을 받게 되리라.”
「구걸하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거지가 행하는 사기라는 상투 수단을 드러내 보이면서 당시 사상가의 관점을 표현하였다.
적어도 「구걸하는 사람」의 예술 상징 방면에 대하여 이미 많은 학자가 세간에 해석을 해놓았기에, 굳이 이 글에서 논술할 내용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언급한 것은, 거지의 사기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 따름이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