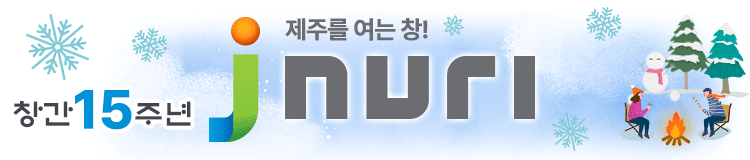‘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어린애가 된다’는 옛말이 있다.
이 점에 대해 전문가들 또한 ‘삶의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유아는 삶의 끝자락으로 여행 중인 노인과 육체적·정신적으로 비슷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식사·취침·목욕·용변 등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다. 백 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로서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어느 날 한밤중에 어머니께서 베개를 안고 우리 방으로 오셨다. ‘무서워서 도무지 혼자 잘 수가 없다’시면서. 그 모습이 꼭 ‘엄마와 함께 자겠다’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92세쯤 되셨을까? 그즈음에 어머니는 부엌의 가스 불을 끄지 않아 냄비를 태우거나 ‘이러다가 집을 태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을 드문드문 만드셨다.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수시로 부엌을 점검하다가, 결국은 취사도구를 정리했다.
우리와 함께 사신지 10년만의 일이다. 81세에 17년간의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혼자서 부엌을 쓰고 싶어 하셨다. 당신이 좋아하는 자리젓, 마농지, 비린내가 많이 나는 생선조림, 옛날 냄새가 진동하는 재래식 된장국 등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드시면서 여생을 제주도 식으로 보내보리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부엌이 딸린 방을 별도로 만들어 드렸다. 어머니는 그렇게 10년을 혼자 식사하시면서, 제주 할머니들의 오래된 풍습에 따라 ‘오몽해지는 한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삶을 영위하셨다. 어머니의 원룸은 마치 제주도 전통가옥의 바끄레처럼 어머니만의 생활공간이 되어주었다.

노인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학령기 어린이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생활반경이 좁은 것처럼 노년기의 어르신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시기에는 보호자의 적절한 관찰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조언에 따라 우리는 어머니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즉각적인 조치로, 우선 어머니는 우리 방으로, 남편은 어머니 방으로 옮겼다. 베개를 들고 방을 나가는 남편도 얼마 없어 노인기로 진입할 텐데... 싶으니, 어깨가 축 쳐진 뒷모습이 기죽은 어린아이처럼 측은해 보였다.
대신에 어머니는 마치 자기 자리를 찾아들어온 강아지마냥(지극히 불손한 표현이지만, 사실이 그러하였다) 이불속을 파고들더니 금방 쌕쌕거리며 단잠 속으로 들어갔다. 마치 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잠들듯이 언제 그랬냐 싶게 평온한 얼굴로.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허정옥은?
= 서귀포시 대포동이 고향이다. 대학 진학을 위해 뭍으로 나가 부산대학교 상과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 볼티모어시에 있는 University of Baltimore에서 MBA를 취득했다. 주택은행과 동남은행에서 일하면서 부경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이수했고, 서귀포에 탐라대학이 생기면서 귀향,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면서 서귀포 시민대학장, 평생교육원장,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3년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의 대표이사 사장과 제주컨벤션뷰로(JCVB)의 이사장 직을 수행한데 이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을 거쳤다. 현재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서비스 마케팅과 컨벤션 경영을 가르치고 있다.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좀녀학교도 다니며 해녀로서의 삶을 꿈꿔보기도 하고 있다.